лҢҖн•ңлҜјкөӯмқҳ л°°нғҖм Ғ кІҪм ң мҲҳм—ӯ лҢҖн•ңлҜјкөӯмқҳ л°°нғҖм Ғ кІҪм ң мҲҳм—ӯ лҢҖн•ңлҜјкөӯмқҳ л°°нғҖм Ғ кІҪм ң мҲҳм—ӯ(н•ңкөӯ н•ңмһҗ: еӨ§йҹ“ж°‘еңӢмқҳ жҺ’д»–зҡ„經жҝҹж°ҙеҹҹ, мҳҒм–ҙ: Exclusive Economic Zone of South Korea)мқҖ м „ м„ёкі„ кё°мӨҖмңјлЎң м•Ҫ 63лІҲм§ёлЎң нҒ¬л©°, л©ҙм ҒмқҖ 288,045гҺўмқҙлӢӨ.[1][2] н•ңл°ҳлҸ„ м „мІҙмқҳ EEZмқҳ л©ҙм ҒмқҖ 43.8л§ҢгҺўмқҙлӢӨ.[3] м—ӯмӮ¬мЎ°м„ мқҖ нҳјмқјк°•лҰ¬м—ӯлҢҖкөӯлҸ„м§ҖлҸ„, н•ңкёҖмЎ°м„ м „лҸ„ л“ұмқ„ нҶөн•ҙм„ң н•ңл°ҳлҸ„мқ„ к°җмӢёкі мһҲлҠ” нҷ©н•ҙ, лӮЁн•ҙ к·ёлҰ¬кі лҸҷн•ҙм—җ лҢҖн•ң м§ҖлҸ„лҘј м ңмһ‘н•ҳмҳҖлӢӨ. мқҙлҹ¬н•ң кі м§ҖлҸ„л“ӨмқҖ мҡёлҰүлҸ„мҷҖ лҸ…лҸ„м—җ лҢҖн•ң мЎ°м„ мқҳ мҳҒмң к¶Ңмқ„ м •нҷ•н•ҳкІҢ н‘ңкё°н•ҳкі мһҲлӢӨ.[4][5] мЎ°м„ кіј лҢҖн•ңм ңкөӯ мӢңкё°, мҳҒкөӯ, лҹ¬мӢңм•„, н”„лһ‘мҠӨ л“ұ м„ңм–‘мқҳ м ңкөӯмЈјмқҳ көӯк°Җл“Өмқҙ н•ңл°ҳлҸ„мқҳ н•ҙм–‘мқ„ мёЎлҹүн•ҳмҳҖлӢӨ.[6] к·ёлҰ¬кі мқјліё м ңкөӯмқҖ к°•нҷ”лҸ„ мЎ°м•ҪлҘј нҶөн•ҙ н•ҙм–‘ мёЎлҹүк¶Ңмқ„ л”°лғҲлӢӨ.[7] 1948л…„ лӮЁн•ңм—җ лӢЁлҸ… м •л¶Җк°Җ мҲҳлҰҪлҗҳкі , ліёкІ©м ҒмңјлЎң лҢҖн•ңлҜјкөӯ м •л¶ҖлҠ” л°°нғҖм Ғ кІҪм ң мҲҳм—ӯм—җ лҢҖн•ң кҙҖлҰ¬м—җ л“Өм–ҙк°ҖкІҢ лҗңлӢӨ. мқҙлҘј мөңмҙҲлЎң кө¬мІҙнҷ”мӢңнӮЁ м •м№ҳм Ғ м„ м–ёмқҙ л°”лЎң мқҙмҠ№л§Ң лҢҖнҶөл №мқҳ нҸүнҷ”м„ мқҙлӢӨ.[8][9] лӢ№мӢң мқјліё м–ҙлҜјмқҳ л¶ҲлІ•м Ғмқё м–ҙлЎң нҷңлҸҷкіј лҸ…лҸ„ м№Ёмһ… л¬ём ңм—җ лҢҖмқ‘н•ҳкё° мң„н•ҙ 1952л…„ 1мӣ” 18мқјм—җ м„ нҸ¬лҗҳм—ҲлӢӨ. мқҙлҹ¬н•ң нҸүнҷ”м„ м„ нҸ¬мқҳ л°°кІҪмқҖ, 1950л…„лҢҖ мқјліё м–ҙм„ л“ӨмқҖ м ңмЈјлҸ„мҷҖ нқ‘мӮ°лҸ„лҘј мӨ‘мӢ¬мңјлЎң н•ң н•ңл°ҳлҸ„ лӮЁм„ң н•ҙм—ӯм—җм„ң лҢҖк·ңлӘЁлЎң м„ лӢЁмқ„ мқҙлЈЁм–ҙ м–ҙлЎңмһ‘м—…мқ„ лІҢмҳҖлҚҳ кІғкіј л¬ҙкҙҖн•ҳм§Җ м•ҠлӢӨ.[10] лӢ№мӢң лҢҖн•ңлҜјкөӯ н•ҙм–‘кІҪм°°мІӯкіј мқјліё м–ҙлҜјл“Ө к°„ 충лҸҢмқҙ мһҗмЈј мқҙлӨ„мЎҢмңјл©°, лӢӨмқҙнҳёл§ҲлЈЁ мӮ¬кұҙ лҳҗн•ң мқҙлҹ¬н•ң л§ҘлқҪм—җм„ң л°ңмғқн•ҳмҳҖлӢӨ.[11][12] 1965л…„, л°•м •нқ¬ лҢҖнҶөл №мқҖ мқјліёкіј кҙҖкі„ к°ңм„ мқ„ мң„н•ң н•ңмқјкё°ліёмЎ°м•Ҫмқҳ л¶ҖмҶҚ мЎ°м•ҪмңјлЎң н•ңмқјм–ҙм—…нҳ‘м •мқ„ мІҙкІ°н•ҳм—¬ н•ҙм–‘ мҳҒнҶ м—җ лҢҖн•ң кё°мӨҖмқ„ м„Өм •н•ҳмҳҖлӢӨ. к·ёлҹ¬лӮҳ лҢҖн•ңлҜјкөӯкіј мқјліё к°„ л°°нғҖм Ғ кІҪм ң мҲҳм—ӯмқҳ кІҪкі„м„ мқ„ мөңмў…м ҒмңјлЎң нҷ•м •н•ҳм§Җ лӘ»н•ҳкі , лҸ…лҸ„ мқёк·јмқ„ кіөлҸҷм–ҙлЎңкө¬м—ӯмңјлЎң м§Җм •н•ҳмҳҖлӢӨ. лҢҖн•ңлҜјкөӯмқҖ 1983л…„м—җ мұ„нғқлҗң н•ҙм–‘лІ•м—җ кҙҖн•ң мң м—” нҳ‘м•Ҫмқ„ лӮЁл¶Ғ мң м—” лҸҷмӢңк°Җмһ… мқҙнӣ„ 1994л…„ 2мӣ”м—җ 비мӨҖн•ҳм—¬ лҸҷл…„ 11мӣ”м—җ л°ңнҡЁн•ҳмҳҖлӢӨ.[13][14] мқҙлҘј нҶөн•ҙм„ң лҢҖн•ңлҜјкөӯлҸ„ м—¬нғҖ мң м—” нҡҢмӣҗкөӯмІҳлҹј көӯм ңлІ•мғҒ EEZ м„Өм •мқҙ к°ҖлҠҘн•ҙмЎҢлӢӨ.1996л…„м—җлҠ” лҢҖн•ңлҜјкөӯмқҳ л°°нғҖм Ғ кІҪм ң мҲҳм—ӯмқ„ м„ м–ён•ҳмҳҖмңјл©°, көӯл¬ҙмҙқлҰ¬ нӣҲл № м ң158нҳё: "л°°нғҖм Ғ кІҪм ңмҲҳм—ӯм—җм„ңмқҳ к¶ҢлҰ¬ н–үмӮ¬ л“ұм—җ кҙҖн•ң к·ңм •"мқ„ м ңм •н•ҳмҳҖлӢӨ.[15]  м§ҖлҰ¬
мЈјліҖкөӯкіј к°Ҳл“ұ мқјліё1998л…„ 1мӣ” 23мқј, мқјліёмқҖ н•ңкөӯмқҳ к№ҖлҢҖмӨ‘ м •л¶Җмқҳ м¶ңлІ”кіј лҢҖн•ңлҜјкөӯмқҳ IMF кө¬м ңкёҲмңө мҡ”мІӯмқҳ нӢҲмқ„ нғҖ кё°мЎҙмқҳ н•ңмқјм–ҙм—…нҳ‘м •мқ„ мқјл°©м ҒмңјлЎң нҢҢкё°н–ҲлӢӨ.[16] мқјліёмқҳ мқјл°©м Ғ нҢҢкё° мқҙнӣ„, м–‘көӯмқҖ көҗм„ӯ лҒқм—җ 1998л…„ 9мӣ” 25мқј мӢ н•ңмқјм–ҙм—…нҳ‘м •мқ„ нғҖкІ°н–ҲлӢӨ.[17] мӢ н•ңмқјм–ҙм—…нҳ‘м • мІҙкІ°мқ„ нҶөн•ҙ м–‘көӯмқҖ лӮЁн•ҙмҷҖ лҸҷн•ҙм—җ мӨ‘к°„мҲҳм—ӯмқ„ м„Өм •н•ҳкі , м–‘көӯ м–ҙм„ л“Өмқҳ мЎ°м—… нҷңлҸҷмқ„ к·ңм ңн•ҳкІҢ лҗҳм—ҲлӢӨ.[18] мӢ н•ңмқјм–ҙм—…нҳ‘м •кіј лі„к°ңлЎң, мқјліёмқҖ лҸ…лҸ„ 분мҹҒмқ„ м§ҖмҶҚм ҒмңјлЎң лІҢмқҙкі мһҲлӢӨ.[19] нҠ№нһҲ лҸ…лҸ„лҘј мқјліё нҳјмҠҲ мЈјкі мҝ м§Җл°©мқҳ мӢңл§Ҳл„Өнҳ„ мҶҢмҶҚмңјлЎң мқёмӢқн•ҳл©°, мһҗкөӯмқҳ көҗкіјм„ңм—җ лҢҖн•ңлҜјкөӯмқҙ лҸ…лҸ„лҘј л¶ҲлІ•м ҒмңјлЎң м җмң н•ҳкі мһҲлӢӨкі лӘ…мӢңн•ҳкі мһҲлӢӨ.[20] к·ёлҰ¬кі мқјліё м •л¶Җмқҳ кіөмӢқ л¬ёкұҙм—җм„ң лҸ…лҸ„лҘј мһҗкөӯ мҳҒнҶ лЎң кё°мһ¬н•ҳкі мһҲлӢӨ. л¶Ғн•ң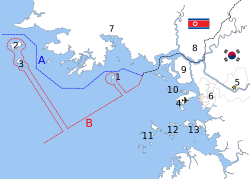 лҢҖн•ңлҜјкөӯмқҙ мЈјмһҘн•ҳлҠ” кІҪкі„м„ л¶Ғн•ңмқҙ мЈјмһҘн•ҳлҠ” кІҪкі„м„ л¶Ғн•ңмқҖ лҢҖн•ңлҜјкөӯ м„ңн•ҙ 5лҸ„мҷҖ мЎ°м„ лҜјмЈјмЈјмқҳмқёлҜјкіөнҷ”көӯ нҷ©н•ҙлӮЁлҸ„ н•ҙм•Ҳ мӮ¬мқҙм—җ м„Өм •лҗң н•ҙмғҒ кІҪкі„м„ м—җ лҢҖн•ҙм„ңлҠ” л§Өмҡ° лҜјк°җн•ҳкІҢ л°ҳмқ‘н•ҳкі мһҲлӢӨ. л¶Ғн•ңмқҖ 2000л…„лҢҖк№Ңм§Җ лі„лӢӨлҘё мһ…мһҘмқ„ н‘ңлӘ…н•ҳм§Җ м•Ҡкі мһҲм—ҲмңјлӮҳ, мһ…мһҘмқ„ л°”кҫёкі кё°мЎҙмқҳ л¶Ғл°©н•ңкі„м„ мқ„ мқјл°©м ҒмңјлЎң кұ°л¶Җн•ҳкі мғҲлЎңмҡҙ мЎ°м„ м„ңн•ҙ н•ҙмғҒ кө°мӮ¬л¶„кі„м„ мқ„ мЈјмһҘн•ҳмҳҖлӢӨ. к·ёлҹ¬лӮҳ лҢҖн•ңлҜјкөӯмқҖ мқҙлҘј л°ӣм•„л“ңлҰ¬м§Җ м•Ҡм•ҳлӢӨ. м–‘көӯмқҳ кёҙмһҘмқҖ мқҙлҠ” лӮЁл¶Ғк°„ мӢӨм§Ҳм Ғмқё л¬ҙл Ҙ 충лҸҢлЎң мқҙм–ҙмЎҢмңјл©°, м ң1м—°нҸүн•ҙм „, м ң2м—°нҸүн•ҙм „, лҢҖмІӯн•ҙм „мқ„ мҙҲлһҳн•ҳмҳҖлӢӨ.[21][22][23]  мӨ‘көӯлҢҖн•ңлҜјкөӯмқҙ 1996л…„м—җ л°°нғҖм Ғ кІҪм ң мҲҳм—ӯмқ„ м„ м–ён•ҳкі 2л…„ л’Өмқё 1998л…„м—җ мӨ‘көӯ лҳҗн•ң мһҗкөӯмқҳ л°°нғҖм Ғ кІҪм ң мҲҳм—ӯмқ„ м„ м–ён•ҳмҳҖлӢӨ. мқҙм—җ м–‘көӯ к°„ н•ҙм–‘ кІҪкі„к°Җ лӘ…нҷ•н•ҳкІҢ кө¬л¶„лҗҳм§Җ м•Ҡм•ҳкё°м—җ, 2000л…„м—җ н•ңмӨ‘м–ҙм—…нҳ‘м • мІҙкІ°мқ„ нҶөн•ҙм„ң н•ҙм–‘ кІҪкі„лҘј нҷ•м •н•ҳлҠ”лҚ° н•©мқҳн•ҳмҳҖлӢӨ. к·ёлҹ¬лӮҳ нҷ©н•ҙмқҳ м–‘көӯмқҳ мӨ‘мІ©лҗҳлҠ” мҲҳм—ӯмқҖ мһ м •мЎ°м№ҳмҲҳм—ӯмңјлЎң м„Өм •н•ҳлҠ”лҚ° н•©мқҳн•ҳмҳҖлӢӨ.[24][25] к·ёлҹ¬лӮҳ лӘ…нҷ•н•ҳм§Җ м•ҠмқҖ кІҪкі„м„ л•Ңл¬ём—җ мӨ‘көӯ м–ҙм„ мқҳ л¶ҲлІ•м Ғмқё м–ҙлЎң нҷңлҸҷмқҙ лҢҖн•ңлҜјкөӯмқҳ мҲҳм—ӯм—җм„ңлҸ„ л№ҲлІҲн•ҳкІҢ мқјм–ҙлӮҳкі мһҲлӢӨ.[26][27] мқҙлҹ¬н•ң мӨ‘көӯ л¶ҲлІ•м–ҙм„ м—җ лҢҖн•ң лҢҖн•ңлҜјкөӯ н•ҙм–‘кІҪм°°мқҳ м§ҖмҶҚм Ғмқё лӢЁмҶҚнҷңлҸҷмқҙ мқјм–ҙлӮҳкі мһҲм§Җл§Ң, лӢЁмҶҚмқ„ н”јн•ҙм„ң л¶Ғл°©н•ңкі„м„ мқ„ л„ҳм–ҙк°ҖлҠ” мӨ‘көӯ м„ лӢЁм—җ лҢҖн•ң нҡЁкіјм Ғмқё лҢҖмқ‘мұ…мқҙ м—ҶлҠ” мғҒнҷ©мқҙлӢӨ.[28][29] к°ҒмЈј
|
Portal di Ensiklopedia Dunia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