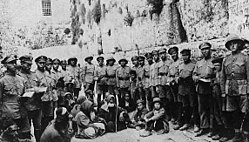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м—ӯмӮ¬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5,000л…„мқҙ л„ҳлҠ” м—ӯмӮ¬лҘј к°Җ진 м„ёкі„м—җм„ң к°ҖмһҘ мҳӨлһҳлҗң лҸ„мӢң мӨ‘ н•ҳлӮҳмқҙлӢӨ. к·ё кё°мӣҗмқҖ кё°мӣҗм „ м•Ҫ 3000л…„кІҪмңјлЎң кұ°мҠ¬лҹ¬ мҳ¬лқјк°Җл©°, кё°нҳјмғҳ к·јмІҳм—җ мөңмҙҲмқҳ м •м°©м§Җк°Җ мһҲм—ҲлӢӨ. мқҙ лҸ„мӢңлҠ” кё°мӣҗм „ 2000л…„кІҪ мқҙ집нҠёмқҳ м ҖмЈјл¬ём—җ "лЈЁмӮҙлҰ¬лӯ„"мңјлЎң мІҳмқҢ м–ёкёүлҗңлӢӨ. кё°мӣҗм „ 17м„ёкё°кІҪ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к°ҖлӮҳм•Ҳ нҶөм№ҳн•ҳм—җ мҡ”мғҲнҷ”лҗң лҸ„мӢңлЎң л°ңм „н–Ҳмңјл©°, кұ°лҢҖн•ң м„ұлІҪмқҙ мҲҳкі„лҘј ліҙнҳён–ҲлӢӨ. нӣ„кё° мІӯлҸҷкё° мӢңлҢҖм—җ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м•„л§ҲлҘҙлӮҳ л¬ём„ңм—җ кё°лЎқлҗң л°”мҷҖ к°ҷмқҙ кі лҢҖ мқҙ집нҠёмқҳ мҶҚкөӯмқҙ лҗҳм—ҲлӢӨ. мқҙ лҸ„мӢңмқҳ мӨ‘мҡ”м„ұмқҖ кё°мӣҗм „ 1000л…„кІҪ лӢӨмң— мҷ•мқҙ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м җл №н•ҳкі нҶөмқј мқҙмҠӨлқјм—ҳ мҷ•көӯмқҳ мҲҳлҸ„лЎң мӮјмңјл©ҙм„ң мқҙмҠӨлқјм—ҳ мӢңлҢҖм—җ м»ӨмЎҢлӢӨ. лӢӨмң—мқҳ м•„л“Өмқё мҶ”лЎңлӘ¬мқҖ м ң1м„ұм „мқ„ кұҙ축н•ҳм—¬ лҸ„мӢңлҘј мЈјмҡ” мў…көҗ мӨ‘мӢ¬м§ҖлЎң л§Ңл“Өм—ҲлӢӨ. мҷ•көӯмқҙ 분м—ҙлҗң нӣ„,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кё°мӣҗм „ 586л…„м—җ мӢ л°”л№ҢлЎңлӢҲм•„ м ңкөӯм—җ мқҳн•ҙ м җл №лҗ л•Ңк№Ңм§Җ мң лӢӨ мҷ•көӯмқҳ мҲҳлҸ„к°Җ лҗҳм—ҲлӢӨ. л°”л№ҢлЎңлӢҲм•„мқёл“ӨмқҖ м ң1м„ұм „мқ„ нҢҢкҙҙн–Ҳкі , мқҙлҠ”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ҳ л°”л№ҢлЎ мң мҲҳлЎң мқҙм–ҙмЎҢлӢӨ. кё°мӣҗм „ 539л…„ нҺҳлҘҙмӢңм•„мқҳ л°”л№ҢлЎ м •ліө нӣ„, нӮӨлЈЁмҠӨ 2м„ёлҠ”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ҙ лҸҢм•„мҷҖ лҸ„мӢңмҷҖ м ң2м„ұм „мқ„ мһ¬кұҙн•ҳлҸ„лЎқ н—ҲлқҪн–Ҳмңјл©°, мқҙлҠ” м ң2м„ұм „кё°мқҳ мӢңмһ‘мқ„ м•Ңл ёлӢӨ.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кё°мӣҗм „ 332л…„ м•Ңл үмӮ°л“ңлЎңмҠӨ лҢҖмҷ•мқҳ м •ліө мқҙнӣ„ н—¬л ҲлӢҲмҰҳ нҶөм№ҳн•ҳм—җ лҶ“мҳҖкі , мқҙлҠ” кі лҢҖ к·ёлҰ¬мҠӨмқҳ л¬ёнҷ”м Ғ, м •м№ҳм Ғ мҳҒн–Ҙл Ҙ мҰқлҢҖлЎң мқҙм–ҙмЎҢлӢӨ. кё°мӣҗм „ 2м„ёкё°мқҳ л§Ҳм№ҙлІ мҳӨ м „мҹҒмқҖ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лҸ…лҰҪ көӯк°Җмқҳ мҲҳлҸ„лЎң мӮјм•„ мң лҢҖмқёмқҳ мһҗм№ҳк¶Ңмқ„ мһ мӢң нҡҢліөмӢңмј°лӢӨ. кё°мӣҗм „ 63л…„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нҸјнҺҳмқҙм—җкІҢ м •ліөлӢ№н•ҳкі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мқјл¶Җк°Җ лҗҳм—ҲлӢӨ. мқҙ лҸ„мӢңлҠ” 70л…„м—җ м ң2м„ұм „мқҳ нҢҢкҙҙлЎң м Ҳм •м—җ лӢ¬н•ң мң лҢҖ-лЎңл§Ҳ м „мҹҒк№Ңм§Җ лЎңл§Ҳмқҳ м§Җл°°н•ҳм—җ мһҲм—ҲлӢӨ. л°”лҘҙ мҪ”нҒ¬л°”мқҳ лӮң (132вҖ“136л…„) мқҙнӣ„ мқҙ лҸ„мӢңлҠ” м•„мқјлҰ¬м•„ м№ҙн”јнҶЁлҰ¬лӮҳлЎң мқҙлҰ„мқҙ л°”лҖҢкі лЎңл§Ҳ мӢқлҜјм§ҖлЎң мһ¬кұҙлҗҳм—Ҳмңјл©°,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Җ лҸ„мӢң 진мһ…мқҙ кёҲм§Җлҗҳм—ҲлӢӨ.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мҪҳмҠӨнғ„нӢ°лҲ„мҠӨ 1м„ёк°Җ м„ұл¬ҳкөҗнҡҢ кұҙм„Өмқ„ мҠ№мқён•ң нӣ„ лҸҷлЎңл§Ҳ м ңкөӯ мӢңлҢҖм—җ кё°лҸ…көҗмқҳ мӨ‘мӢ¬м§ҖлЎңм„ң мӨ‘мҡ”м„ұмқ„ м–»м—ҲлӢӨ. 638л…„м—җ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лқјмӢңл‘” м№јлҰ¬нҢҢкөӯм—җ мқҳн•ҙ м •ліөлҗҳм—Ҳкі , мҙҲкё° мқҙмҠ¬лһҢ нҶөм№ҳн•ҳм—җ л°”мң„мқҳ лҸ”кіј м•Ңм•„нҒ¬мӮ¬ лӘЁмҠӨнҒ¬к°Җ кұҙм„Өлҗҳм–ҙ мқҙмҠ¬лһҢм—җм„ң мў…көҗм Ғ мӨ‘мҡ”м„ұмқ„ нҷ•кі нһҲ н–ҲлӢӨ. мӢӯмһҗкө° мӢңлҢҖм—җ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1099л…„м—җ мӢӯмһҗкө°м—җкІҢ м җл №лҗҳкі 1187л…„м—җ мӮҙлқјл”ҳм—җкІҢ мһ¬м җл №лҗҳлҠ” л“ұ м—¬лҹ¬ м°ЁлЎҖ мЈјмқёмқҙ л°”лҖҢм—ҲлӢӨ. мқҙ лҸ„мӢңлҠ” м•„мқҙмң лёҢ мҲ нғ„көӯкіј л§ҳлЈЁнҒ¬ мҲ нғ„көӯ мӢңлҢҖлҘј кұ°міҗ мқҙмҠ¬лһҢмқҳ м§Җл°°н•ҳм—җ мһҲм—Ҳмңјл©°, 1517л…„ мҳӨмҠӨл§Ң м ңкөӯмқҳ мқјл¶Җк°Җ лҗҳм—ҲлӢӨ. к·јлҢҖ мӢңлҢҖм—җ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1948л…„ м•„лһҚ-мқҙмҠӨлқјм—ҳ м „мҹҒ мқҙнӣ„ мқҙмҠӨлқјм—ҳкіј мҡ”лҘҙлӢЁ мӮ¬мқҙм—җ л¶„н• лҗҳм—ҲлӢӨ. мқҙмҠӨлқјм—ҳмқҖ 1967л…„ м ң3м°Ё мӨ‘лҸҷ м „мҹҒ мӨ‘м—җ лҸҷ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м җл №н•ҳм—¬ лҸ„мӢңлҘј мқҙмҠӨлқјм—ҳмқҳ нҶөм ңн•ҳм—җ нҶөн•©н–ҲлӢӨ. 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м§Җмң„лҠ” м—¬м „нһҲ мқҙмҠӨлқјм—ҳмқёкіј нҢ”л ҲмҠӨнғҖмқёмқё лӘЁл‘җк°Җ мһҗмӢ л“Өмқҳ мҲҳлҸ„лқјкі мЈјмһҘн•ҳлҠ” л§Өмҡ° л…јмҹҒм Ғмқё л¬ём ңмқҙлӢӨ. м—ӯмӮ¬н•ҷм ҒмңјлЎң мқҙ лҸ„мӢңмқҳ м—ӯмӮ¬лҠ” мў…мў… кІҪмҹҒм Ғмқё лҜјмЎұ м„ңмӮ¬мқҳ кҙҖм җм—җм„ң н•ҙм„қлҗңлӢӨ. мқҙмҠӨлқјм—ҳ н•ҷмһҗл“ӨмқҖ лҸ„мӢңмҷҖ кі лҢҖ мң лҢҖмқёмқҳ м—°кҙҖм„ұмқ„ к°•мЎ°н•ҳлҠ” л°ҳл©ҙ, нҢ”л ҲмҠӨнғҖмқё м„ңмӮ¬л“ӨмқҖ лҸ„мӢңмқҳ лҚ” л„“мқҖ м—ӯмӮ¬м Ғ, лӢӨл¬ёнҷ”м Ғ мӨ‘мҡ”м„ұмқ„ к°•мЎ°н•ңлӢӨ. л‘җ кҙҖм җ лӘЁл‘җ 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м§Җмң„мҷҖ лҜёлһҳм—җ лҢҖн•ң нҳ„лҢҖм Ғ л…јмқҳм—җ мҳҒн–Ҙмқ„ лҜём№ңлӢӨ. мІӯлҸҷкё° мӢңлҢҖмҙҲкё° мІӯлҸҷкё°кі кі н•ҷм Ғ мҰқкұ°м—җ л”°лҘҙл©ҙ кё°мӣҗм „ 3000л…„м—җм„ң 2800л…„ мӮ¬мқҙм—җ кё°нҳјмғҳ к·јмІҳм—җ мөңмҙҲмқҳ м •м°©м§Җк°Җ м„ёмӣҢмЎҢлӢӨ. мӨ‘кё° мІӯлҸҷкё°лҸ„мӢңк°Җ мІҳмқҢ м–ёкёүлҗң кІғмқҖ кё°мӣҗм „ м•Ҫ 2000л…„ мқҙ집нҠё мӨ‘мҷ•көӯмқҳ м ҖмЈјл¬ём—җм„ң мқҙ лҸ„мӢңк°Җ лЈЁмӮҙлҰ¬лӯ„мңјлЎң кё°лЎқлҗң л•ҢмҳҖлӢӨ.[1][2] мқҙлҰ„мқҳ м–ҙк·ј S-L-MмқҖ "нҸүнҷ”"(нҳ„лҢҖ м•„лһҚм–ҙмҷҖ нһҲлёҢлҰ¬м–ҙмқҳ мӮҙлһҢ лҳҗлҠ” мғ¬лЎ¬кіј 비көҗ) лҳҗлҠ” к°ҖлӮҳм•Ҳ мў…көҗмқҳ нҷ©нҳјмқҳ мӢ мғ¬лҰјмқ„ к°ҖлҰ¬нӮӨлҠ” кІғмңјлЎң мғқк°ҒлҗңлӢӨ. кі кі н•ҷм Ғ мҰқкұ°м—җ л”°лҘҙл©ҙ кё°мӣҗм „ 17м„ёкё°к№Ңм§Җ к°ҖлӮҳм•Ҳмқёл“ӨмқҖ кі лҢҖ мҲҳкі„лҘј ліҙнҳён•ҳкё° мң„н•ҙ 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лҸҷмӘҪм—җ кұ°лҢҖн•ң м„ұлІҪ(4~5нҶӨмқҳ л°”мң„, лҶ’мқҙ 26н”јнҠё)мқ„ мҢ“м•ҳлӢӨ.[3][лҚ” лӮҳмқҖ м¶ңмІҳ н•„мҡ”] нӣ„кё° мІӯлҸҷкё°мқҙ집нҠё мӢңлҢҖм ң18мҷ•мЎ°. кё°мӣҗм „ м•Ҫ 1550~1400л…„кІҪ,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м•„нқҗлӘЁм„ё 1м„ёмҷҖ нҲ¬нҠёлӘЁм„ё 1м„ё нңҳн•ҳмқҳ мқҙ집нҠё мқҙ집нҠё мӢ мҷ•көӯмқҙ мқҙ집нҠёлҘј мһ¬нҶөмқјн•ҳкі л Ҳл°ҳнҠёлЎң нҷ•мһҘн•ң нӣ„ мқҙ집нҠёмқҳ мҶҚкөӯмқҙ лҗҳм—ҲлӢӨ. м•„л§ҲлҘҙлӮҳ мӢңлҢҖ(кё°мӣҗм „ м•Ҫ 1350л…„)м—җ мҡ°лЈЁмӮҙлҰјмқҖ мқҙ집нҠё мҷ•мқҳ мҶҚкөӯмңјлЎң кІҪмҹҒн•ҳлҚҳ м—¬лҹ¬ мһ‘мқҖ лҸ„мӢң көӯк°Җ мӨ‘ н•ҳлӮҳмҳҖлӢӨ. мқҙ кіімқҖ мӢ м„ н•ң мғҳл¬јмқҙ мһҲлҠ” мӨ‘мҡ”н•ң лҢҖмғҒл“Өмқҳ м •кұ°мһҘмқҙм—ҲлӢӨ. м—¬лҹ¬ м•„л§ҲлҘҙлӮҳ л¬ём„ңм—җлҠ” мқҙ лҸ„мӢңмҷҖ нҶөм№ҳмһҗл“Өмқҙ лҚ” л§ҺмқҖ мҳҒнҶ лҘј лҶ“кі мқҙмӣғ нҶөм№ҳмһҗл“Өкіј кІҪмҹҒн•ҳлҠ” лӮҙмҡ©мқҙ м–ёкёүлҗҳм–ҙ мһҲлӢӨ. мқҙ м§Җм—ӯм—җм„ң л¬ём ңлҘј мқјмңјнӮӨлҠ” мӮ¬лһҢл“Ө мӨ‘м—җлҠ” н•ҳ비루(нһҲлёҢлҰ¬мқё)к°Җ мһҲм—ҲлҠ”лҚ°, мқҙл“ӨмқҖ "мқҙмҠӨлқјм—ҳ лҜјмЎұ"мқ„ кө¬м„ұн•ҳлҠ” м—¬лҹ¬ 집лӢЁ мӨ‘ н•ҳлӮҳк°Җ лҗ кІғмқҙлӢӨ.
'м ң19мҷ•мЎ°. нӣ„кё° мІӯлҸҷкё° IIB мӢңлҢҖм—җ мқҙ집нҠё м ң19мҷ•мЎ°лҠ” мӢңлҰ¬м•„лҘј м җл №н•ң нһҲнғҖмқҙнҠёмқёл“Өкіјмқҳ көӯкІҪ 분мҹҒмңјлЎң к¶Ңл Ҙмқ„ мһЎм•ҳлӢӨ. лһҢм„ёмҠӨ 2м„ё 4л…„м—җ лһҢм„ёмҠӨ 2м„ёк°Җ м•„л¬ҙлЈЁлҘј м җл №н–Ҳкі , лһҢм„ёмҠӨ 2м„ё 5л…„м—җлҠ” мң лӘ…н•ң м№ҙлҚ°мӢң м „нҲ¬к°Җ мһҲм—ҲлӢӨ. мқҙ мӮ¬кұҙмқҖ нһҲнғҖмқҙнҠёмҷҖ мқҙ집нҠё лӘЁл‘җмқҳ кө°мӮ¬л Ҙмқ„ нҒ¬кІҢ м•Ҫнҷ”мӢңмј°мқ„ лҝҗл§Ң м•„лӢҲлқј, м җ진м ҒмңјлЎң кұҙмЎ°н•ҙм§ҖлҠ” кё°нӣ„ мЎ°кұҙм—җлҸ„ мҳҒн–Ҙмқ„ лҜёміӨлӢӨ. м ң20мҷ•мЎ°. м ң19мҷ•мЎ°мқҳ мў…л§җкіј н•Ёк»ҳ кіјлҸ„кё°к°Җ мӢңмһ‘лҗҳм—ҲлӢӨ. м ң20мҷ•мЎ°лҠ” м •м№ҳм Ғ нҳјлһҖкіј л°ҳлһҖмқҳ мӢңкё° мқҙнӣ„м—җ к¶Ңл Ҙмқ„ мһЎм•ҳлӢӨ. лһҢм„ёмҠӨ 3м„ёлҠ” л°”лӢӨ лҜјмЎұкіј мӢёмӣ мңјл©° л§Ҳм§Җл§ү мң„лҢҖн•ң мҷ•мңјлЎң 여겨진лӢӨ. кё°мӣҗм „ 1178л…„м—җлҠ” мһҗнһҲ м „нҲ¬(мһҗнһҲлҠ” к°ҖлӮҳм•Ҳмқҳ мқҙ집нҠё мқҙлҰ„)к°Җ мһҲм—ҲлӢӨ. мқҙ м§Җм—ӯм—җм„ң мқҙ집нҠёмқҳ нһҳмқҖ кё°мӣҗм „ 12м„ёкё°, нӣ„кё° мІӯлҸҷкё° мӢңлҢҖмқҳ 붕кҙҙ лҸҷм•Ҳ мҮ нҮҙн•ҳкё° мӢңмһ‘н–ҲлӢӨ. м„ұкІҪм—җ л”°лҘҙл©ҙ, мқҙл•Ң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м—¬л¶ҖмҠӨлқјкі м•Ңл ӨмЎҢмңјл©°, лӢ№мӢң лҸ…лҰҪм Ғмқё к°ҖлӮҳм•Ҳ кұ°мЈјлҜјл“ӨмқҖ м—¬л¶ҖмҠӨмЎұмңјлЎң м•Ңл ӨмЎҢлӢӨ. мІ кё° мӢңлҢҖмң лӢӨ мҷ•көӯм„ұкІҪм—җ л”°лҘҙл©ҙ, мқҙ лҸ„мӢңмқҳ мқҙмҠӨлқјм—ҳ м—ӯмӮ¬лҠ” кё°мӣҗм „ м•Ҫ 1000л…„м—җ лӢӨмң— мҷ•мқҳ мҳҲлЈЁмӮҙл ҳ м җл №мңјлЎң мӢңмһ‘лҗҳм—Ҳмңјл©°, мқҙнӣ„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лӢӨмң—м„ұмқҙмһҗ нҶөмқј мқҙмҠӨлқјм—ҳ мҷ•көӯмқҳ мҲҳлҸ„к°Җ лҗҳм—ҲлӢӨ.[1] мӮ¬л¬ҙм—ҳкё°м—җ л”°лҘҙл©ҙ, м—¬л¶ҖмҠӨмЎұмқҖ мқҙмҠӨлқјм—ҳмқёл“Өмқҳ лҸ„мӢң м җл № мӢңлҸ„лҘј м„ұкіөм ҒмңјлЎң м Җн•ӯн–Ҳмңјл©°, лӢӨмң— мҷ• мӢңлҢҖм—җлҠ” мӢ¬м§Җм–ҙ лҲҲлЁј мһҗмҷҖ м ҲлҰ„л°ңмқҙлҸ„ мқҙмҠӨлқјм—ҳ кө°лҢҖлҘј л¬јлҰ¬м№ мҲҳ мһҲлӢӨкі мЈјмһҘн•ҳл©° к·ёлҹ¬н•ң мӢңлҸ„лҘј мЎ°лЎұн–ҲлӢӨ. к·ёлҹјм—җлҸ„ л¶Ҳкө¬н•ҳкі , мӮ¬л¬ҙм—ҳкё° л§ҲмҶҢлқј ліёл¬ёмқҖ лӢӨмң—мқҙ "л¬јнҶө"мқ„ нҶөн•ҙ кө°лҢҖлҘј ліҙлӮҙ лҸ„мӢң м•Ҳм—җм„ң кіөкІ©н•ЁмңјлЎңмҚЁ лӘ°лһҳ лҸ„мӢңлҘј м җл №н–ҲлӢӨкі м§„мҲ н•ңлӢӨ. кі кі н•ҷмһҗл“ӨмқҖ нҳ„мһ¬ мқҙкІғмқ„ лҜҝкё° м–ҙл өлӢӨкі ліёлӢӨ. мҷңлғҗн•ҳл©ҙ лҸ„мӢңлЎң л¬јнҶөмқҙ м—°кІ°лҗҳлҠ” мң мқјн•ң м•Ңл Ө진 мһҘмҶҢмқё кё°нҳјмғҳмқҖ нҳ„мһ¬ мІ м ҖнһҲ л°©м–ҙлҗҳм—ҲлҚҳ кІғмңјлЎң м•Ңл Өм ё мһҲкё° л•Ңл¬ёмқҙлӢӨ(л”°лқјм„ң мқҙ кІҪлЎңлҘј нҶөн•ң кіөкІ©мқҖ 비л°ҖмҠӨлҹҪкё°ліҙлӢӨлҠ” лӘ…л°ұн–Ҳмқ„ кІғмқҙлӢӨ). к·ёлҹ¬лӮҳ лҚ” мҳӨлһҳлҗң 70мқём—ӯ ліёл¬ёмқҖ лӢӨмң—мқҳ кө°лҢҖк°Җ л¬јнҶөмқ„ нҶөн•ҙм„ңк°Җ м•„лӢҲлқј лӢЁкІҖмқ„ мӮ¬мҡ©н•ҳм—¬ м—¬л¶ҖмҠӨмЎұмқ„ л¬јлҰ¬міӨлӢӨкі м ңм•Ҳн•ңлӢӨ. лӢӨмң—мқҙ лҸ„мӢңлҘј м§Җл°°н• л•ҢмҷҖ к·ё мқҙм „м—җлҸ„ мҳҲлЈЁмӮҙл ҳм—җлҠ” лҳҗ лӢӨлҘё мҷ•мқё м•„лқјмҡ°лӮҳк°Җ мһҲм—ҲлҠ”лҚ°,[5] к·ёлҠ” м•„л§ҲлҸ„ 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м—¬л¶ҖмҠӨмЎұ мҷ•мқҙм—Ҳмқ„ кІғмқҙлӢӨ.[6] лӢ№мӢң мҳӨнҺ м—җ мһҲлҚҳ мқҙ лҸ„мӢңлҠ” лӮЁмӘҪмңјлЎң нҷ•мһҘлҗҳм—Ҳкі лӢӨмң—м—җ мқҳн•ҙ мқҙмҠӨлқјм—ҳ мҷ•көӯмқҳ мҲҳлҸ„лЎң м„ нҸ¬лҗҳм—ҲлӢӨ. лӢӨмң—мқҖ лҳҗн•ң м•„лқјмҡ°лӮҳм—җкІҢм„ң кө¬мһ…н•ң нғҖмһ‘л§ҲлӢ№м—җ м ңлӢЁмқ„ кұҙм„Өн–ҲлӢӨ. мқјл¶Җ м„ұкІҪ н•ҷмһҗл“ӨмқҖ мқҙлҘј м„ңмӮ¬мқҳ м Җмһҗк°Җ кё°мЎҙ м„ұм—ӯм—җ мқҙмҠӨлқјм—ҳм Ғ кё°мҙҲлҘј л¶Җм—¬н•ҳл ӨлҠ” мӢңлҸ„лЎң ліёлӢӨ.[7] лӮҳмӨ‘м—җ мҶ”лЎңлӘ¬ мҷ•мқҖ м—ӯлҢҖкё°м—җм„ң лӢӨмң—мқҳ м ңлӢЁкіј лҸҷмқјмӢңн•ҳлҠ” мһҘмҶҢм—җ лҚ” мӢӨм§Ҳм Ғмқё м„ұм „мқё м ң1м„ұм „мқ„ кұҙ축н–ҲлӢӨ. мқҙ м„ұм „мқҖ мқҙ м§Җм—ӯмқҳ мЈјмҡ” л¬ёнҷ” мӨ‘мӢ¬м§Җк°Җ лҗҳм—Ҳмңјл©°, кІ°көӯ нһҲмҰҲнӮӨм•јмҷҖ мҡ”мӢңм•„мҷҖ к°ҷмқҖ мў…көҗ к°ңнҳҒ мқҙнӣ„, мқҙ м„ұм „мқҖ мӢӨлЎңмҷҖ лІ§м—ҳкіј к°ҷмқҙ мқҙм „м—җ к°•л Ҙн–ҲлҚҳ лӢӨлҘё мқҳлЎҖ мӨ‘мӢ¬м§Җл“Өмқ„ нқ¬мғқмӢңнӮӨл©ҙм„ң мЈјмҡ” мҳҲл°° мһҘмҶҢк°Җ лҗҳм—ҲлӢӨ. мҶ”лЎңлӘ¬мқҖ лҳҗн•ң мҳҲлЈЁмӮҙл ҳм—җм„ң мһҗмӢ мқҳ к¶Ғм „ кұҙм„Өкіј л°ҖлЎң кұҙм„Ө(к·ё м •мІҙлҠ” лӢӨмҶҢ л…јлһҖмқҙ мһҲлӢӨ)мқ„ нҸ¬н•Ён•ң м—¬лҹ¬ мӨ‘мҡ”н•ң кұҙ축 мһ‘м—…мқ„ мҲҳн–үн•ң кІғмңјлЎң л¬ҳмӮ¬лҗңлӢӨ. кі кі н•ҷмһҗл“ӨмқҖ м„ұкІҪ мқҙм•јкё°к°Җ л°ңкөҙ мҰқкұ°м—җ мқҳн•ҙ л’·л°ӣм№ЁлҗҳлҠ”м§Җм—җ лҢҖн•ҙ мқҳкІ¬мқҙ лӮҳлүңлӢӨ.[8] мқјлқјнҠё л§ҲмһҗлҘҙлҠ” к·ёл…Җмқҳ л°ңкөҙмқҙ м •нҷ•н•ң мӢңкё°мқҳ нҒ° м„қмЎ° кұҙл¬јмқҳ нқ”м Ғмқ„ л°қнҳҖлғҲлӢӨкі мЈјмһҘн•ҳлҠ” л°ҳл©ҙ, мқҙмҠӨлқјм—ҳ н•ҖмјҲмҠҲнғҖмқёмқҖ л°ңкІ¬л¬јмқҳ н•ҙм„қкіј м—°лҢҖ лӘЁл‘җм—җ мқҙмқҳлҘј м ңкё°н•ңлӢӨ.[9][10] мң лӢӨ мҷ•көӯмқҙ лҚ” нҒ° л¶ҒмқҙмҠӨлқјм—ҳ мҷ•көӯм—җм„ң 분м—ҙлҗҳм—Ҳмқ„ л•Ң(м„ұкІҪмқҖ мҶ”лЎңлӘ¬ нҶөм№ҳ л§җкё°мқё кё°мӣҗм „ м•Ҫ 930л…„кІҪмңјлЎң кё°лЎқн•ҳм§Җл§Ң, н•ҖмјҲмҠҲнғҖмқё л“ұмқҖ нҶөмқј кө°мЈјкөӯмқҳ мЎҙмһ¬ мһҗмІҙлҘј л¶Җм •н•ңлӢӨ[11]),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мң лӢӨ мҷ•көӯмқҳ мҲҳлҸ„к°Җ лҗҳм—Ҳкі , л¶ҒмқҙмҠӨлқјм—ҳ мҷ•көӯмқҖ мӮ¬л§ҲлҰ¬м•„мқҳ м„ёкІңм—җ мҲҳлҸ„лҘј л‘җм—ҲлӢӨ. нҶ л§ҲмҠӨ L. нҶ°мҠЁмқҖ мқҙ лҸ„мӢңк°Җ кё°мӣҗм „ 7м„ёкё° мӨ‘л°ҳм—җм•ј лҸ„мӢңмқҙмһҗ мЈјлҸ„ м—ӯн• мқ„ н• мҲҳ мһҲкІҢ лҗҳм—ҲлӢӨкі мЈјмһҘн•ңлӢӨ.[12] к·ёлҹ¬лӮҳ мҳӨл©”лҘҙ м„ёлҘҙкё°лҠ” лӢӨмң—м„ұкіј мҳӨнҺ м—җм„ң мөңк·ј л°ңкІ¬лҗң кі кі н•ҷм Ғ мң л¬јл“Өмқҙ мҳҲлЈЁмӮҙл ҳмқҙ мқҙлҜё мІ кё° мӢңлҢҖ IIAм—җ мӨ‘мҡ”н•ң лҸ„мӢңмҳҖмқҢмқ„ мӢңмӮ¬н•ҳлҠ” кІғмңјлЎң ліҙмқёлӢӨкі мЈјмһҘн•ңлӢӨ.[13] мөңк·ј л°©мӮ¬м„ұ нғ„мҶҢ м—°лҢҖ мёЎм •мңјлЎң мң кё°л¬јм—җм„ң м–»мқҖ м •нҷ•н•ң м ҲлҢҖ м—°лҢҖлҠ” мҳҲлЈЁмӮҙл ҳмқҙ кё°мӣҗм „ 12м„ёкё°л¶Җн„° 10м„ёкё°к№Ңм§Җ мғҒлҢҖм ҒмңјлЎң л°Җ집лҗҳм–ҙ кұ°мЈјн–Ҳмңјл©°, лҸ„мӢңмқҳ мЈјмҡ” м„ңмӘҪ нҷ•мһҘмқҙ мқҙлҜё кё°мӣҗм „ 9м„ёкё°м—җ мӢңмһ‘лҗҳм—ҲмқҢмқ„ ліҙм—¬мӨҖлӢӨ.[14][15] м„ұкІҪкіј м§Җм—ӯ кі кі н•ҷм Ғ мҰқкұ° лӘЁл‘җ мқҙ м§Җм—ӯмқҙ кё°мӣҗм „ 925л…„м—җм„ң 732л…„к№Ңм§Җ м •м№ҳм ҒмңјлЎң л¶Ҳм•Ҳм •н–ҲмқҢмқ„ мӢңмӮ¬н•ңлӢӨ. кё°мӣҗм „ 925л…„, мқҙ м§Җм—ӯмқҖ м ң3мӨ‘к°„кё°мқҳ мқҙ집нҠё нҢҢлқјмҳӨ м…°мҲ‘нҒ¬ 1м„ёмқҳ м№Ёлһөмқ„ л°ӣм•ҳлҠ”лҚ°, к·ёлҠ” м•„л§ҲлҸ„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м җл №н•ҳкі м•ҪнғҲн•ң м„ұкІҪм—җ м–ёкёүлҗң мөңмҙҲмқҳ нҢҢлқјмҳӨ мӢңмӮӯкіј лҸҷмқј мқёл¬јмқј кІғмқҙлӢӨ. м•Ҫ 75л…„ нӣ„, мҳҲлЈЁмӮҙл ҳкө°мқҖ м№ҙлҘҙм№ҙлҘҙ м „нҲ¬м—җм„ң мӢ м•„мӢңлҰ¬м•„ м ңкөӯмқҳ мҷ• мғ¬л§Ҳл„Өм„ёлҘҙ 3м„ём—җ лҢҖн•ӯн•ҳм—¬ кІ°м •м Ғмқҙм§Җ м•ҠмқҖ м „нҲ¬м—җ м°ём—¬н–Ҳмқ„ к°ҖлҠҘм„ұмқҙ лҶ’лӢӨ. м„ұкІҪм—җ л”°лҘҙл©ҙ, лӢ№мӢң мң лӢӨмқҳ м—¬нҳёмӮ¬л°§мқҖ мқҙмҠӨлқјм—ҳ мҷ•көӯмқҳ м•„н•©кіј лҸҷ맹мқ„ л§әм—ҲлӢӨ. м„ұкІҪмқҖ мқҙ м „нҲ¬ м§Ғнӣ„ мҳҲлЈЁмӮҙл ҳмқҙ лё”л Ҳм…Ӣмқё, м•„лһҚмқё, м—җнӢ°мҳӨн”јм•„мқём—җ мқҳн•ҙ м•ҪнғҲлӢ№н–Ҳмңјл©°, к·ёл“ӨмқҖ м—¬нҳёлһҢ мҷ•мқҳ 집мқ„ м•ҪнғҲн•ҳкі л§үлӮҙ м•„л“Ө м—¬нҳём•„н•ҳмҰҲлҘј м ңмҷён•ң к·ёмқҳ лӘЁл“ к°ҖмЎұмқ„ лҚ°л Өк°”лӢӨкі кё°лЎқн•ңлӢӨ. л‘җ мӢӯ л…„ нӣ„,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нҸ¬н•Ён•ң к°ҖлӮҳм•Ҳ лҢҖл¶Җ분мқҖ м•„лһҢ лӢӨл§ҲмҠӨмҝ мҠӨмқҳ н•ҳмӮ¬м—ҳм—җкІҢ м •ліөлӢ№н–ҲлӢӨ. м„ұкІҪм—җ л”°лҘҙл©ҙ, мң лӢӨмқҳ м—¬нҳём•„мҠӨлҠ” 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лӘЁл“ ліҙл¬јмқ„ кіөл¬јлЎң л°”міӨм§Җл§Ң, н•ҳмӮ¬м—ҳмқҖ лҸ„мӢңмқҳ "лӘЁл“ л°ұм„ұ м§ҖлҸ„мһҗ"лҘј нҢҢкҙҙн–ҲлӢӨ. к·ёлҰ¬кі л°ҳм„ёкё° нӣ„, мқҙ лҸ„мӢңлҠ” м—¬нҳём•„мҠӨм—җ мқҳн•ҙ м•ҪнғҲлӢ№н–Ҳкі , к·ёлҠ” м„ұлІҪмқ„ нҢҢкҙҙн•ҳкі м•„л§Ҳм§Җм•јлҘј нҸ¬лЎңлЎң мһЎм•ҳлӢӨ. м ң1м„ұм „кё° л§җм—җ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мҷ•көӯм—җм„ң мң мқјн•ҳкІҢ нҷңлҸҷн•ҳлҠ” мў…көҗ м„ұм§Җмқҙмһҗ м •кё°м Ғмқё мҲңлЎҖмқҳ мӨ‘мӢ¬м§ҖмҳҖлӢӨ. мқҙлҠ” кі кі н•ҷмһҗл“Ө мӮ¬мқҙм—җм„ң мқјл°ҳм ҒмңјлЎң мҰқкұ°м—җ мқҳн•ҙ мһ…мҰқлҗҳлҠ” кІғмңјлЎң к°„мЈјлҗҳлҠ” мӮ¬мӢӨмқҙлӢӨ. 비лЎқ мқҙ мӢңлҢҖ л§җк№Ңм§Җ м „көӯм—җ нҚјм ё мһҲлҠ” м•„м„ёлқј мғҒмқ„ нҸ¬н•Ён•ҳлҠ” лҚ” к°ңмқём Ғмқё мҲӯл°°к°Җ лӮЁм•„ мһҲм—Ҳм§Җл§Ң л§җмқҙлӢӨ.[11] м•„мӢңлҰ¬м•„ мӢңлҢҖ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м•Ҫ 400л…„ лҸҷм•Ҳ мң лӢӨ мҷ•көӯмқҳ мҲҳлҸ„мҳҖлӢӨ. мқҙ лҸ„мӢңлҠ” м•Ҫ 20л…„ м „м—җ н•ЁлқҪлҗң мӮ¬л§ҲлҰ¬м•„мҷҖлҠ” лӢ¬лҰ¬ кё°мӣҗм „ 701л…„ м„јлӮҳмјҖлҰҪмқҳ м•„мӢңлҰ¬м•„ кіөм„ұм „м—җм„ң мӮҙм•„лӮЁм•ҳлӢӨ. м„ұкІҪм—җ л”°лҘҙл©ҙ, мқҙкІғмқҖ мІңмӮ¬к°Җ м„јлӮҳмјҖлҰҪ кө°лҢҖмқҳ 18л§Ң 5мІң лӘ…мқ„ мЈҪмқё кё°м Ғм Ғмқё мӮ¬кұҙмқҙм—ҲлӢӨ. мқҙ мӮ¬кұҙкіј лҸҷмӢңлҢҖмқҳ 비문мқё м„јлӮҳмјҖлҰҪ м—°лҢҖкё°м—җ ліҙмЎҙлҗң м„јлӮҳмјҖлҰҪ мһҗмӢ мқҳ кё°лЎқм—җ л”°лҘҙл©ҙ, мң лӢӨмқҳ мҷ• нһҲмҰҲнӮӨм•јлҠ” "мҡ°лҰ¬ м•Ҳм—җ к°ҮнһҢ мғҲмІҳлҹј лҸ„мӢңм—җ к°ҮнҳҖ" мһҲм—Ҳкі , кІ°көӯ м„јлӮҳмјҖлҰҪм—җкІҢ "30 лӢ¬лһҖнҠёмқҳ кёҲкіј 800 лӢ¬лһҖнҠёмқҳ мқҖ, к·ёлҰ¬кі лӢӨм–‘н•ң ліҙл¬ј, н’Қл¶Җн•ҳкі кұ°лҢҖн•ң м „лҰ¬н’Ҳ"мқ„ ліҙлӮҙ к·ёлҘј л– лӮҳлҸ„лЎқ м„Өл“қн–ҲлӢӨ. л°”л№ҢлЎңлӢҲм•„ мӢңлҢҖкё°мӣҗм „ 597л…„мқҳ мҳҲлЈЁмӮҙл ҳ кіөл°©м „мңјлЎң мқён•ҙ лҸ„мӢңлҠ” л°”л№ҢлЎңлӢҲм•„мқёл“Өм—җкІҢ н•ЁлқҪлҗҳм—Ҳкі , к·ёл“ӨмқҖ лҢҖл¶Җ분мқҳ к·ҖмЎұкіј н•Ёк»ҳ м ҠмқҖ мҷ• м—¬нҳём•јкёҙмқ„ л°”л№ҢлЎ мң мҲҳлЎң лҒҢкі к°”лӢӨ. л„Өл¶Җм№ҙл“ңл„ӨмһҗлҘҙ 2м„ёк°Җ мҷ•мң„м—җ м•үнһҢ мӢңл“ңнӮӨм•јк°Җ л°ҳлһҖмқ„ мқјмңјмј°кі , л„Өл¶Җм№ҙл“ңл„ӨмһҗлҘҙлҠ” лҸ„мӢңлҘј лӢӨмӢң м җл №н•ҳм—¬ мӢңл“ңнӮӨм•јмқҳ мһҗмҶҗл“Өмқ„ к·ёмқҳ м•һм—җм„ң мЈҪмқҙкі мӢңл“ңнӮӨм•јмқҳ лҲҲмқ„ лҪ‘м•„ к·ёк°Җ л§Ҳм§Җл§үмңјлЎң ліј мҲҳ мһҲлҠ” кІғмқҙ к·ёкІғмқҙ лҗҳкІҢ н–ҲлӢӨ. л°”л№ҢлЎңлӢҲм•„мқёл“ӨмқҖ к·ё лӢӨмқҢ мӢңл“ңнӮӨм•јлҘј мң лӢӨмқҳ м ҖлӘ…н•ң кө¬м„ұмӣҗл“Өкіј н•Ёк»ҳ нҸ¬лЎңлЎң лҒҢкі к°”лӢӨ. л°”л№ҢлЎңлӢҲм•„мқёл“ӨмқҖ к·ё лӢӨмқҢ м„ұм „мқ„ л¶Ҳнғңмҡ°кі лҸ„мӢңмқҳ м„ұлІҪмқ„ нҢҢкҙҙн•ҳкі м•„нһҲмә„мқҳ м•„л“Ө к·ёлӢ¬лҰ¬м•јлҘј мң лӢӨмқҳ мҙқлҸ…мңјлЎң мһ„лӘ…н–ҲлӢӨ. 52мқјк°„мқҳ нҶөм№ҳ нӣ„, мӢңл“ңнӮӨм•јмқҳ мӮҙм•„лӮЁмқҖ нӣ„мҶҗмқё лҠҗлӢӨлғҗмқҳ м•„л“Ө мқҙмӢңл§Ҳм—ҳмқҖ м•”лӘ¬ мҷ• л°”м•ҢлҰ¬мҠӨмқҳ кІ©л ӨлҘј л°ӣм•„ к·ёлӢ¬лҰ¬м•јлҘј м•”мӮҙн–ҲлӢӨ. лӮЁмқҖ мң лӢӨ л°ұм„ұ мӨ‘ мқјл¶ҖлҠ” л„Өл¶Җм№ҙл“ңл„ӨмһҗлҘҙмқҳ ліөмҲҳлҘј л‘җл ӨмӣҢн•ҳм—¬ мқҙ집нҠёлЎң лҸ„л§қміӨлӢӨ. нҺҳлҘҙмӢңм•„ (м•„мјҖл©”л„ӨмҠӨ) мӢңлҢҖмң лҢҖмқёкіј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мғҒ징н•ҳлҠ” л°ұн•© л¬ём–‘мқҙ мһҲлҠ” нҺҳлҘҙмӢңм•„ мӢңлҢҖмқҳ мҳҲнӣ„л“ң мЈјнҷ”(л§Ҳм•„) мқҖнҷ” (л’·л©ҙ) м„ұкІҪм—җ л”°лҘҙл©ҙ, к·ёлҰ¬кі м•„л§ҲлҸ„ нӮӨлЈЁмҠӨ мӣҗнҶөм—җ мқҳн•ҙ нҷ•мҰқлҗ мҲҳ мһҲл“Ҝмқҙ, л°”л№ҢлЎ м—җм„ң мҲҳмӢӯ л…„к°„мқҳ нҸ¬лЎң мғқнҷңкіј м•„мјҖл©”л„ӨмҠӨмқҳ л°”л№ҢлЎңлӢҲм•„ м •ліө мқҙнӣ„, нӮӨлЈЁмҠӨ 2м„ёлҠ”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ҙ мң лӢӨлЎң лҸҢм•„к°Җ м„ұм „мқ„ мһ¬кұҙн•ҳлҠ” кІғмқ„ н—ҲлқҪн–ҲлӢӨ. м—җмҰҲлқј-лҠҗн—ӨлҜём•ј м„ңлҠ” лӢӨлҰ¬мҡ°мҠӨ 1м„ё 6л…„(кё°мӣҗм „ 516л…„)м—җ м ң2м„ұм „мқҳ кұҙ축мқҙ мҷ„лЈҢлҗҳм—Ҳкі , к·ё нӣ„ м•„лҘҙнғҖнҒ¬м„ёлҘҙнҒ¬м„ёмҠӨ 1м„ёк°Җ м—җмҰҲлқјмҷҖ лҠҗн—ӨлҜём•јлҘј ліҙлӮҙ лҸ„мӢңмқҳ м„ұлІҪмқ„ мһ¬кұҙн•ҳкі м—җлІЁ-лӮҳлҰ¬ мӮ¬нҠёлқјн”ј лӮҙмқҳ мҳҲнӣ„л“ң л©”л””лӮҳнғҖ м§Җл°©мқ„ нҶөм№ҳн•ҳкІҢ н–ҲлӢӨкі кё°лЎқн•ңлӢӨ. мқҙлҹ¬н•ң мӮ¬кұҙл“ӨмқҖ нһҲлёҢлҰ¬м–ҙ м„ұкІҪмқҳ м—ӯмӮ¬м Ғ мқҙм•јкё°мқҳ л§Ҳм§Җл§ү мһҘмқ„ лӮҳнғҖлӮёлӢӨ.[16] мқҙ мӢңкё°м—җ м•„лһҢм–ҙк°Җ мғҲ겨진 "мҳҲнӣ„л“ң мЈјнҷ”"к°Җ мғқмӮ°лҗҳм—ҲлӢӨ. мқҙ мЈјнҷ”л“ӨмқҖ мҳҲлЈЁмӮҙл ҳмқҙлӮҳ к·ё к·јмІҳм—җм„ң мЈјмЎ°лҗң кІғмңјлЎң м¶”м •лҗҳм§Җл§Ң, мЈјнҷ”м—җ мЈјмЎ°н‘ңмӢңлҠ” м—ҶлӢӨ. кі м „ кі лҢҖн—¬л ҲлӢҲмҰҳ мӢңлҢҖн”„нҶЁл Ҳл§ҲмқҙмҳӨмҠӨ л°Ҹ м…Җл Ҳмҡ°мҪ”мҠӨ мҶҚмЈјм•Ңл үмӮ°л“ңлЎңмҠӨ лҢҖмҷ•мқҙ м•„мјҖл©”л„ӨмҠӨ м ңкөӯмқ„ м •ліөн–Ҳмқ„ л•Ң, мҳҲлЈЁмӮҙл ҳкіј мң лҢҖлҠ” к·ёлҰ¬мҠӨмқҳ м§Җл°°лҘј л°ӣмңјл©° н—¬л ҲлӢҲмҰҳмқҳ мҳҒн–Ҙмқ„ л°ӣкІҢ лҗҳм—ҲлӢӨ. м•Ңл үмӮ°л“ңлЎңмҠӨ мӮ¬нӣ„ л””м•„лҸ„мҪ”мқҙ м „мҹҒмқ„ кұ°міҗ мҳҲлЈЁмӮҙл ҳкіј мң лҢҖлҠ” н”„нҶЁл Ҳл§ҲмқҙмҳӨмҠӨмқҳ м§Җл°°лҘј л°ӣм•„ н”„нҶЁл Ҳл§ҲмқҙмҳӨмҠӨ 1м„ё м№ҳн•ҳм—җм„ң кі„мҶҚ мҳҲнӣ„л“ң мЈјнҷ”лҘј мЈјмЎ°н–ҲлӢӨ. кё°мӣҗм „ 198л…„, нҢҢлӢҲмӣҖ м „нҲ¬мқҳ кІ°кіјлЎң н”„нҶЁл Ҳл§ҲмқҙмҳӨмҠӨ 5м„ёлҠ” м•ҲнӢ°мҳӨмҪ”мҠӨ 3м„ё л©”к°ҖмҠӨ нңҳн•ҳмқҳ м…Җл Ҳмҡ°мҪ”мҠӨ м ңкөӯм—җкІҢ мҳҲлЈЁмӮҙл ҳкіј мң лҢҖлҘј мһғм—ҲлӢӨ. м…Җл Ҳмҡ°мҪ”мҠӨ мҷ•мЎ° нҶөм№ҳ н•ҳм—җм„ң л§ҺмқҖ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ҙ н—¬л ҲлӢҲмҰҳнҷ”лҗҳм—Ҳкі к·ёл“Өмқҳ лҸ„мӣҖмңјлЎң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н—¬л ҲлӢҲмҰҳнҷ”н•ҳл Өкі мӢңлҸ„н–Ҳмңјл©°, кІ°көӯ кё°мӣҗм „ 160л…„лҢҖм—җ л§ӣлӢӨл””м•„мҷҖ к·ёмқҳ лӢӨм„Ҝ м•„л“Өмқё мӢңлӘ¬ л§Ҳм№ҙлІ мҳӨ, мҡ”н•ҳлӮң, м—ҳм•„мһҗлҘҙ, мҡ”лӮҳлӢЁ л§Ҳм№ҙлІ мҳӨ, к·ёлҰ¬кі мң лӢӨ л§Ҳм№ҙлІ мҳӨк°Җ мқҙлҒ„лҠ” л°ҳлһҖмңјлЎң м Ҳм •м—җ лӢ¬н–ҲлӢӨ. л§ӣлӢӨл””м•„к°Җ мЈҪмқҖ нӣ„, мң лӢӨ л§Ҳм№ҙлІ мҳӨк°Җ л°ҳлһҖмқҳ м§ҖлҸ„мһҗк°Җ лҗҳм—Ҳкі , кё°мӣҗм „ 164л…„м—җ к·ёлҠ”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м җл №н•ҳкі м„ұм „ мҲӯл°°лҘј нҡҢліөмӢңмј°лҠ”лҚ°, мқҙ мӮ¬кұҙмқҖ мҳӨлҠҳлӮ к№Ңм§Җ мң лҢҖмқё лӘ…м Ҳмқё н•ҳлҲ„м№ҙлЎң кё°л…җлҗңлӢӨ.[17][18] н•ҳмҠӨлӘ¬ мҷ•мЎ° мӢңлҢҖ л§Ҳм№ҙлІ мҳӨ м „мҹҒмқҳ кІ°кіјлЎң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н•ң м„ёкё° мқҙмғҒ м§ҖмҶҚлҗң мһҗм№ҳм Ғмқҙл©° кІ°көӯ лҸ…лҰҪм Ғмқё н•ҳмҠӨлӘ¬ мҷ•көӯмқҳ мҲҳлҸ„к°Җ лҗҳм—ҲлӢӨ. мң лӢӨк°Җ мЈҪмқҖ нӣ„, к·ёмқҳ нҳ•м ң мҡ”лӮҳлӢЁ л§Ҳм№ҙлІ мҳӨмҷҖ мӢңлӘ¬ л§Ҳм№ҙлІ мҳӨлҠ” көӯк°ҖлҘј л§Ңл“Өкі к°•нҷ”н•ҳлҠ” лҚ° м„ұкіөн–ҲлӢӨ. к·ёл“ӨмқҖ мӢңлӘ¬мқҳ м•„л“Ө мҡ”н•ң нһҲлҘҙм№ҙл…ёмҠӨм—җкІҢ кі„мҠ№лҗҳм—ҲлҠ”лҚ°, к·ёлҠ” лҸ…лҰҪмқ„ мҹҒм·Ён•ҳкі мң лҢҖмқҳ көӯкІҪмқ„ нҷ•мһҘн•ҳл©° мЈјнҷ”лҘј мЈјмЎ°н•ҳкё° мӢңмһ‘н–ҲлӢӨ. н•ҳмҠӨлӘ¬ мң лҢҖлҠ” мҷ•көӯмқҙ лҗҳм—Ҳкі к·ёмқҳ м•„л“Ө м•„лҰ¬мҠӨнҶ л¶ҲлЎңмҠӨ 1м„ё мҷ•кіј к·ё нӣ„ м•Ңл үмӮ°л“ңлҘҙ м–ҖлӮҳмқҙмҳӨмҠӨ мҷ• м•„лһҳм„ң кі„мҶҚ нҷ•мһҘлҗҳм—ҲлӢӨ. к·ёмқҳ лҜёл§қмқё мӮҙлЎңл©” м•Ңл үмӮ°л“ңлқјк°Җ кё°мӣҗм „ 67л…„м—җ мЈҪмһҗ, к·ёл…Җмқҳ м•„л“Ө нһҲлҘҙм№ҙл…ёмҠӨ 2м„ёмҷҖ м•„лҰ¬мҠӨнҶ л¶ҲлЎңмҠӨ 2м„ёлҠ” лҲ„к°Җ к·ёл…ҖлҘј кі„мҠ№н• м§ҖлҘј лҶ“кі мӢёмӣ лӢӨ. к·ёл“Өмқҳ 분мҹҒмқ„ н•ҙкІ°н•ҳкё° мң„н•ҙ кҙҖл Ёлҗң лӢ№мӮ¬мһҗл“ӨмқҖ лЎңл§Ҳ мһҘкө° нҸјнҺҳмқҙм—җкІҢ мқҳм§Җн–Ҳкі , мқҙлҠ” мң лҢҖмқҳ лЎңл§Ҳ м җл №мқҳ кёёмқ„ м—ҙм—ҲлӢӨ.[19] нҸјнҺҳмқҙлҠ”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мһҘм•…н•ң м•„лҰ¬мҠӨнҶ л¶ҲлЎңмҠӨ 2м„ёліҙлӢӨ нһҲлҘҙм№ҙл…ёмҠӨ 2м„ёлҘј м§Җм§Җн–Ҳкі , лҸ„мӢңлҠ” кі§ нҸ¬мң„лҗҳм—ҲлӢӨ. мҠ№лҰ¬н•ҳмһҗ нҸјнҺҳмқҙлҠ” м§Җм„ұмҶҢм—җ л“Өм–ҙк°Җ м„ұм „мқ„ лӘЁлҸ…н–ҲлҠ”лҚ°, мқҙлҠ” лҢҖм ңмӮ¬мһҘл§Ңмқҙ н• мҲҳ мһҲлҠ” мқјмқҙм—ҲлӢӨ. нһҲлҘҙм№ҙл…ёмҠӨ 2м„ёлҠ” лҢҖм ңмӮ¬мһҘмңјлЎң ліөк¶Ңлҗҳм—ҲмңјлӮҳ мҷ•мң„лҠ” л°•нғҲлҗҳм—Ҳкі кё°мӣҗм „ 47л…„м—җ лҜјмЎұ нҶөм№ҳмһҗлЎң мқём •л°ӣм•ҳлӢӨ. мң лҢҖлҠ” мһҗм№ҳ мҶҚмЈјлЎң лӮЁм•„ мһҲм—ҲмңјлӮҳ мғҒлӢ№н•ң лҸ…лҰҪм„ұмқ„ мң м§Җн–ҲлӢӨ. л§Ҳм§Җл§ү н•ҳмҠӨлӘ¬ мҷ•мқҖ м•„лҰ¬мҠӨнҶ л¶ҲлЎңмҠӨмқҳ м•„л“Ө м•ҲнӢ°кі л…ёмҠӨ 2м„ё л§ҲнӢ°нӢ°м•„нӣ„мҳҖлӢӨ. мҙҲкё° лЎңл§Ҳ мӢңлҢҖкё°мӣҗм „ 37л…„, н—ӨлЎңлҚ° 1м„ёлҠ” 40мқјк°„мқҳ кіөм„ұм „ лҒқм—җ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м җл №н•ҳл©° н•ҳмҠӨлӘ¬ мҷ•мЎ°мқҳ нҶөм№ҳлҘј лҒқлғҲлӢӨ. н—ӨлЎңлҚ°лҠ” мң лӢӨмқҙм•„ мҶҚмЈјлҘј лЎңл§Ҳмқёмқҳ мҶҚмЈј мҷ•мңјлЎң нҶөм№ҳн–Ҳкі , м ң2м„ұм „мқ„ мһ¬кұҙн•ҳкі мЈјліҖ лӢЁм§Җмқҳ нҒ¬кё°лҘј л‘җ л°° мқҙмғҒ лҠҳл ёмңјл©°, лӢӨм–‘н•ң нҷ”нҸҗлҘј мЈјмЎ°н–ҲлӢӨ. м„ұм „мӮ°мқҖ кі лҢҖ м„ёкі„м—җм„ң к°ҖмһҘ нҒ° н…Ңл©”л…ёмҠӨ(мў…көҗм Ғ м„ұм—ӯ)к°Җ лҗҳм—ҲлӢӨ.[20] к°Җмқҙмҡ°мҠӨ н”ҢлҰ¬лӢҲмҡ°мҠӨ м„ёмҝӨл‘җмҠӨлҠ” н—ӨлЎңлҚ°мқҳ м—…м Ғм—җ лҢҖн•ҙ м“°л©ҙм„ң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"лҸҷл°© лҸ„мӢңл“Ө мӨ‘ лӢЁм—° к°ҖмһҘ мң лӘ…н•ң лҸ„мӢңмқҙмһҗ мң лҢҖ лҸ„мӢңл“Өлҝҗл§Ң м•„лӢҲлқј"лқјкі л¶Ҳл ҖлӢӨ. нғҲл¬ҙл“ңлҠ” "н—ӨлЎңлҚ° м„ұм „мқ„ ліҙм§Җ лӘ»н•ң мһҗлҠ” нҸүмғқ м•„лҰ„лӢӨмҡҙ кұҙл¬јмқ„ ліҙм§Җ лӘ»н•ң кІғмқҙлӢӨ"лқјкі нҸүн•ңлӢӨ. к·ёлҰ¬кі нғҖнӮӨнҲ¬мҠӨлҠ” "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мң лҢҖмқёмқҳ мҲҳлҸ„мқҙлӢӨ. к·ёкіім—җлҠ” м—„мІӯлӮң л¶ҖлҘј мҶҢмң н•ң м„ұм „мқҙ мһҲм—ҲлӢӨ"кі мҚјлӢӨ.[21] н—ӨлЎңлҚ°лҠ” лҳҗн•ң м№ҙм—җмӮ¬л Ҳм•„ л§ҲлҰ¬нӢ°л§ҲлҘј кұҙм„Өн•ҳм—¬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мң лӢӨмқҙм•„ мҶҚмЈјмқҳ лЎңл§Ҳ мҶҚмЈј мҲҳлҸ„лЎң лҢҖмІҙн–ҲлӢӨ.[Note 1] кё°мӣҗм „ 4л…„м—җ н—ӨлЎңлҚ°к°Җ мЈҪмқҖ нӣ„, 6л…„м—җлҠ” мң лҢҖмҷҖ мҳҲлЈЁмӮҙл ҳ мӢңлҠ” лЎңл§Ҳ н”„лқјм—җнҺҷнҲ¬мҠӨ, н”„лЎңмҝ лқјнҶ лҘҙ, л Ҳк°ҖнҲ¬мҠӨлҘј нҶөн•ҙ лЎңл§Ҳмқҳ м§Ғм ‘ нҶөм№ҳн•ҳм—җ лҶ“мҳҖлӢӨ(н•ҳмҠӨлӘ¬кіј н—ӨлЎңлҚ° нҶөм№ҳмһҗ лӘ©лЎқ м°ёмЎ°). к·ёлҹ¬лӮҳ н—ӨлЎңлҚ°мқҳ нӣ„мҶҗ мӨ‘ н•ң лӘ…мқё м•„к·ёлҰ¬нҢҢ 1м„ё(мһ¬мң„ 41~44л…„)к°Җ мң лӢӨмқҙм•„ мҶҚмЈјмқҳ лӘ…лӘ©мғҒмқҳ мҷ•мңјлЎң лӢӨмӢң к¶Ңл Ҙмқ„ мһЎм•ҳлӢӨ. м„ңкё° 1м„ёкё°,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мҙҲкё° кё°лҸ…көҗмқҳ л°ңмғҒм§Җк°Җ лҗҳм—ҲлӢӨ. мӢ м•Ҫм„ұкІҪм—җ л”°лҘҙл©ҙ, мқҙкіімқҖ мҳҲмҲҳ к·ёлҰ¬мҠӨлҸ„мқҳ мҳҲмҲҳмқҳ мӢӯмһҗк°Җнҳ•, мҳҲмҲҳмқҳ л¶Җнҷң, мҳҲмҲҳмқҳ мҠ№мІңмқҙ мқјм–ҙлӮң кіімқҙлӢӨ(лҳҗн•ң кё°лҸ…көҗмқҳ мҳҲлЈЁмӮҙл ҳ м°ёмЎ°). мӮ¬лҸ„н–үм „м—җ л”°лҘҙл©ҙ, мӮ¬лҸ„л“Өмқҙ м„ұл №мқ„ мҳӨмҲңм Ҳм—җ л°ӣм•„ ліөмқҢмқ„ м „н•ҳкі к·ёмқҳ л¶Җнҷңмқ„ м„ нҸ¬н•ҳкё° мӢңмһ‘н•ң кіімқҙ л°”лЎң мҳҲлЈЁмӮҙл ҳмқҙм—ҲлӢӨ.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кІ°көӯ мҙҲкё° кё°лҸ…көҗмқҳ мӨ‘мӢ¬м§Җк°Җ лҗҳм—Ҳкі көҗнҡҢмқҳ лӢӨм„Ҝ мҙқлҢҖмЈјкөҗмўҢ мӨ‘ н•ҳлӮҳк°Җ лҗҳм—ҲлӢӨ. лҸҷм„ңкөҗнҡҢ лҢҖ분м—ҙ мқҙнӣ„м—җлҸ„ мқҙ лҸ„мӢңлҠ” лҸҷл°© м •көҗнҡҢмқҳ мқјл¶ҖлЎң лӮЁм•„ мһҲм—ҲлӢӨ. м ң2м„ұм „кё° л§җм—җ 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нҒ¬кё°мҷҖ мқёкө¬лҠ” 20м„ёкё°к№Ңм§Җ к№Ём§Җм§Җ м•Ҡмқ„ м •м җм—җ лӢ¬н–ҲлӢӨ. нҳ„лҢҖ 추мӮ°м—җ л”°лҘҙл©ҙ лӢ№мӢң лҸ„мӢңм—җлҠ” м•Ҫ 7л§Ңм—җм„ң 10л§Ң лӘ…мқҙ кұ°мЈјн•ҳкі мһҲм—ҲлӢӨ.[23] мң лҢҖ-лЎңл§Ҳ м „мҹҒ 66л…„, мң лӢӨмқҙм•„ мҶҚмЈјмқҳ мң лҢҖмқё мқёкө¬лҠ” м ң1м°Ё мң лҢҖ-лЎңл§Ҳ м „мҹҒ, лҳҗлҠ” лҢҖл°ҳлһҖмңјлЎң м•Ңл Ө진 лЎңл§Ҳ м ңкөӯм—җ лҢҖн•ң л°ҳлһҖмқ„ мқјмңјмј°лӢӨ. лӢ№мӢң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мң лҢҖ л°ҳлһҖкө° м Җн•ӯмқҳ мӨ‘мӢ¬м§ҖмҳҖлӢӨ. мһ”мқён•ң 5к°ңмӣ”к°„мқҳ кіөм„ұм „ лҒқм—җ, лҜёлһҳ нҷ©м ң нӢ°нҲ¬мҠӨ нңҳн•ҳмқҳ лЎңл§Ҳ кө°лӢЁмқҖ 70л…„м—җ мҳҲлЈЁмӮҙл ҳ лҢҖл¶Җ분мқ„ мһ¬м •ліөн•ҳкі нҢҢкҙҙн–ҲлӢӨ.[24][25][26] лҳҗн•ң м ң2м„ұм „мқҖ л¶Ҳнғ”кі лӮЁмқҖ кІғмқҖ м„ұм „мқҙ м„ң мһҲлҚҳ кҙ‘мһҘмқ„ м§Җм§Җн•ҳлҚҳ кұ°лҢҖн•ң мҷёл¶Җ(м§Җм§Җ) лІҪлҝҗмқҙм—ҲлҠ”лҚ°, мқҙ лІҪмқҳ мқјл¶ҖлҠ” нҶөкіЎмқҳ лІҪмңјлЎң м•Ңл Өм§ҖкІҢ лҗҳм—ҲлӢӨ. нӢ°нҲ¬мҠӨмқҳ мҠ№лҰ¬лҠ” лЎңл§Ҳмқҳ нӢ°нҲ¬мҠӨ к°ңм„ л¬ём—җ мқҳн•ҙ кё°л…җлҗңлӢӨ. мқҙ мҠ№лҰ¬лҠ” н”Ңлқјл№„мҡ°мҠӨ мҷ•мЎ°к°Җ м ңкөӯм—җ лҢҖн•ң нҶөм№ҳк¶Ңмқ„ мЈјмһҘн•ҳлҠ” лҚ° м •лӢ№м„ұмқ„ л¶Җм—¬н–ҲлӢӨ. мҳҲлЈЁмӮҙл ҳ н•ЁлқҪмқ„ 축н•ҳн•ҳкё° мң„н•ҙ лЎңл§Ҳм—җм„ң лЎңл§Ҳ к°ңм„ мӢқмқҙ м—ҙл ёкі , мң лӘ…н•ң нӢ°нҲ¬мҠӨ к°ңм„ л¬ёмқ„ нҸ¬н•Ён•ң л‘җ к°ңмқҳ к°ңм„ л¬ёмқҙ мқҙлҘј кё°л…җн•ҳкё° мң„н•ҙ м„ёмӣҢмЎҢлӢӨ. м„ұм „м—җм„ң м•ҪнғҲлҗң ліҙл¬јл“Өмқҙ м „мӢңлҗҳм—ҲлӢӨ.[27] 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лӮҳмӨ‘м—җ лЎңл§Ҳ мӢқлҜјм§Җ м•„мқјлҰ¬м•„ м№ҙн”јнҶЁлҰ¬лӮҳлЎң мһ¬кұҙлҗҳм—ҲлӢӨ. мҷёлһҳ мҲӯл°°к°Җ лҸ„мһ…лҗҳм—Ҳкі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ҳ мһ…мһҘмқҖ кёҲм§Җлҗҳм—ҲлӢӨ.[28][29][30] м•„мқјлҰ¬м•„ м№ҙн”јнҶЁлҰ¬лӮҳмқҳ кұҙм„ӨмқҖ 132л…„м—җ л°”лҘҙ мҪ”нҒ¬л°”мқҳ лӮңмқҙ л°ңл°ңн•ң м§Ғм ‘м Ғмқё мқҙмң мӨ‘ н•ҳлӮҳлЎң 여겨진лӢӨ.[31][32] мҙҲкё° мҠ№лҰ¬лЎң мӢңлӘ¬ л°”лҘҙ мҪ”нҒ¬л°”мқҳ м§ҖлҸ„ м•„лһҳ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Җ 3л…„ лҸҷм•Ҳ мң лҢҖмқҳ лҢҖл¶Җ분 м§Җм—ӯм—җ лҸ…лҰҪ көӯк°ҖлҘј м„ёмҡё мҲҳ мһҲм—Ҳм§Җл§Ң,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нҶөм ңн–ҲлҠ”м§ҖлҠ” л¶Ҳнҷ•мӢӨн•ҳлӢӨ. кі кі н•ҷ м—°кө¬м—җ л”°лҘҙл©ҙ л°”лҘҙ мҪ”нҒ¬л°”к°Җ мқҙ лҸ„мӢңлҘј м җл №н–ҲлӢӨлҠ” мҰқкұ°лҠ” л°ңкІ¬лҗҳм§Җ м•Ҡм•ҳлӢӨ.[33] н•ҳл“ңлҰ¬м•„лҲ„мҠӨлҠ” м••лҸ„м Ғмқё лі‘л ҘмңјлЎң лҢҖмқ‘н•ҳм—¬ л°ҳлһҖмқ„ 진압н•ҳкі мҲҳмӢӯл§Ң лӘ…мқҳ мң лҢҖмқёмқ„ мӮҙн•ҙн–Ҳмңјл©°, лҸ„мӢңлҘј лЎңл§Ҳ мӢқлҜјм§ҖлЎң мһ¬м •м°©мӢңмј°лӢӨ.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Җ мҳҲлЈЁмӮҙл ҳ м§Җм—ӯм—җм„ң 추방лҗҳм—Ҳкі ,[34] нӢ°мғӨ л°”лёҢ (м•„лёҢ мӣ” 9мқј) лӮ , мҰү л‘җ м„ұм „мқҳ нҢҢкҙҙлҘј м• лҸ„н•ҳлҠ” кёҲмӢқмқјмқ„ м ңмҷён•ҳкі лҠ” мЈҪмқҢмқҳ кі нҶөмқ„ л¬ҙлҰ…м“°кі лҸ„мӢң 진мһ…мқҙ кёҲм§Җлҗҳм—ҲлӢӨ.[35] кі лҢҖ нӣ„кё°нӣ„кё° лЎңл§Ҳ мӢңлҢҖ нӣ„кё° лЎңл§Ҳ мӢңлҢҖмқҳ м•„мқјлҰ¬м•„ м№ҙн”јнҶЁлҰ¬лӮҳлҠ” лЎңл§Ҳ мӢқлҜјм§ҖмҳҖмңјл©°, нҸ¬лЈёкіј лЎңл§Ҳ мӢ л“Өм—җкІҢ л°”м№ҳлҠ” мӢ м „ л“ұ лӘЁл“ м „нҳ•м Ғмқё кё°кҙҖкіј мғҒ징мқ„ к°–м¶”кі мһҲм—ҲлӢӨ. н•ҳл“ңлҰ¬м•„лҲ„мҠӨлҠ” лҸ„мӢңмқҳ мЈјмҡ” нҸ¬лЈёмқ„ мЈј м№ҙлҘҙлҸ„мҷҖ лҚ°мҝ л§ҲлҲ„мҠӨмқҳ көҗм°Ём җм—җ л‘җм—ҲлҠ”лҚ°, мқҙкіімқҖ нҳ„мһ¬ (лҚ” мһ‘мқҖ) л¬ҙлҰ¬мҠӨнғҖлӮҳк°Җ мң„м№ҳн•ң кіімқҙлӢӨ. к·ёлҠ” лҳҗн•ң мң н”јн…ҢлҘҙм—җкІҢ кұ°лҢҖн•ң мӢ м „мқ„ м§Җм—ҲлҠ”лҚ°, мқҙ мӢ м „мқҖ лӮҳмӨ‘м—җ м„ұл¬ҳкөҗнҡҢ л¶Җм§Җк°Җ лҗҳм—ҲлӢӨ.[36] мқҙ лҸ„мӢңлҠ” м„ұлІҪмқҙ м—Ҷм—Ҳмңјл©°, н”„л Ҳн…җмӢңмҠӨ м ң10кө°лӢЁмқҳ кІҪ비лҢҖ мҶҢмҲҳк°Җ л°©м–ҙн–ҲлӢӨ. лӢӨмқҢ л‘җ м„ёкё° лҸҷм•Ҳ мқҙ лҸ„мӢңлҠ” 비көҗм Ғ мӨ‘мҡ”н•ҳм§Җ м•ҠмқҖ мқҙкөҗ лЎңл§Ҳ лҸ„мӢңлЎң лӮЁм•„ мһҲм—ҲлӢӨ. л§Ңн•ҳнҠёмқҳ лЎңл§Ҳ кө°лӢЁ л¬ҳм§Җ, м•„мқё м•јм—ҳкіј лқјл§ҲнҠё лқјн—¬мқҳ лЎңл§Ҳ л№Ңлқј мң м Ғ, к·ёлҰ¬кі нҳ„лҢҖ мҳҲлЈЁмӮҙл ҳ кІҪкі„ лӮҙм—җ мһҲлҠ” кё°лёҢм•„ нҠё лһҢ к·јмІҳм—җм„ң л°ңкІ¬лҗң м ң10кө°лӢЁмқҳ к°Җл§Ҳн„°лҠ” лӘЁл‘җ м•„мқјлҰ¬м•„ м№ҙн”јнҶЁлҰ¬лӮҳ мЈјліҖмқҳ лҶҚмҙҢ м§Җм—ӯмқҙ лЎңл§Ҳнҷ” кіјм •мқ„ кІӘм—Ҳмңјл©°, нӣ„кё° лЎңл§Ҳ мӢңлҢҖм—җ лЎңл§Ҳ мӢңлҜјкіј лЎңл§Ҳ мһ¬н–Ҙ кө°мқёл“Өмқҙ мқҙ м§Җм—ӯм—җ м •м°©н–ҲмқҢмқ„ ліҙм—¬мЈјлҠ” 징нӣ„мқҙлӢӨ.[37]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Җ лЎңл§Ҳмқҳ мҶҚмЈјлЎң лӮЁм•„ мһҲлҠ” лҸҷм•Ҳм—җлҸ„ кі„мҶҚн•ҙм„ң лҸ„мӢң м¶ңмһ…мқҙ кёҲм§Җлҗҳм—ҲлӢӨ. 비мһ”нӢҙ мӢңлҢҖ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кё°лҸ…көҗнҷ” мқҙнӣ„,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кё°лҸ…көҗ мҳҲл°°мқҳ мӨ‘мӢ¬м§ҖлЎң лІҲм„ұн–ҲлӢӨ. 312л…„ н•ҳлҠҳм—җм„ң мӢӯмһҗк°Җ нҷҳмҳҒмқ„ ліҙм•ҳлӢӨкі м•Ңл Ө진 нӣ„, мҪҳмҠӨнғ„нӢ°лҲ„мҠӨ 1м„ёлҠ” кё°лҸ…көҗлҘј м„ нҳён•ҳкё° мӢңмһ‘н–Ҳкі , мў…көҗлҘј н•©лІ•нҷ”н•ҳлҠ” л°Җлқјл…ё м№ҷл №м—җ м„ңлӘ…н–Ҳмңјл©°, к·ёмқҳ м–ҙлЁёлӢҲ н”Ңлқјл№„м•„ мңЁлҰ¬м•„ н—¬л ҲлӮҳ м•„мҡ°кө¬мҠӨнғҖлҘј мҳҲлЈЁмӮҙл ҳмңјлЎң ліҙлӮҙ мҳҲмҲҳмқҳ л¬ҙлҚӨмқ„ м°ҫкІҢ н–ҲлӢӨ. н—¬л ҲлӮҳлҠ” мҲңлЎҖлҘј мң„н•ҙ мҳҲлЈЁмӮҙл ҳмңјлЎң м—¬н–үмқ„ к°”кі , к·ёкіім—җм„ң мҳҲмҲҳк°Җ мӢӯмһҗк°Җм—җ лӘ» л°•нһҲкі , 묻нһҲкі , л¶Җнҷңн•ң мһҘмҶҢлҘј нҷ•мқён–ҲлӢӨ. к·ё мһҗлҰ¬м—җлҠ” м„ұл¬ҳкөҗнҡҢк°Җ кұҙм„Өлҗҳм–ҙ 335л…„м—җ лҙүн—Ңлҗҳм—ҲлӢӨ. н—¬л ҲлӮҳлҠ” лҳҗн•ң м°ёлҗң мӢӯмһҗк°ҖлҘј л°ңкІ¬н–ҲлӢӨкі мЈјмһҘн–ҲлӢӨ. 비мһ”нӢҙ мӢңлҢҖмқҳ л§ӨмһҘ мң н•ҙлҠ” мҳӨм§Ғ кё°лҸ…көҗмқёл“ӨлЎңл§Ң кө¬м„ұлҗҳм–ҙ мһҲмңјл©°, мқҙлҠ” 비мһ”нӢҙ мӢңлҢҖ 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мқёкө¬к°Җ м•„л§ҲлҸ„ кё°лҸ…көҗмқёл“ӨлЎңл§Ң кө¬м„ұлҗҳм–ҙ мһҲм—ҲмқҢмқ„ мӢңмӮ¬н•ңлӢӨ.[38]  5м„ёкё°м—җ лЎңл§Ҳ м ңкөӯмқҳ лҸҷл°© м—°мҶҚкөӯмқё мғҲлЎң мқҙлҰ„ м§Җм–ҙ진 мҪҳмҠӨнғ„нӢ°л…ёнҸҙлҰ¬мҠӨмқҳ м§Җл°°лҘј л°ӣлҠ” көӯк°Җк°Җ лҸ„мӢңлҘј нҶөм ңн–ҲлӢӨ. лӘҮмӢӯ л…„ л§Ңм—җ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비мһ”нӢҙм—җм„ң нҺҳлҘҙмӢңм•„мқҳ нҶөм№ҳлЎң, к·ёлҰ¬кі лӢӨмӢң лЎңл§Ҳ-비мһ”нӢҙмқҳ м§Җл°°лЎң л°”лҖҢм—ҲлӢӨ. мӮ¬мӮ° м ңкөӯмқҳ нҳёмҠӨлЎң 2м„ёк°Җ 7м„ёкё° мҙҲ мӢңлҰ¬м•„лҘј нҶөкіјн•ҳм—¬ 진кө°н•ң нӣ„, к·ёмқҳ мһҘкө°мқё мғӨнқҗлҘҙл°”лқјмҰҲмҷҖ мғӨнһҢ л°”нқҗл§ҢмһҗлҚ°к°„мқҖ нҢ”л ҲмҠӨнӢ°лӮҳ н”„лҰ¬л§Ҳмқҳ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ҳ лҸ„мӣҖмқ„ л°ӣм•„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кіөкІ©н–ҲлҠ”лҚ°, мқҙл“ӨмқҖ 비мһ”нӢҙм—җ лҢҖн•ӯн•ҳм—¬ лҙүкё°н–Ҳм—ҲлӢӨ.[40] мҳҲлЈЁмӮҙл ҳ мӮ¬мӮ° мҷ•мЎ° м •ліөм—җм„ң 21мқјк°„мқҳ лҒҠмһ„м—ҶлҠ” кіөм„ұм „ лҒқм—җ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н•ЁлқҪлҗҳм—ҲлӢӨ. 비мһ”нӢҙ м—°лҢҖкё°лҠ” мӮ¬мӮ° мҷ•мЎ°мҷҖ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ҙ лҸ„мӢңм—җм„ң мҲҳл§Ң лӘ…мқҳ кё°лҸ…көҗмқёмқ„ н•ҷмӮҙн–Ҳмңјл©°, л§ҺмқҖ мқҙл“Өмқҙ л§ҳл°Җлқј м—°лӘ»м—җм„ң н•ҷмӮҙлҗҳм—Ҳкі ,[41][42] м„ұл¬ҳкөҗнҡҢлҘј нҸ¬н•Ён•ң к·ёл“Өмқҳ кё°л…җл¬јкіј көҗнҡҢлҘј нҢҢкҙҙн–ҲлӢӨкі м „н•ңлӢӨ. мқҙ мӮ¬кұҙмқҖ м—ӯмӮ¬к°Җл“Ө мӮ¬мқҙм—җм„ң л§ҺмқҖ л…јмҹҒмқҳ лҢҖмғҒмқҙ лҗҳм–ҙмҷ”лӢӨ.[43] м •ліөлҗң лҸ„мӢңлҠ” мқҙлқјнҒҙлҰ¬мҳӨмҠӨ нҷ©м ңк°Җ 629л…„м—җ мһ¬м •ліөн• л•Ңк№Ңм§Җ м•Ҫ 15л…„ лҸҷм•Ҳ мӮ¬мӮ° мҷ•мЎ°мқҳ мҲҳмӨ‘м—җ лӮЁм•„ мһҲм—ҲлӢӨ.[44] мӨ‘м„ё мӢңлҢҖмҙҲкё° мқҙмҠ¬лһҢ мӢңлҢҖлқјмӢңл‘”, мҡ°л§Ҳмқҙм•ј, м•„л°”мҠӨ м№јлҰ¬нҢҢкөӯ 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638л…„м—җ м•„лһҚ м№јлҰ¬нҢҢкөӯмқҳ мІ« м •ліөм§Җ мӨ‘ н•ҳлӮҳмҳҖлӢӨ. лӢ№мӢң м•„лһҚ м—ӯмӮ¬к°Җл“Өм—җ л”°лҘҙл©ҙ, лқјмӢңл‘” м№јлҰ¬н”„ мҡ°л§ҲлҘҙ мқҙлёҗ м•Ңм№ҙнғҖлёҢлҠ” м§Ғм ‘ лҸ„мӢңлЎң к°Җм„ң н•ӯліөмқ„ л°ӣм•ҳмңјл©°, к·ё кіјм •м—җм„ң м„ұм „мӮ°мқ„ мІӯмҶҢн•ҳкі кё°лҸ„н–ҲлӢӨ. мҡ°л§ҲлҘҙ мқҙлёҗ м•Ңм№ҙнғҖлёҢлҠ”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ҙ лҸ„мӢңлЎң лҸҢм•„мҷҖ лЎңл§Ҳмқёкіј 비мһ”нӢҙмқёл“Өм—җкІҢ 3м„ёкё° лҸҷм•Ҳ 추방лӢ№н•ң нӣ„ мһҗмң лЎӯкІҢ мӮҙкі мҳҲл°°н• мҲҳ мһҲлҸ„лЎқ н—Ҳмҡ©н–ҲлӢӨ. мқҙмҠ¬лһҢ нҶөм№ҳ мҙҲкё°м—җ, нҠ№нһҲ мҡ°л§Ҳмқҙм•ј м№јлҰ¬нҢҢкөӯ (650-750) мӢңлҢҖм—җ лҸ„мӢңлҠ” лІҲм„ұн–ҲлӢӨ. м„ңкё° 691-692л…„кІҪ, л°”мң„мқҳ лҸ”мқҙ м„ұм „мӮ°м—җ кұҙм„Өлҗҳм—ҲлӢӨ. мқҙлҠ” лӘЁмҠӨнҒ¬к°Җ м•„лӢҲлқј 주춧лҸҢмқ„ мӢ м„ұмӢңн•ҳлҠ” м„ұмҶҢмқҙлӢӨ. м•Ңм•„нҒ¬мӮ¬ лӘЁмҠӨнҒ¬лҸ„ 7м„ёкё° нӣ„л°ҳ лҳҗлҠ” 8м„ёкё° мҙҲ мҡ°л§Ҳмқҙм•ј нҶөм№ҳ н•ҳм—җ ліөн•© лӢЁм§Җмқҳ лӮЁмӘҪ лҒқм—җ кұҙм„Өлҗҳм—Ҳмңјл©°, л¬ҙн•Ёл§Ҳл“ңк°Җ л°Өмқҳ м—¬н–ү мӨ‘ л°©л¬ён–ҲлҚҳ мһҘмҶҢлЎң мҝ лһҖм—җ м–ёкёүлҗң лҸҷлӘ…мқҳ мһҘмҶҢмҷҖ кҙҖл Ёлҗҳм–ҙ мһҲлӢӨ. мҝ лһҖм—җлҠ” мҳҲлЈЁмӮҙл ҳмқҙ м–ҙл–Ө мқҙлҰ„мңјлЎңлҸ„ м–ёкёүлҗҳм–ҙ мһҲм§Җ м•Ҡмңјл©°, мҝ лһҖмқҖ м•Ңм•„нҒ¬мӮ¬ лӘЁмҠӨнҒ¬мқҳ м •нҷ•н•ң мң„м№ҳлҘј м–ёкёүн•ҳм§Җ м•ҠлҠ”лӢӨ.[45][46] мқјл¶Җ н•ҷмһҗл“ӨмқҖ мҝ лһҖм—җ м–ёкёүлҗң м•Ңм•„нҒ¬мӮ¬ лӘЁмҠӨнҒ¬мҷҖ 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м„ұм „мӮ° мӮ¬мқҙмқҳ м—°кҙҖм„ұмқҙ лӢ№мӢң к·ёл“Өмқҳ м Ғ м•„лёҢл“ң м•Ңлқј мқҙлёҗ м•Ң-мЈјл°”мқҙлҘҙм—җ мқҳн•ҙ нҶөм№ҳлҗҳлҚҳ л©”м№ҙ м„ұм§Җмқҳ лӘ…м„ұмқ„ кІҪмҹҒн•ҳкё° мң„н•ң мҡ°л§Ҳмқҙм•ј м •м№ҳ мқҳм ңмқҳ кІ°кіјлқјкі мЈјмһҘн•ңлӢӨ.[47][48] м•„л°”мҠӨ м№јлҰ¬нҢҢкөӯ мӢңлҢҖ(750вҖ“969)лҠ” мҙҲкё° л¬ҙмҠ¬лҰј мӢңлҢҖ мӨ‘ к°ҖмһҘ л¬ём„ңнҷ”к°Җ лҚң лҗң мӢңкё°мқҙлӢӨ. м„ұм „мӮ° м§Җм—ӯмқҖ м•Ңл Ө진 кұҙ축 нҷңлҸҷмқҳ мӨ‘мӢ¬м§ҖмҳҖмңјл©°, м§Җ진мңјлЎң мҶҗмғҒлҗң кө¬мЎ°л¬јл“Өмқҙ мҲҳлҰ¬лҗҳм—ҲлӢӨ. м§ҖлҰ¬н•ҷмһҗ мқҙлёҗ н•ҳмҡ°м№јкіј м•ҢмқҙмҠӨнғҖнҒ¬лҰ¬(10м„ёкё°)лҠ”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"нҢ”л ҲмҠӨнғҖмқём—җм„ң к°ҖмһҘ 비мҳҘн•ң м§Җл°©"мқҙлқјкі л¬ҳмӮ¬н•ҳлҠ” л°ҳл©ҙ, к·ё лҸ„мӢңмқҳ нҶ л°•мқҙмқҙмһҗ м§ҖлҰ¬н•ҷмһҗмқё м•Ңл¬ҙм№ҙлӢӨмӢң (946л…„ м¶ңмғқ)лҠ” к·ёмқҳ к°ҖмһҘ мң лӘ…н•ң м Җмһ‘мқё 'кё°нӣ„ м§ҖмӢқмқҳ к°ҖмһҘ мўӢмқҖ 분лҘҳ'м—җм„ң к·ё лҸ„мӢңмқҳ м°¬м–‘м—җ л§ҺмқҖ нҺҳмқҙм§ҖлҘј н• м• н–ҲлӢӨ. л¬ҙмҠ¬лҰј нҶөм№ҳ н•ҳм—җм„ң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лӢӨл§ҲмҠӨмҝ мҠӨ, л°”к·ёлӢӨл“ң, м№ҙмқҙлЎң л“ұ мҲҳлҸ„л“Өмқҙ лҲ„л ёлҚҳ м •м№ҳм Ғ лҳҗлҠ” л¬ёнҷ”м Ғ м§Җмң„лҘј м–»м§Җ лӘ»н–ҲлӢӨ. м•Ңл¬ҙм№ҙлӢӨмӢңлҠ” 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м•„лһҚм–ҙ мқҙлҰ„мқё л°”мқҙнҠё м•Ңл¬ҙм№ҙлӢӨмҠӨм—җм„ң к·ёмқҳ мқҙлҰ„мқ„ л”°мҷ”лҠ”лҚ°, мқҙлҠ” нһҲлёҢлҰ¬м–ҙ лІ мқҙнҠё н•ҳлҜёнҒ¬лӢӨмӢң(м„ұм „, кұ°лЈ©н•ң 집)мҷҖ м–ём–ҙм ҒмңјлЎң лҸҷл“ұн•ҳлӢӨ. нҢҢнӢ°л§Ҳ мҷ•мЎ° мӢңлҢҖмҙҲкё° м•„лһҚ мӢңлҢҖлҠ” лҳҗн•ң мў…көҗм Ғ кҙҖмҡ©мқҳ мӢңлҢҖмҳҖлӢӨ. к·ёлҹ¬лӮҳ 11м„ёкё° мҙҲ, мқҙ집нҠёмқҳ нҢҢнӢ°л§Ҳ м№јлҰ¬н”„ м•Ңн•ҳнӮҙ 비아лҜҖлҘҙ м•ҢлқјлҠ” лӘЁл“ көҗнҡҢмқҳ нҢҢкҙҙлҘј лӘ…л №н–ҲлӢӨ. 1033л…„, лҳҗ лӢӨлҘё м§Җ진мқҙ л°ңмғқн•ҳм—¬ м•Ңм•„нҒ¬мӮ¬ лӘЁмҠӨнҒ¬к°Җ мӢ¬н•ҳкІҢ мҶҗмғҒлҗҳм—ҲлӢӨ. нҢҢнӢ°л§Ҳ м№јлҰ¬н”„ м•ҢмһҗнһҲлҘҙлҠ” 1034л…„м—җм„ң 1036л…„ мӮ¬мқҙм—җ лӘЁмҠӨнҒ¬лҘј мһ¬кұҙн•ҳкі мҷ„м „нһҲ ліҙмҲҳн–ҲлӢӨ. ліёлӢ№мқҳ мҲҳлҠ” 15к°ңм—җм„ң 7к°ңлЎң лҢҖнҸӯ мӨ„м—ҲлӢӨ.[49] м•ҢмһҗнһҲлҘҙлҠ” нҳ„мһ¬ лӘЁмҠӨнҒ¬мқҳ кё°мҙҲ м—ӯн• мқ„ н•ҳлҠ” мӨ‘м•ҷ нҷҖкіј нҶөлЎңмқҳ л„Ө м•„мјҖмқҙл“ңлҘј кұҙм„Өн–ҲлӢӨ. мӨ‘м•ҷ нҶөлЎңлҠ” лӢӨлҘё нҶөлЎңмқҳ л‘җ л°° л„Ҳ비мҳҖкі , к·ё мң„м—җ лӘ©мһ¬лЎң л§Ңл“ лҸ”мқҙ м–№нҳҖ진 нҒ° л°•кіө м§Җ붕мқҙ мһҲм—ҲлӢӨ.[50] нҺҳлҘҙмӢңм•„ м§ҖлҰ¬н•ҷмһҗ лӮҳмӢңлҘҙ нӣ„мҠӨлқјмҡ°лҠ” 1047л…„ л°©л¬ё мӨ‘ м•Ңм•„нҒ¬мӮ¬ лӘЁмҠӨнҒ¬лҘј лӢӨмқҢкіј к°ҷмқҙ л¬ҳмӮ¬н•ңлӢӨ.
м…ҖмЈјнҒ¬ мӢңлҢҖм•Ңл¬ҙмҠӨнғ„мӢңлҘҙ л№Ңлқјнқҗмқҳ нӣ„кі„мһҗмқё м•Ңл¬ҙмҠӨнғ„мӢңлҘҙ л№Ңлқјнқҗ м№ҳн•ҳм—җм„ң нҢҢнӢ°л§Ҳ м№јлҰ¬нҢҢкөӯмқҖ м№ҙмқҙлЎңм—җм„ң к¶Ңл Ҙмқ„ лҶ“кі нҢҢлІҢл“Өмқҙ лӢӨнҲ¬л©ҙм„ң л¶Ҳм•Ҳм •кіј мҮ нҮҙмқҳ мӢңкё°м—җ м ‘м–ҙл“Өм—ҲлӢӨ. 1071л…„,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нҲ¬лҘҙнҒ¬ кө°лІҢ м•„нӢ°мҰҲ мқҙлёҗ мҡ°л°”нҒ¬м—җкІҢ м җл №лҗҳм—ҲлҠ”лҚ°, к·ёлҠ” м…ҖмЈјнҒ¬ нҠҖлҘҙнҒ¬к°Җ мӨ‘лҸҷ м „м—ӯмңјлЎң нҷ•мһҘн•ҳлҠ” кіјм •мқҳ мқјнҷҳмңјлЎң мӢңлҰ¬м•„мҷҖ нҢ”л ҲмҠӨнғҖмқё лҢҖл¶Җ분мқ„ мһҘм•…н–ҲлӢӨ. нҲ¬лҘҙнҒ¬мқёл“ӨмқҖ лҸ…мӢӨн•ң мҲңлӢҲнҢҢмҳҖкё° л•Ңл¬ём—җ нҢҢнӢ°л§Ҳ мҷ•мЎ°лҝҗл§Ң м•„лӢҲлқј н•ң м„ёкё° лҸҷм•Ҳ нҢҢнӢ°л§Ҳ нҶөм№ҳ нӣ„ м§Җл°°к¶Ңмқ„ мһғм—ҲлӢӨкі мғқк°Ғн•ҳлҠ” мҲҳл§ҺмқҖ мӢңм•„нҢҢ л¬ҙмҠ¬лҰјл“Өм—җкІҢлҸ„ л°ҳлҢҖн–ҲлӢӨ. 1176л…„, мҳҲлЈЁмӮҙл ҳм—җм„ң мҲңлӢҲнҢҢмҷҖ мӢңм•„нҢҢ к°„мқҳ нҸӯлҸҷмқҙ мқјм–ҙлӮҳ нӣ„мһҗл“Өмқҳ н•ҷмӮҙлЎң мқҙм–ҙмЎҢлӢӨ. лҸ„мӢңмқҳ кё°лҸ…көҗмқёл“ӨмқҖ л°©н•ҙл°ӣм§Җ м•Ҡкі кё°лҸ…көҗ м„ұм§Җм—җ м ‘к·јн• мҲҳ мһҲм—Ҳм§Җл§Ң, 비мһ”нӢ°мӣҖкіјмқҳ м „мҹҒкіј мӢңлҰ¬м•„мқҳ мқјл°ҳм Ғмқё л¶Ҳм•Ҳм •мқҖ мң лҹҪ мҲңлЎҖмһҗл“Өмқҳ лҸ„м°©мқ„ л°©н•ҙн–ҲлӢӨ. м…ҖмЈјнҒ¬мқёл“ӨмқҖ лҳҗн•ң мөңк·јмқҳ нҳјлһҖмңјлЎң мқён•ң мҶҗмӢӨм—җлҸ„ л¶Ҳкө¬н•ҳкі м–ҙл–Ө көҗнҡҢлҸ„ мҲҳлҰ¬н•ҳлҠ” кІғмқ„ кёҲм§Җн–ҲлӢӨ. мқҙ мӢңкё°м—җлҠ” лҸ„мӢңм—җ мӨ‘мҡ”н•ң мң лҢҖмқё кіөлҸҷмІҙк°Җ м—Ҷм—ҲлҚҳ кІғмңјлЎң ліҙмқёлӢӨ. 1086л…„, лӢӨл§ҲмҠӨмҝ мҠӨмқҳ м…ҖмЈјнҒ¬ м•„лҜёлҘҙмқё нҲ¬нҲ¬мӢң 1м„ёлҠ” м•„лҘҙнҲ¬нҒ¬ лІ мқҙлҘј мҳҲлЈЁмӮҙл ҳ мҙқлҸ…мңјлЎң мһ„лӘ…н–ҲлӢӨ. м•„лҘҙнҲ¬нҒ¬лҠ” 1091л…„м—җ мӮ¬л§қн–Ҳмңјл©°, к·ёмқҳ м•„л“Ө мҮ нҒ¬л©ҳкіј мқјк°Җм§Җк°Җ к·ёлҘј кі„мҠ№н–ҲлӢӨ. 1098л…„ 8мӣ”, м…ҖмЈјнҒ¬мқёл“Өмқҙ мӢңлҰ¬м•„м—җ м ң1м°Ё мӢӯмһҗкө°мқҙ лҸ„м°©н•ҳм—¬ нҳјлһҖмҠӨлҹ¬мӣҢн•ҳлҠ” лҸҷм•Ҳ, м•Ңм•„н”„лӢ¬ мғӨн•ңмғӨ мҙқлҰ¬ нңҳн•ҳмқҳ нҢҢнӢ°л§Ҳмқёл“Өмқҙ лҸ„мӢң м•һм—җ лӮҳнғҖлӮҳ нҸ¬мң„ кіөкІ©мқ„ к°Җн–ҲлӢӨ. 6мЈј нӣ„, м…ҖмЈјнҒ¬ мҲҳ비лҢҖлҠ” н•ӯліөн–Ҳкі лӢӨл§ҲмҠӨмҝ мҠӨмҷҖ л””м•јлҘҙ л°”нҒ¬лҘҙлЎң л– лӮ мҲҳ мһҲлҸ„лЎқ н—ҲлқҪл°ӣм•ҳлӢӨ. нҢҢнӢ°л§Ҳмқҳ м җл № нӣ„м—җлҠ” лҢҖл¶Җ분мқҳ мҲңлӢҲнҢҢк°Җ 추방лҗҳм—Ҳкі , к·ёл“Ө мӨ‘ л§ҺмқҖ мҲҳк°Җ мӮҙн•ҙлҗҳм—ҲлӢӨ. мӢӯмһҗкө°/м•„мқҙмң лёҢ мӢңлҢҖ12м„ёкё°мҷҖ 13м„ёкё°лЎң кө¬м„ұлҗң мқҙ мӢңкё°лҠ” мҳҲлЈЁмӮҙл ҳ м—ӯмӮ¬м—җм„ң л•Ңл•ҢлЎң мӨ‘м„ё мӢңлҢҖлЎң л¶ҲлҰ°лӢӨ.[52] м ң1м°Ё мӢӯмһҗкө° мҷ•көӯ (1099вҖ“1187) 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нҢҢнӢ°л§Ҳ нҶөм№ҳлҠ” 1099л…„ 7мӣ” м ң1м°Ё мӢӯмһҗкө°м—җ мқҳн•ҙ м җл №лҗҳл©ҙм„ң лҒқлӮ¬лӢӨ. м җл №мқҖ кұ°мқҳ лӘЁл“ л¬ҙмҠ¬лҰјкіј мң лҢҖмқё мЈјлҜјмқҳ н•ҷмӮҙмқ„ лҸҷл°ҳн–ҲлӢӨ.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мҳҲлЈЁмӮҙл ҳ мҷ•көӯмқҳ мҲҳлҸ„к°Җ лҗҳм—ҲлӢӨ. кі л“ңн”„лЈЁм•„ л“ң л¶Җмҡ©мқҖ 1099л…„ 7мӣ” 22мқј мҳҲлЈЁмӮҙл ҳ мҳҒмЈјлЎң м„ м¶ңлҗҳм—ҲмңјлӮҳ, мҷ•кҙҖмқ„ м“°м§Җ м•Ҡкі 1л…„ нӣ„м—җ мӮ¬л§қн–ҲлӢӨ.[53] лӮЁмһ‘л“ӨмқҖ кі л“ңн”„лЈЁм•„мқҳ нҳ•м ңмқё ліҙл‘җм•ө, м—җлҚ°мӮ¬ л°ұмһ‘м—җкІҢ мҳҲлЈЁмӮҙл ҳ мҳҒмЈј мһҗлҰ¬лҘј м ңм•Ҳн–Ҳмңјл©°, к·ёлҠ” 1100л…„ нҒ¬лҰ¬мҠӨл§ҲмҠӨм—җ лІ л“Өл Ҳн—ҙ лҢҖм„ұлӢ№м—җм„ң н”јмӮ¬мқҳ лӢӨмһ„лІ лҘҙнҠё мҳҲлЈЁмӮҙл ҳ лқјнӢҙ мҙқлҢҖмЈјкөҗм—җкІҢ лҢҖкҙҖмӢқмқ„ кұ°н–үн–ҲлӢӨ.[53] м„ңмң лҹҪм—җм„ң мҳЁ кё°лҸ…көҗ м •м°©лҜјл“ӨмқҖ к·ёлҰ¬мҠӨлҸ„мқҳ мғқм• мҷҖ кҙҖл Ёлҗң мЈјмҡ” м„ұм§Җл“Өмқ„ мһ¬кұҙн•ҳкё° мӢңмһ‘н–ҲлӢӨ. м„ұл¬ҳкөҗнҡҢлҠ” кұ°лҢҖн•ң лЎңл§Ҳл„ӨмҠӨнҒ¬ м–‘мӢқмқҳ көҗнҡҢлЎң м•јмӢ¬м°ЁкІҢ мһ¬кұҙлҗҳм—Ҳкі , м„ұм „мӮ°мқҳ л¬ҙмҠ¬лҰј м„ұм§Җ(л°”мң„мқҳ лҸ”кіј м•Ңм•„нҒ¬мӮ¬ лӘЁмҠӨнҒ¬)лҠ” кё°лҸ…көҗ лӘ©м ҒмңјлЎң м „нҷҳлҗҳм—ҲлӢӨ. кө¬нҳёкё°мӮ¬лӢЁкіј м„ұм „кё°мӮ¬лӢЁмқҙлқјлҠ” кё°мӮ¬лӢЁмқҙ мқҙ н”„лһ‘нҒ¬мЎұ м җл № мӢңкё°м—җ мӢңмһ‘лҗҳм—ҲлӢӨ. мқҙ л‘ҳмқҖ 12м„ёкё°м—җ мҳҲлЈЁмӮҙл ҳмңјлЎң м—¬н–үн•ҳлҠ” мҲҳл§ҺмқҖ мҲңлЎҖмһҗл“Өмқ„ ліҙнҳён•ҳкі лҸҢліј н•„мҡ”м„ұм—җм„ң л°ңм „н–ҲлӢӨ. м•„мқҙмң лёҢ мҷ•мЎ° нҶөм№ҳмҳҲлЈЁмӮҙл ҳ мҷ•көӯмқҖ 1291л…„к№Ңм§Җ м§ҖмҶҚлҗҳм—Ҳм§Җл§Ң, мҳҲлЈЁмӮҙл ҳ мһҗмІҙлҠ” 1187л…„м—җ мӮҙлқјл”ҳм—җкІҢ мһ¬м җл №лҗҳм—Ҳкі (мҳҲлЈЁмӮҙл ҳ кіөл°©м „ (1187л…„) м°ёмЎ°), мӮҙлқјл”ҳмқҖ лӘЁл“ мў…көҗмқҳ мҳҲл°°лҘј н—Ҳмҡ©н–ҲлӢӨ. м—ҳлҰ¬м•ј л°”м•Ң мҶҖм—җ л”°лҘҙл©ҙ, 11м„ёкё°м—җлҠ” лҸ…мқјкі„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ҙ мҳҲлЈЁмӮҙл ҳм—җ мӮҙм•ҳлӢӨ. мқҙм•јкё°м—җ л”°лҘҙл©ҙ, лҸ…мқјм–ҙлҘј мӮ¬мҡ©н•ҳлҠ” мң лҢҖмқёмқҙ лҸҢлІ лҘҙкұ°лқјлҠ” м„ұм”ЁлҘј к°Җ진 м ҠмқҖ лҸ…мқј лӮЁмһҗмқҳ лӘ©мҲЁмқ„ кө¬н–ҲлӢӨ. л”°лқјм„ң м ң1м°Ё мӢӯмһҗкө° кё°мӮ¬л“Өмқҙ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нҸ¬мң„н•ҳлҹ¬ мҷ”мқ„ л•Ң, лҸҢлІ лҘҙкұ° к°ҖмЎұ мӨ‘ н•ң лӘ…мқҙ нҢ”л ҲмҠӨнғҖмқёмқҳ мң лҢҖмқёл“Өмқ„ кө¬м¶ңн•ҳм—¬ ліҙлҰ„мҠӨлқјлҠ” лҸ…мқј лҸ„мӢңлЎң лҚ°л Өк°Җ мқҖнҳңлҘј к°ҡм•ҳлӢӨ.[54] кұ°лЈ©н•ң лҸ„мӢңм—җ лҸ…мқј кіөлҸҷмІҙк°Җ мһҲм—ҲлӢӨлҠ” 추к°Җ мҰқкұ°лҠ” 11м„ёкё° нӣ„л°ҳм—җ лҸ…мқјм—җм„ң мҳҲлЈЁмӮҙл ҳмңјлЎң ліҙлӮҙ진 н• лқјм№ҙ м§Ҳл¬ёмқҳ нҳ•нғңлЎң лӮҳнғҖлӮңлӢӨ.[55]  1173л…„м—җ лІӨм•јлҜј нҲ¬лҚёлқјк°Җ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л°©л¬ён–ҲлӢӨ. к·ёлҠ”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м•јмҪ”비н…Ң, м•„лҘҙл©”лӢҲм•„мқё, к·ёлҰ¬мҠӨмқё, мЎ°м§Җм•„мқёл“ӨлЎң к°Җл“қ м°¬ мһ‘мқҖ лҸ„мӢңлЎң л¬ҳмӮ¬н–ҲлӢӨ. 200лӘ…мқҳ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ҙ лӢӨмң—мқҳ нғ‘ м•„лһҳ лҸ„мӢңмқҳ н•ң кө¬м„қм—җ мӮҙкі мһҲм—ҲлӢӨ. 1219л…„м—җ лҸ„мӢңмқҳ м„ұлІҪмқҖ м•„мқҙмң лёҢ мҲ нғ„көӯ лӢӨл§ҲмҠӨмҝ мҠӨ мҲ нғ„ м•Ңл¬ҙм•„мһ мқҙмӮ¬мқҳ лӘ…л №мңјлЎң нҢҢкҙҙлҗҳм—ҲлӢӨ. мқҙлЎң мқён•ҙ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л¬ҙ방비 мғҒнғңк°Җ лҗҳм—Ҳкі лҸ„мӢңмқҳ м§Җмң„м—җ нҒ° нғҖкІ©мқ„ мһ…м—ҲлӢӨ. м•„мқҙмң лёҢмқёл“ӨмқҖ нҸүнҷ” мЎ°м•Ҫмқҳ мқјнҷҳмңјлЎң лҸ„мӢңлҘј мӢӯмһҗкө°м—җкІҢ м–‘лҸ„н• кІғмқ„ мҳҲмғҒн•ҳкі м„ұлІҪмқ„ нҢҢкҙҙн–ҲлӢӨ. 1229л…„м—җ мқҙ집нҠёмқҳ нҶөм№ҳмһҗ м•Ңм№ҙл°Җкіјмқҳ мЎ°м•Ҫм—җ мқҳн•ҙ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лҸ…мқјмқҳ н”„лҰ¬л“ңлҰ¬нһҲ 2м„ёмқҳ мҶҗм—җ л“Өм–ҙмҷ”лӢӨ. 1239л…„м—җ 10л…„к°„мқҳ нңҙм „мқҙ л§ҢлЈҢлҗң нӣ„, к·ёлҠ” м„ұлІҪмқ„ мһ¬кұҙн•ҳкё° мӢңмһ‘н–Ҳм§Җл§Ң, к°ҷмқҖ н•ҙм—җ м№ҙлқјнҒ¬мқҳ м•„лҜёлҘҙ м•ҲлӮҳмӢңлҘҙ лӢӨмҡ°л“ңм—җ мқҳн•ҙ лӢӨмӢң нҢҢкҙҙлҗҳм—ҲлӢӨ. 1243л…„м—җ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лӢӨмӢң кё°лҸ…көҗмқёл“Өмқҳ мҶҗм—җ л„ҳм–ҙк°”кі , м„ұлІҪмқҖ мҲҳлҰ¬лҗҳм—ҲлӢӨ. н•ҳмҷҖлҰ¬мҰҳ м ңкөӯмқҖ 1244л…„м—җ лҸ„мӢңлҘј м җл №н–Ҳмңјл©°, 1247л…„м—җлҠ” м•„мқҙмң лёҢмқёл“Өм—җкІҢ м«“кІЁлӮ¬лӢӨ. 1260л…„м—җ нӣҢлқјкө¬ м№ё нңҳн•ҳмқҳ лӘҪкіЁкө°мқҙ нҢ”л ҲмҠӨнғҖмқёмңјлЎңмқҳ лӘҪкіЁ м•ҪнғҲмқ„ к°җн–үн–ҲлӢӨ. лӢ№мӢң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м „лһөм ҒмңјлЎң мӨ‘мҡ”н•ң м •м°©м§ҖлЎң к°„мЈјлҗҳм§Җ м•Ҡм•ҳкё° л•Ңл¬ём—җ лӘҪкіЁкө°мқҙ мҳҲлЈЁмӮҙл ҳм—җ мһҲм—ҲлҠ”м§ҖлҠ” л¶Ҳ분лӘ…н•ҳлӢӨ. к·ёлҹ¬лӮҳ мҳҲлЈЁмӮҙл ҳм—җ мһҲлҚҳ мқјл¶Җ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ҙ мқјмӢңм ҒмңјлЎң мқҙмӣғ л§Ҳмқ„лЎң лҸ„н”јн–ҲлӢӨлҠ” ліҙкі к°Җ мһҲлӢӨ. л§ҳлЈЁнҒ¬ мӢңлҢҖ1250л…„ м•„мқҙмң лёҢ мҷ•мЎ° лӮҙмқҳ мң„кё°лҠ” л§ҳлЈЁнҒ¬мқҳ к¶Ңл Ҙ мһҘм•…кіј л§ҳлЈЁнҒ¬ мҲ нғ„көӯмңјлЎңмқҳ м „нҷҳмқ„ к°Җм ёмҷ”мңјл©°, мқҙлҠ” л°”нқҗлҰ¬ мҷ•мЎ°мҷҖ л¶ҖлҘҙм§Җ мҷ•мЎ° мӢңлҢҖлЎң лӮҳлүңлӢӨ. м•„мқҙмң лёҢмқёл“ӨмқҖ мӢңлҰ¬м•„м—җм„ң к¶Ңл Ҙмқ„ мң м§Җн•ҳл Өкі л…ёл Ҙн–Ҳм§Җл§Ң, 1260л…„ лӘҪкіЁ м№ЁлһөмңјлЎң мқҙлҠ” лҒқмқҙ лӮ¬лӢӨ. л§ҳлЈЁнҒ¬ кө°лҢҖлҠ” лӘҪкіЁ м№Ёлһөкө°мқ„ л¬јлҰ¬міӨкі , к·ё кІ°кіј л°”мқҙл°”лҘҙмҠӨ, мҰү л§ҳлЈЁнҒ¬ көӯк°Җмқҳ м§„м •н•ң м°ҪмӢңмһҗк°Җ мқҙ집нҠё, л Ҳл°ҳнҠё, н—ӨмһҗмҰҲмқҳ нҶөм№ҳмһҗлЎң л¶ҖмғҒн–ҲлӢӨ.[56]:54 л§ҳлЈЁнҒ¬мқёл“ӨмқҖ 1260л…„л¶Җн„° 1516л…„к№Ңм§Җ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нҸ¬н•Ён•ң нҢ”л ҲмҠӨнғҖмқёмқ„ нҶөм№ҳн–ҲлӢӨ.[57] 1260л…„ мқҙнӣ„ мҲҳмӢӯ л…„ лҸҷм•Ҳ к·ёл“ӨмқҖ мқҙ м§Җм—ӯм—җ лӮЁм•„мһҲлҠ” мӢӯмһҗкө° көӯк°Җл“Өмқ„ м ңкұ°н•ҳкё° мң„н•ҙ л…ёл Ҙн–ҲлӢӨ. мқҙл“Ө мӨ‘ л§Ҳм§Җл§ү көӯк°ҖлҠ” 1291л…„ м•„нҒ¬л Ҳ н•ЁлқҪмңјлЎң нҢЁл°°н–ҲлӢӨ.[56]:54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л§ҳлЈЁнҒ¬ кұҙ축мқҳ мӨ‘мҡ”н•ң нӣ„мӣҗм§ҖмҳҖлӢӨ. мқҙ мӢңкё° лҸ„мӢңмқҳ л№ҲлІҲн•ң кұҙ축 нҷңлҸҷмқҖ 13м„ёкё°л¶Җн„° 15м„ёкё°м—җ кұёміҗ м§Җм–ҙ진 90к°ңмқҳ лӮЁм•„ мһҲлҠ” кұҙ축물м—җм„ң мҰқлӘ…лҗңлӢӨ.[57] кұҙ축물мқҳ мў…лҘҳлҠ” л§Ҳл“ңлқјмӮ¬, лҸ„м„ңкҙҖ, лі‘мӣҗ, мәҗлҹ¬л°ҙм„ңлқјмқҙ, 분мҲҳ(лҳҗлҠ” мӮ¬л№Ң), кіөмӨ‘лӘ©мҡ•нғ• л“ұмқҙ мһҲм—ҲлӢӨ.[57] лҢҖл¶Җ분мқҳ кұҙ축 нҷңлҸҷмқҖ м„ұм „мӮ° лҳҗлҠ” н•ҳлһҢ м•ҢмғӨлҰ¬н”„мқҳ к°ҖмһҘмһҗлҰ¬м—җ 집мӨ‘лҗҳм—ҲлӢӨ.[57] мқҙкіімқҳ мҳӨлһҳлҗң л¬ёл“ӨмқҖ мӨ‘мҡ”м„ұмқ„ мһғкі мғҲлЎңмҡҙ л¬ёл“Өмқҙ кұҙм„Өлҗҳм—Ҳмңјл©°,[57] м„ұм „мӮ° кҙ‘мһҘ к°ҖмһҘмһҗлҰ¬лҘј л”°лқј л¶ҒмӘҪкіј м„ңмӘҪ нҡҢлһ‘мқҳ мғҒлӢ№ л¶Җ분мқҙ мқҙ мӢңкё°м—җ кұҙм„Өлҗҳкұ°лӮҳ мһ¬кұҙлҗҳм—ҲлӢӨ.[56] м•ҲлӮҳмӢңлҘҙ л¬ҙн•Ёл§Ҳл“ң нҶөм№ҳ кё°к°„ лҸҷм•Ҳ мӢңлҰ¬м•„лҘј лӢҙлӢ№н–ҲлҚҳ л§ҳлЈЁнҒ¬ м•„лҜёлҘҙ нғ„нӮӨмҰҲлҠ” 1336-7л…„м—җ мҲҳнҒ¬ м•ҢмәҮнғҖнӢҙ(л©ҙ мӢңмһҘ)мқҙлқјлҠ” мғҲлЎңмҡҙ мӢңмһҘмқ„ кұҙм„Өн–Ҳмңјл©°, мқҙ мӢңмһҘм—җм„ң м„ұм „мӮ°мңјлЎң м ‘к·јн• мҲҳ мһҲлҠ” л°Ҙ м•ҢмәҮнғҖлӢҢ(л©ҙ л¬ё)мқҙлқјлҠ” л¬ёлҸ„ н•Ёк»ҳ кұҙм„Өн–ҲлӢӨ.[57][56] нӣ„кё° л§ҳлЈЁнҒ¬ мҲ нғ„ м•Ңм•„мҠҲлқјн”„ м№ҙмқҙнҠёлІ мқҙ лҳҗн•ң мқҙ лҸ„мӢңм—җ кҙҖмӢ¬мқ„ к°ҖмЎҢлӢӨ. к·ёлҠ” 1482л…„м—җ мҷ„кіөлҗң л§Ҳл“ңлқјмӮ¬ м•Ң-м•„мҠҲлқјн”јм•јмҷҖ 1482л…„ м§Ғнӣ„м—җ кұҙм„Өлҗң мқёк·јмқҳ м№ҙмқҙнҠёлІ мқҙмқҳ мғҳмқ„ мқҳлў°н–Ҳмңјл©°, л‘ҳ лӢӨ м„ұм „мӮ°м—җ мң„м№ҳн–ҲлӢӨ.[57][56] м№ҙмқҙнҠёлІ мқҙмқҳ кё°л…җл¬јл“ӨмқҖ мқҙ лҸ„мӢңм—җм„ң л§Ҳм§Җл§ү мЈјмҡ” л§ҳлЈЁнҒ¬ кұҙ축물мқҙм—ҲлӢӨ.[56]:589вҖ“612 мң лҢҖмқёмқҳ мЎҙмһ¬мқҳмӢ¬мҠӨлҹ¬мҡҙ 진мң„мқҳ м¶ңмІҳлҘј кё°л°ҳмңјлЎң н•ң лһҚ비 мң лҢҖкөҗ м „нҶөм—җ л”°лҘҙл©ҙ 1267л…„ мң лҢҖ м№ҙнғҲлЈЁлғҗ нҳ„мһҗ лӮҳнқҗл§ҲлӢҲлҚ°мҠӨк°Җ мҳҲлЈЁмӮҙл ҳмңјлЎң м—¬н–үн•ҳм—¬, лӮҳмӨ‘м—җ к·ёмқҳ мқҙлҰ„мқ„ л”°м„ң лӘ…лӘ…лҗң лһҢл°ҳ нҡҢлӢ№мқ„ м„ёмӣ лҠ”лҚ°,[58] мҳӨлҠҳлӮ мҳҲлЈЁмӮҙл ҳм—җм„ң л‘җ лІҲм§ёлЎң мҳӨлһҳлҗң нҳ„мЎҙн•ҳлҠ” нҡҢлӢ№мңјлЎң, м•Ҫ 300л…„ м „м—җ м§Җм–ҙ진 м№ҙлқјмқҙнҠё мң лҢҖмқё нҡҢлӢ№ лӢӨмқҢмқҙлӢӨ. н•ҷмһҗл“ӨмқҖ лһҢл°ҳ нҡҢлӢ№мқҳ кұҙ축 мӢңкё°лҘј 13м„ёкё° лҳҗлҠ” к·ё мқҙнӣ„лЎң ліёлӢӨ.[58] лқјнӢҙкөҗмқҳ мЎҙмһ¬ м•„мӢңмӢңмқҳ н”„лһҖм№ҳмҠӨмҪ”к°Җ м°ҪлҰҪн•ң н”„лһҖм№ҳмҠӨмҪ”нҡҢ мў…көҗ лӢЁмІҙмқҳ мҙҲлҢҖ кҙҖкө¬мһҘ лҳҗлҠ” мғҒкёүмһҗлҠ” м•„мӢңмӢңмқҳ нҳ•м ң м—ҳлҰ¬м•„мҳҖлӢӨ. 1219л…„м—җ м°ҪлҰҪмһҗ мһҗмӢ мқҙ л¬ҙмҠ¬лҰјмқ„ нҳ•м ңк°Җ м•„лӢҢ м ҒмңјлЎң к°„мЈјн•ҳм§Җ м•Ҡкі ліөмқҢмқ„ м „н•ҳкё° мң„н•ҙ мқҙ м§Җм—ӯмқ„ л°©л¬ён–ҲлӢӨ. мқҙ мһ„л¬ҙлҠ” мқҙ집нҠёмқҳ мҲ нғ„ л§җлҰ¬нҒ¬ м•Ңм№ҙл°Җкіјмқҳ л§ҢлӮЁмңјлЎң мқҙм–ҙмЎҢлҠ”лҚ°, к·ёлҠ” к·ёмқҳ нҠ№мқҙн•ң н–үлҸҷм—җ лҶҖлһҗлӢӨ. н”„лһҖм№ҳмҠӨмҪ”нҡҢ лҸҷл°© кҙҖкө¬лҠ” нӮӨн”„лЎңмҠӨ, мӢңлҰ¬м•„, л Ҳл°”л…ј, к·ёлҰ¬кі кұ°лЈ©н•ң л•…к№Ңм§Җ нҷ•мһҘлҗҳм—ҲлӢӨ. м•„нҒ¬л Ҳ н•ЁлқҪ(1291л…„ 5мӣ” 18мқј) мқҙм „м—җ, н”„лһҖм№ҳмҠӨмҪ”нҡҢ мҲҳлҸ„мӣҗмқҖ м•„нҒ¬л Ҳ, мӢңлҸҲ, м•ҲнӢ°мҳӨнӮӨм•„, нҠёлҰ¬нҸҙлҰ¬, м•јнҢҢ, к·ёлҰ¬кі мҳҲлЈЁмӮҙл ҳм—җ мһҲм—ҲлӢӨ. нӮӨн”„лЎңмҠӨм—җм„ң лқјнӢҙ мҳҲлЈЁмӮҙл ҳ мҷ•көӯ л§җкё°м—җ н”јлӮңмІҳлҘј м°ҫм•ҳлҚҳ н”„лһҖм№ҳмҠӨмҪ”нҡҢлҠ” кё°лҸ…көҗ м •л¶ҖмҷҖ мқҙ집нҠё л§ҳлЈЁнҒ¬ мҲ нғ„көӯ к°„мқҳ мўӢмқҖ м •м№ҳм Ғ кҙҖкі„лҘј кі л Өн•ҳм—¬ мҳҲлЈЁмӮҙл ҳмңјлЎңмқҳ ліөк·ҖлҘј кі„нҡҚн•ҳкё° мӢңмһ‘н–ҲлӢӨ. 1333л…„кІҪ н”„лһ‘мҠӨ мҲҳмӮ¬ лЎңм ң кІҢлһӯмқҖ мӢңмҳЁмӮ°м—җ мһҲлҠ” мөңнӣ„мқҳ л§Ңм°¬мӢӨ(мөңнӣ„мқҳ л§Ңм°¬мқҙ м—ҙлҰ° л°©)[59]кіј к·ё к·јмІҳм—җ мҲҳмӮ¬л“Өмқ„ мң„н•ң мҲҳлҸ„мӣҗмқ„ кұҙм„Өн• нҶ м§ҖлҘј лӮҳнҸҙлҰ¬ мҷ•кіј мҷ•л№„к°Җ м ңкіөн•ң мһҗкёҲмңјлЎң кө¬мһ…н•ҳлҠ” лҚ° м„ұкіөн–ҲлӢӨ. 아비лҮҪ, 1342л…„ 11мӣ” 21мқјмһҗ л‘җ көҗнҷ© м№ҷм„ңмқё 'к·ёлқјнӢ°м•„мҠӨ м•„кё°л¬ҙмҠӨ'мҷҖ 'лҲ„нҺҳлҘҙ м№ҙлҰ¬мӢңл§Ҳм—җ'лҘј нҶөн•ҙ көҗнҷ© нҒҙл Ҳл©ҳмҠӨ 6м„ёлҠ” кұ°лЈ©н•ң л•…мқҳ н”„лһҖм№ҳмҠӨмҪ”нҡҢ кө¬мҶҚ(Custodia Terrae Sanctae)мңјлЎң м•Ңл Өм§ҖкІҢ лҗ мғҲлЎңмҡҙ лӢЁмІҙлҘј мҠ№мқён•ҳкі м°Ҫм„Өн–ҲлӢӨ.[60][лҚ” лӮҳмқҖ м¶ңмІҳ н•„мҡ”] м–ҙл–Ө көҗкө¬ м¶ңмӢ мқҙл“ мӢңмҳЁмӮ° мҲҳлҸ„мӣҗмқҳ мҲҳнҳёмһҗ(мғҒкёүмһҗ)мқҳ кҙҖн• н•ҳм—җ мһҲлҠ” мҲҳмӮ¬л“ӨмқҖ мҳҲлЈЁмӮҙл ҳ, мөңнӣ„мқҳ л§Ңм°¬мӢӨ, м„ұл¬ҳкөҗнҡҢ, к·ёлҰ¬кі лІ л“Өл Ҳн—ҙ нғ„мғқ лҢҖм„ұлӢ№м—җ мһҲм—ҲлӢӨ. к·ёл“Өмқҳ мЈјмҡ” нҷңлҸҷмқҖ мқҙлҹ¬н•ң кё°лҸ…көҗ м„ұм§Җм—җм„ң м „лЎҖ мғқнҷңмқ„ ліҙмһҘн•ҳкі м„ңмң лҹҪм—җм„ң мҳӨлҠ” мҲңлЎҖмһҗл“Өкіј мқҙ집нҠё, мӢңлҰ¬м•„, л Ҳл°”л…јмқҳ мЈјмҡ” лҸ„мӢңм—җ кұ°мЈјн•ҳкұ°лӮҳ нҶөкіјн•ҳлҠ” мң лҹҪ мғҒмқёл“Өм—җкІҢ мҳҒм Ғ м§Җмӣҗмқ„ м ңкіөн•ҳл©°, лҸҷл°© кё°лҸ…көҗ кіөлҸҷмІҙмҷҖ м§Ғм ‘м Ғмқҙкі к¶Ңмң„ мһҲлҠ” кҙҖкі„лҘј мң м§Җн•ҳлҠ” кІғмқҙм—ҲлӢӨ. мӢңмҳЁмӮ° мҲҳлҸ„мӣҗмқҖ лёҢлқјлҚ” м•ҢлІ лҘҙнҶ лӢӨ мӮ¬лҘҙн…Ңм•„л…ёк°Җ н”јл ҢмІҙ кіөмқҳнҡҢ (1440) лҸҷм•Ҳ к·ёлҰ¬мҠӨмқё, мҪҘнҠёмқё, м—җнӢ°мҳӨн”јм•„мқё л“ұ лҸҷл°© кё°лҸ…көҗмқёл“Өмқҳ лЎңл§ҲмҷҖмқҳ м—°н•©мқ„ мң„н•ң көҗнҷ© мһ„л¬ҙлҘј мҲҳн–үн•ҳлҠ” лҚ° мӮ¬мҡ©лҗҳм—ҲлӢӨ. к°ҷмқҖ мқҙмң лЎң лёҢлқјлҚ” мЎ°л°ҳлӢҲ л”” м№јлқјлёҢлҰ¬м•„к°Җ мқҙлҒ„лҠ” мқјн–үмқҖ м—җнӢ°мҳӨн”јм•„мқҳ кё°лҸ…көҗ л„Өкө¬мҠӨлҘј л§ҢлӮҳлҹ¬ к°ҖлҠ” кёём—җ мҳҲлЈЁмӮҙл ҳм—җ л“Өл ҖлӢӨ (1482). 1482л…„м—җ л°©л¬ён•ң лҸ„лҜёлӢҲмҪ”нҡҢ мӮ¬м ң нҺ лҰӯмҠӨ нҢҢлёҢлҰ¬лҠ”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"м„ёкі„ м—¬лҹ¬ лӮҳлқј мӮ¬лһҢл“Өмқҳ кұ°мЈјм§Җмқҙл©°, л§Ҳм№ҳ мҳЁк°– мў…лҘҳмқҳ нҳҗмҳӨмҠӨлҹ¬мҡҙ кІғл“Өмқҙ лӘЁмқё кіі"мқҙлқјкі л¬ҳмӮ¬н–ҲлӢӨ. "нҳҗмҳӨмҠӨлҹ¬мҡҙ кІғл“Ө"лЎң к·ёлҠ” мӮ¬лқјм„ј, к·ёлҰ¬мҠӨмқё, мӢңлҰ¬м•„мқё, м•јмҪ”비н…Ң, м—җнӢ°мҳӨн”јм•„мқё, л„ӨмҠӨнҶ лҰ¬мҡ°мҠӨнҢҢ, м•„лҘҙл©”лӢҲм•„мқё, к·ёл Ҳкі лҰ¬м•Ҳ, л§ҲлЎ нҢҢ, нҲ¬лҘҙнҒ¬л©ҳ, лІ л‘җмқё, м–ҙмҢ”мӢ , м•„л§ҲлҸ„ л“ңлЈЁмҰҲ мў…нҢҢ, л§ҳлЈЁнҒ¬, к·ёлҰ¬кі к·ёк°Җ "к°ҖмһҘ м ҖмЈјл°ӣмқҖ мһҗл“Ө"мқҙлқјкі м–ёкёүн•ң мң лҢҖмқёл“Өмқ„ лӮҳм—ҙн–ҲлӢӨ. к·ёлҹ¬лӮҳ 1491-1492л…„м—җ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л°©л¬ён–ҲлҚҳ ліҙн—ӨлҜём•„ м¶ңмӢ мқҳ кё°лҸ…көҗ мҲңлЎҖмһҗлҠ” к·ёмқҳ мұ… 'мҳҲлЈЁмӮҙл ҳ м—¬н–ү'м—җм„ң лӢӨмқҢкіј к°ҷмқҙ мҚјлӢӨ: "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кё°лҸ…көҗмқёл“Өкіј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Җ лӘЁл‘җ к·№мӢ¬н•ң л№ҲкіӨкіј нҒ° к¶Ғн•Қ мҶҚм—җм„ң мӮҙм•ҳмңјл©°, кё°лҸ…көҗмқёмқҖ л§Һм§Җ м•Ҡм§Җл§Ң мң лҢҖмқёмқҖ л§Һкі , л¬ҙмҠ¬лҰјл“ӨмқҖ мқҙл“Өмқ„ м—¬лҹ¬ к°Җм§Җ л°©мӢқмңјлЎң л°•н•ҙн•ңлӢӨ. кё°лҸ…көҗмқёкіј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Җ мҳҲлЈЁмӮҙл ҳм—җм„ң л°©лһ‘н•ҳлҠ” кұ°м§Җм—җкІҢлӮҳ м–ҙмҡёлҰ¬лҠ” мҳ·мқ„ мһ…кі лӢӨлӢҢлӢӨ. л¬ҙмҠ¬лҰјл“ӨмқҖ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ҙ мқҙкіімқҙ мһҗмӢ л“Өм—җкІҢ м•ҪмҶҚлҗң м„ұм§Җлқјкі мғқк°Ғн•ҳкі мӢ¬м§Җм–ҙ л§җн•ҳл©°, мқҙкіім—җ мӮ¬лҠ”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Җ лӢӨлҘё кіімқҳ мң лҢҖмқёл“Өм—җкІҢ кұ°лЈ©н•ҳкІҢ 여겨진лӢӨлҠ” кІғмқ„ м•Ңкі мһҲлӢӨ. мҷңлғҗн•ҳл©ҙ л¬ҙмҠ¬лҰјл“Өмқҙ к·ёл“Өм—җкІҢ к°Җн•ҳлҠ” лӘЁл“ кі лӮңкіј мҠ¬н””м—җлҸ„ л¶Ҳкө¬н•ҳкі к·ёл“ӨмқҖ мқҙ л•…мқ„ л– лӮҳкё°лҘј кұ°л¶Җн•ҳкё° л•Ңл¬ёмқҙлӢӨ."[61] мҳӨм§Ғ лқјнӢҙ кё°лҸ…көҗмқёл“Өл§Ңмқҙ "кё°лҸ…көҗ м ңнӣ„л“Өмқҙ мҷҖм„ң мҳЁ лӮҳлқјлҘј лЎңл§Ҳ көҗнҡҢмқҳ к¶Ңмң„ м•„лһҳ л‘җкё°лҘј мҳЁ л§ҲмқҢмңјлЎң к°„м ҲнһҲ л°”лһҗлӢӨ".[62] к·јм„ёмҙҲкё° мҳӨмҠӨл§Ң мӢңлҢҖ1516л…„,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мҳӨмҠӨл§Ң м ңкөӯм—җ мқҳн•ҙ лҢҖмӢңлҰ¬м•„мҷҖ н•Ёк»ҳ м җл №лҗҳм—Ҳкі , мүҙл Ҳмқҙл§Ң 1м„ё нҶөм№ҳ м•„лһҳ мһ¬кұҙкіј нҸүнҷ”мқҳ мӢңлҢҖлҘј лҲ„л ёмңјл©°, мқҙлҠ” мҳӨлҠҳлӮ мҳҲлЈЁмӮҙл ҳ кө¬мӢңк°ҖлҘј нҳ•м„ұн•ҳлҠ” м„ұлІҪ кұҙм„Өмқ„ нҸ¬н•Ён•ңлӢӨ. м„ұлІҪмқҳ мңӨкіҪмқҖ лҢҖмІҙлЎң лӢӨлҘё мҳӨлһҳлҗң мҡ”мғҲмқҳ мңӨкіҪмқ„ л”°лҘёлӢӨ. мүҙл Ҳмқҙл§Ңкіј к·ё мқҙнӣ„мқҳ мҳӨмҠӨл§Ң мҲ нғ„л“Өмқҳ нҶөм№ҳлҠ” "мў…көҗм Ғ нҸүнҷ”"мқҳ мӢңлҢҖлҘј к°Җм ёмҷ”лӢӨ. мң лҢҖмқё, кё°лҸ…көҗмқё, л¬ҙмҠ¬лҰјмқҖ мў…көҗмқҳ мһҗмң лҘј лҲ„л ёкі , к°ҷмқҖ кұ°лҰ¬м—җ нҡҢлӢ№, көҗнҡҢ, лӘЁмҠӨнҒ¬лҘј м°ҫмқ„ мҲҳ мһҲм—ҲлӢӨ. м ңкөӯмқҙ мүҙл Ҳмқҙл§Ң 1м„ё мқҙнӣ„ м ңлҢҖлЎң кҙҖлҰ¬лҗҳм§Җ м•Ҡм•„ кІҪм ңм Ғ м№ЁмІҙк°Җ мһҲм—ҲмқҢм—җлҸ„ л¶Ҳкө¬н•ҳкі лҸ„мӢңлҠ” лӘЁл“ мў…көҗм—җ к°ңл°©лҗҳм–ҙ мһҲм—ҲлӢӨ. лқјнӢҙкөҗмқҳ мЎҙмһ¬1551л…„ мҲҳмӮ¬л“ӨмқҖ нҠҖлҘҙнҒ¬мқёл“Өм—җ мқҳн•ҙ мөңнӣ„мқҳ л§Ңм°¬мӢӨкіј мқём ‘н•ң мҲҳлҸ„мӣҗм—җм„ң 추방лӢ№н–ҲлӢӨ.[63] к·ёлҹ¬лӮҳ к·ёл“ӨмқҖ лҸ„мӢң л¶Ғм„ңл¶Җ м§Җм—ӯм—җ мЎ°м§Җм•„мқё мҲҳл…Җ мҲҳлҸ„мӣҗмқ„ кө¬мһ…н• н—Ҳк°ҖлҘј л°ӣм•ҳкі , мқҙкіімқҖ 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мҲҳнҳё ліёл¶Җмқҳ мғҲлЎңмҡҙ мӨ‘мӢ¬м§Җк°Җ лҗҳм–ҙ лқјнӢҙ м„ұ мӮҙл°”лҸ„лҘҙ мҲҳлҸ„мӣҗ(м•„лһҚм–ҙлЎң Dayr al ДҖtД«n ШҜЩҠШұ Ш§Щ„Ш§ШӘЩҠЩҶ ШҜЩҠШұ Ш§Щ„Щ„Ш§ШӘЩҠЩҶлЎң м•Ңл Өм§җ)мңјлЎң л°ңм „н–ҲлӢӨ.[64])[65] мң лҢҖмқёмқҳ мЎҙмһ¬1700л…„, мң лӢӨ н—Өн•ҳмӢңл“ңлҠ” мҲҳ м„ёкё° л§Ңм—җ м—җл Ҳмё мқҙмҠӨлқјм—ҳлЎң н–Ҙн•ҳлҠ” к°ҖмһҘ нҒ° к·ңлӘЁмқҳ мЎ°м§Ғм Ғмқё мң лҢҖмқё мқҙлҜјмһҗ 집лӢЁмқ„ мқҙлҒҢм—ҲлӢӨ. к·ёмқҳ м ңмһҗл“ӨмқҖ нӣ„лҘҙл°” нҡҢлӢ№мқ„ м§Җм—ҲлҠ”лҚ°, мқҙ нҡҢлӢ№мқҖ 18м„ёкё°л¶Җн„° 1948л…„ м•„лһҚ кө°лӢЁм—җ мқҳн•ҙ нҢҢкҙҙлҗ л•Ңк№Ңм§Җ 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мЈјмҡ” нҡҢлӢ№ м—ӯн• мқ„ н–ҲлӢӨ.[Note 2] мқҙ нҡҢлӢ№мқҖ 2010л…„м—җ мһ¬кұҙлҗҳм—ҲлӢӨ. м§Җм—ӯ к¶Ңл Ҙ лҢҖ мӨ‘м•ҷ к¶Ңл ҘмҙқлҸ… л©”нқҗл©”л“ң нҢҢмғӨ мҝ лҘҙл“ң л°”мқҙлһҢмқҳ нҳ№лҸ…н•ң м„ёкёҲ м •мұ…кіј лҸ„мӢң нӣ„л°©м—җ лҢҖн•ң кө°мӮ¬ мһ‘м „м—җ лҢҖмқ‘н•ҳм—¬ 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мң л Ҙмһҗл“ӨмқҖ м§Җм—ӯ лҶҚлҜјкіј лІ л‘җмқёкіј лҸҷ맹мқ„ л§әкі лӮҳнӮӨлёҢ м•Ң-м•„мҠҲлқјн”„ л°ҳлһҖмңјлЎң м•Ңл Ө진 мҳӨмҠӨл§Ң м ңкөӯм—җ лҢҖн•ӯн•ҳм—¬ л°ҳлһҖмқ„ мқјмңјмјң 1703л…„л¶Җн„° 1705л…„к№Ңм§Җ лҸ„мӢңлҘј мһҘм•…н–Ҳмңјл©°, к·ё нӣ„ нҷ©м ңкө°мқҙ лӢӨмӢң мҳӨмҠӨл§Ң к¶Ңмң„лҘј нҷ•лҰҪн–ҲлӢӨ. мқҙ л°ҳлһҖмқ„ мқҙлҒҢм—ҲлҚҳ 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м•Ң-мҷҖнҢҢмқҙм•ј м•Ң-нӣ„мӮ¬мқҙлӢҲ к°Җл¬ёмқҙ к¶Ңл Ҙмқ„ мһғкІҢ лҗҳл©ҙм„ң, м•Ң-нӣ„мӮ¬мқҙлӢҲ к°Җл¬ёмқҙ мқҙ лҸ„мӢңмқҳ мЈјмҡ” к°Җл¬ё мӨ‘ н•ҳлӮҳк°Җ лҗҳлҠ” кёёмқ„ м—ҙм—ҲлӢӨ.[67][68] л°ҳлһҖ мқҙнӣ„ мҲҳмІң лӘ…мқҳ мҳӨмҠӨл§Ң кө°лҢҖк°Җ мҳҲлЈЁмӮҙл ҳм—җ мЈјл‘”н•ҳл©ҙм„ң м§Җм—ӯ кІҪм ңк°Җ мҮ нҮҙн–ҲлӢӨ.[69] к·јнҳ„лҢҖ мӢңлҢҖнӣ„кё° мҳӨмҠӨл§Ң мӢңлҢҖ 19м„ёкё° мӨ‘л°ҳ, мҳӨмҠӨл§Ң м ңкөӯмқҙ мҮ нҮҙн•ҳл©ҙм„ң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мқёкө¬к°Җ 8,000лӘ…мқ„ л„ҳм§Җ м•ҠлҠ” мҳӨм§ҖмҳҖлӢӨ.[70] к·ёлҹјм—җлҸ„ л¶Ҳкө¬н•ҳкі , мң лҢҖкөҗ, кё°лҸ…көҗ, мқҙмҠ¬лһҢкөҗм—җ лҢҖн•ң мӨ‘мҡ”м„ұ л•Ңл¬ём—җ лӢ№мӢңм—җлҸ„ л§Өмҡ° мқҙм§Ҳм Ғмқё лҸ„мӢңмҳҖлӢӨ. мқёкө¬лҠ” мң лҢҖмқё, кё°лҸ…көҗмқё, л¬ҙмҠ¬лҰј, м•„лҘҙл©”лӢҲм•„мқёмқҳ л„Ө к°Җм§Җ мЈјмҡ” кіөлҸҷмІҙлЎң лӮҳлүҳм—Ҳкі , мқҙ мӨ‘ мІҳмқҢ м„ё кіөлҸҷмІҙлҠ” м •нҷ•н•ң мў…көҗм Ғ мҶҢмҶҚмқҙлӮҳ м¶ңмӢ көӯк°Җм—җ л”°лқј мҲҳл§ҺмқҖ н•ҳмң„ 집лӢЁмңјлЎң лҚ” лӮҳлҲҢ мҲҳ мһҲм—ҲлӢӨ. м„ұл¬ҳкөҗнҡҢлҠ” лҸҷл°© м •көҗнҡҢ, к°ҖнҶЁлҰӯ, м•„лҘҙл©”лӢҲм•„ мӮ¬лҸ„көҗнҡҢ, мҪҘнҠё м •көҗнҡҢ, м—җнӢ°мҳӨн”јм•„ м •көҗнҡҢ мӮ¬мқҙм—җ м„ёмӢ¬н•ҳкІҢ л¶„н• лҗҳм—ҲлӢӨ. к·ёлЈ№ к°„мқҳ кёҙмһҘмқҙ л„Ҳл¬ҙ к№Ҡм–ҙм„ң м„ұм§ҖмҷҖ к·ё л¬ё м—ҙмҮ лҠ” н•ң мҢҚмқҳ 'мӨ‘лҰҪм Ғмқё' л¬ҙмҠ¬лҰј к°ҖмЎұмқҙ ліҙкҙҖн–ҲлӢӨ. 1854л…„ лүҙмҡ• лҚ°мқјлҰ¬ нҠёлҰ¬л·ҙм—җ кё°кі н•ң кё°мӮ¬м—җм„ң м№ҙлҘј л§ҲлҘҙнҒ¬мҠӨлҠ” 19м„ёкё° мӨ‘л°ҳ 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мқёкө¬ нҶөкі„мҷҖ мғқнҷң мЎ°кұҙм—җ лҢҖн•ҙ мғҒм„ён•ҳкі л№„нҶөн•ң м„ӨлӘ…мқ„ м ңкіөн–ҲлӢӨ. к·ёлҠ” лҸ„мӢңмқҳ лӢӨм–‘н•ң кіөлҸҷмІҙ, нҠ№нһҲ мң лҢҖмқё мқёкө¬к°Җ м§Ғл©ҙн•ң нҳ№лҸ…н•ң нҳ„мӢӨм—җ мҙҲм җмқ„ л§һм·„лӢӨ. л§ҲлҘҙнҒ¬мҠӨлҠ” лӢӨмқҢкіј к°ҷмқҙ мҚјлӢӨ.
лӢ№мӢң кіөлҸҷмІҙл“ӨмқҖ мЈјлЎң мЈјмҡ” м„ұм§Җ мЈјліҖм—җ мң„м№ҳн–ҲлӢӨ. л¬ҙмҠ¬лҰј кіөлҸҷмІҙлҠ” м„ұм „мӮ° мЈјліҖ(л¶ҒлҸҷмӘҪ)м—җ, кё°лҸ…көҗмқёл“ӨмқҖ мЈјлЎң м„ұл¬ҳкөҗнҡҢ мЈјліҖ(л¶Ғм„ңмӘҪ)м—җ,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Җ лҢҖл¶Җ분 нҶөкіЎмқҳ лІҪ мң„мӘҪ кІҪмӮ¬л©ҙ(лӮЁлҸҷмӘҪ)м—җ, м•„лҘҙл©”лӢҲм•„мқёл“ӨмқҖ мӢңмҳЁ л¬ё к·јмІҳ(лӮЁм„ңмӘҪ)м—җ мӮҙм•ҳлӢӨ. мқҙлҹ¬н•ң л¶„н• мқҙ л°°нғҖм Ғмқҙм§ҖлҠ” м•Ҡм•ҳм§Җл§Ң, мқҙлҠ” мҳҒкөӯ мң„мһ„нҶөм№ҳ кё°к°„(1917л…„-1948л…„) лҸҷм•Ҳ л„Ө кө¬м—ӯмқҳ кё°мҙҲлҘј нҳ•м„ұн–ҲлӢӨ. лҸ„мӢңмқҳ мһҘкё°м Ғмқё мҳҒн–Ҙл Ҙмқ„ к°Җ진 лӘҮ к°Җм§Җ ліҖнҷ”лҠ” 19м„ёкё° мӨ‘л°ҳм—җ л°ңмғқн–ҲлӢӨ. к·ё мҳҒн–ҘмқҖ мҳӨлҠҳлӮ м—җлҸ„ лҠҗк»ҙм§Җл©°, мҳҲлЈЁмӮҙл ҳм—җ лҢҖн•ң мқҙмҠӨлқјм—ҳ-нҢ”л ҲмҠӨнғҖмқё 분мҹҒмқҳ к·јмӣҗм—җ мһҲлӢӨ. мқҙ мӨ‘ мІ« лІҲм§ёлҠ” мӨ‘лҸҷкіј лҸҷмң лҹҪм—җм„ң мң лҢҖмқё мқҙлҜјмһҗл“Өмқҙ мЎ°кёҲм”© мң мһ…лҗң кІғмқҙм—ҲлӢӨ. мөңмҙҲмқҳ мқҙлҜјмһҗл“ӨмқҖ м •нҶөнҢҢ мң лҢҖкөҗмқёл“Өмқҙм—ҲлӢӨ. мқјл¶ҖлҠ” мҳҲлЈЁмӮҙл ҳм—җм„ң мЈҪмқҢмқ„ л§һмқҙн•ҳкі мҳ¬лҰ¬лёҢмӮ°м—җ 묻нһҲкё° мң„н•ҙ мҳЁ л…ёмқёл“Өмқҙм—Ҳкі , лӢӨлҘё мқјл¶ҖлҠ” к°ҖмЎұл“Өкіј н•Ёк»ҳ л©”мӢңм•„мқҳ лҸ„лһҳлҘј кё°лӢӨлҰ¬кё° мң„н•ҙ мҷ”мңјл©°, м§Җм—ӯ мқёкө¬м—җ мғҲлЎңмҡҙ нҷңл Ҙмқ„ л¶Ҳм–ҙл„Јм—ҲлӢӨ. лҸҷмӢңм—җ мң лҹҪ мӢқлҜј к°•лҢҖкөӯл“ӨмқҖ мҳӨмҠӨл§Ң м ңкөӯмқҳ мһ„л°•н•ң 붕кҙҙлҘј м•һл‘җкі мҳҒн–Ҙл Ҙмқ„ нҷ•мһҘн•ҳкё° мң„н•ҙ лҸ„мӢңм—җм„ң л°ңнҢҗмқ„ л§Ҳл Ён•ҳкё° мӢңмһ‘н–ҲлӢӨ. мқҙ мӢңкё°лҠ” лҳҗн•ң кё°лҸ…көҗ л¶ҖнқҘмқҳ мӢңлҢҖмҳҖмңјл©°, л§ҺмқҖ көҗнҡҢл“Өмқҙ л¬ҙмҠ¬лҰј, нҠ№нһҲ мң лҢҖмқёл“Ө мӮ¬мқҙм—җм„ң к°ңмў…мӢңнӮӨкё° мң„н•ҙ м„ көҗмӮ¬лҘј нҢҢкІ¬н–ҲлҠ”лҚ°, мқҙкІғмқҙ к·ёлҰ¬мҠӨлҸ„мқҳ мһ¬лҰјмқ„ м•һлӢ№кёё кІғмқҙлқјкі лҜҝм—ҲлӢӨ. л§Ҳм§Җл§үмңјлЎң, мң лҹҪ мӢқлҜјмЈјмқҳмҷҖ мў…көҗм Ғ м—ҙм •мқҳ кІ°н•©мқҖ м„ұкІҪ мҶҚмқҳ л•…л“Ө, нҠ№нһҲ мҳҲлЈЁмӮҙл ҳм—җ лҢҖн•ң мғҲлЎңмҡҙ кіјн•ҷм Ғ кҙҖмӢ¬мңјлЎң н‘ңнҳ„лҗҳм—ҲлӢӨ. кі кі н•ҷ л°Ҹ кё°нғҖ нғҗн—ҳмқҖ лӘҮ к°Җм§Җ лҶҖлқјмҡҙ л°ңкІ¬мқ„ н–Ҳкі , мқҙлҠ” мҳҲлЈЁмӮҙл ҳм—җ лҢҖн•ң кҙҖмӢ¬мқ„ лҚ”мҡұ мҰқнҸӯмӢңмј°лӢӨ. 1860л…„лҢҖм—җ, л©ҙм Ғмқҙ 1м ңкіұнӮ¬лЎңлҜён„°м—җ л¶Ҳкіјн•ң лҸ„мӢңлҠ” мқҙлҜё кіјл°Җ мғҒнғңмҳҖлӢӨ. к·ёлҰ¬н•ҳм—¬ лҸ„мӢң м„ұлІҪ л°– 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мқјл¶Җмқё мӢ мӢңк°Җм§Җ кұҙм„Өмқҙ мӢңмһ‘лҗҳм—ҲлӢӨ. мғҲлЎңмҡҙ м§Җм—ӯмқ„ нҷ•ліҙн•ҳкё° мң„н•ҙ лҹ¬мӢңм•„ м •көҗнҡҢлҠ” м•јнҢҢ л¬ём—җм„ң мҲҳл°ұ лҜён„° л–Ём–ҙ진 кіім—җ нҳ„мһ¬ лҹ¬мӢңм•„ кіөлҸҷмІҙлЎң м•Ңл Ө진 ліөн•© лӢЁм§ҖлҘј кұҙм„Өн•ҳкё° мӢңмһ‘н–ҲлӢӨ. мҳҲлЈЁмӮҙл ҳ м„ұлІҪ л°– мЈјкұ° м •м°©мҙҢ кұҙм„Ө мӢңлҸ„лҠ”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ҙ нһҢлҶҲ кіЁм§ңкё°лҘј к°ҖлЎңм§Ҳлҹ¬ мӢңмҳЁ л¬ёмқҙ лӮҙл ӨлӢӨліҙмқҙлҠ” м–ёлҚ•м—җ мһ‘мқҖ лӢЁм§ҖлҘј кұҙм„Өн•ҳл©ҙм„ң мӢңмһ‘лҗҳм—ҲлӢӨ. лҜёмҠҲмјҖл…ёнҠё мғӨм•„лӮңмһ„мңјлЎң м•Ңл Ө진 мқҙ м •м°©мҙҢмқҖ кІ°көӯ лІҲм„ұн•ҳм—¬ кө¬мӢңк°Җм§Җ м„ңмӘҪкіј л¶ҒмӘҪм—җ лӢӨлҘё мғҲлЎңмҡҙ кіөлҸҷмІҙл“Өмқҙ мғқкІЁлӮҳлҠ” м„ лЎҖлҘј л§Ңл“Өм—ҲлӢӨ. мӢңк°„мқҙ м§ҖлӮҳл©ҙм„ң кіөлҸҷмІҙл“Өмқҙ м„ұмһҘн•ҳкі м§ҖлҰ¬м ҒмңјлЎң м—°кІ°лҗҳл©ҙм„ң мқҙкіімқҖ мӢ мӢңк°Җм§ҖлЎң м•Ңл Өм§ҖкІҢ лҗҳм—ҲлӢӨ. 1882л…„м—җ м•Ҫ 150 к°Җкө¬мқҳ мң лҢҖмқё к°ҖмЎұмқҙ мҳҲл©ҳм—җм„ң мҳҲлЈЁмӮҙл ҳмңјлЎң мқҙмЈјн–ҲлӢӨ. мІҳмқҢм—җлҠ” 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мң лҢҖмқёл“Өм—җкІҢ л°ӣм•„л“Өм—¬м§Җм§Җ м•Ҡм•ҳкі , к·ёл“Өмқ„ к°Җл“ң м§ҖнҢҢлқјкі л¶ҖлҘҙлҠ” мҠӨмӣЁлҚҙ-лҜёкөӯ мӢқлҜјм§Җмқҳ кё°лҸ…көҗмқёл“Өмқҳ лҸ„мӣҖмңјлЎң к¶Ғн•Қн•ң нҷҳкІҪм—җм„ң мӮҙм•ҳлӢӨ.[71] 1884л…„м—җ мҳҲл©ҳмқёл“ӨмқҖ мӢӨлЎңм•”мңјлЎң мқҙмЈјн–ҲлӢӨ. мҳҒкөӯ мң„мһ„нҶөм№ҳ кё°к°„ мҳҒкөӯмқҖ м ң1м°Ё м„ёкі„ лҢҖм „ мӨ‘ мӨ‘лҸҷм—җм„ң мҳӨмҠӨл§Ң м ңкөӯм—җ мҠ№лҰ¬н–Ҳкі , мӢңлӮҳмқҙ-нҢ”л ҲмҠӨнғҖмқё м „м—ӯм—җм„ң мҠ№лҰ¬н•ҳл©ҙм„ң м ңкөӯмқ„ н•ҙмІҙн•ҳлҠ” н•ң кұёмқҢмқ„ лӮҙл””лҺ лӢӨ. мқҙ집нҠё мӣҗм •кө°мқҳ мҙқмӮ¬л №кҙҖмқё м—җл“ңлЁјл“ң м•Ёлҹ°л№„ кІҪмқҖ м„ұмҠӨлҹ¬мҡҙ лҸ„мӢңм—җ лҢҖн•ң мЎҙкІҪмқҳ н‘ңмӢңлЎң 1917л…„ 12мӣ” 11мқј кұём–ҙм„ң мҳҲлЈЁмӮҙл ҳм—җ мһ…м„ұн–ҲлӢӨ.[72] м•Ёлҹ°л№„ мһҘкө°мқҙ 1917л…„ мҳӨмҠӨл§Ң м ңкөӯмңјлЎңл¶Җн„°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м җл №н–Ҳмқ„ л¬ҙл ө, мӢ мӢңк°Җм§ҖлҠ” к°Ғкё° лӢӨлҘё лҜјмЎұм Ғ нҠ№м§•мқ„ м§ҖлӢҢ лҸҷл„ӨмҷҖ кіөлҸҷмІҙл“ӨлЎң мқҙлЈЁм–ҙ진 лҲ„лҚ”кё°мІҳлҹј лҗҳм–ҙ мһҲм—ҲлӢӨ. мқҙлҠ” мҳҒкөӯ нҶөм№ҳ н•ҳм—җм„ңлҸ„ кі„мҶҚлҗҳм—ҲлҠ”лҚ°, мҳҲлЈЁмӮҙл ҳ мӢ мӢңк°Җм§Җк°Җ кө¬мӢңк°Җм§Җ м„ұлІҪ л°–мңјлЎң нҷ•мһҘлҗҳм—Ҳкі , мҳҲлЈЁмӮҙл ҳ кө¬мӢңк°Җм§ҖлҠ” м җм°Ё л№ҲкіӨн•ң кө¬мӢңк°Җм§Җ м •лҸ„лЎң м „лқҪн–ҲлӢӨ. лҸ„мӢңмқҳ мҙҲлҢҖ мҳҒкөӯ кө°м •мһҘкҙҖмқё лЎңл„җл“ң мҠӨнҶ м–ҙмҠӨ кІҪмқҖ лҸ„мӢңмқҳ мғҲлЎңмҡҙ кұҙл¬јл“Өмқҙ мӮ¬м•”мңјлЎң мҷёмһҘлҗҳм–ҙм•ј н•ңлӢӨкі мҡ”кө¬н•ҳлҠ” лҸ„мӢң кі„нҡҚ лӘ…л №мқ„ лӮҙл ёкі , мқҙлЎңмҚЁ лҸ„мӢңк°Җ нҷ•мһҘлҗҳлҠ” лҸҷм•Ҳм—җлҸ„ м „мІҙм Ғмқё лӘЁмҠөмқ„ м–ҙлҠҗ м •лҸ„ ліҙмЎҙн• мҲҳ мһҲм—ҲлӢӨ.[73] мҳҲлЈЁмӮҙл ҳ м№ңм„ нҳ‘нҡҢлҠ” мҳҒкөӯ нҶөм№ҳ лҸ„мӢңмқҳ м „л§қм—җ мӨ‘мҡ”н•ң м—ӯн• мқ„ н–ҲлӢӨ.[74] мҳҒкөӯмқҖ мҳӨмҠӨл§Ң нҶөм№ҳм—җ лҝҢлҰ¬лҘј л‘” мғҒ충лҗҳлҠ” мҡ”кө¬м—җ лҢҖмІҳн•ҙм•ј н–ҲлӢӨ. мғҒмҲҳлҸ„, м „кё° кіөкёү л°Ҹ нҠёлһЁ мӢңмҠӨн…ң кұҙм„Өм—җ лҢҖн•ң нҳ‘м • вҖ“ лӘЁл‘җ мҳӨмҠӨл§Ң лӢ№көӯмқҙ л¶Җм—¬н•ң нҠ№н—Ҳм—җ л”°лқј вҖ“мқҖ мҳҲлЈЁмӮҙл ҳ мӢңмҷҖ к·ёлҰ¬мҠӨ мӢңлҜј мң лҰ¬н”јлҚ°мҠӨ л§ҲлёҢлЎңл§ҲнӢ°мҠӨк°Җ 1914л…„ 1мӣ” 27мқјм—җ м„ңлӘ…н–ҲлӢӨ. мқҙлҹ¬н•ң нҠ№н—Ҳм—җ л”°лҘё мһ‘м—…мқҖ мӢңмһ‘лҗҳм§Җ м•Ҡм•ҳкі , м „мҹҒмқҙ лҒқлӮ л¬ҙл ө мҳҒкөӯ м җл №кө°мқҖ к·ё мң нҡЁм„ұмқ„ мқём •н•ҳкё°лҘј кұ°л¶Җн–ҲлӢӨ. л§ҲлёҢлЎңл§ҲнӢ°мҠӨлҠ” мһҗмӢ мқҳ нҠ№н—Ҳк°Җ м •л¶Җк°Җ 1921л…„м—җ лЈЁн…җлІ лҘҙнҒ¬м—җкІҢ л¶Җм—¬н•ң м•„мҡ°мһҗ нҠ№н—ҲмҷҖ мӨ‘ліөлҗҳл©°, мһҗмӢ мқҙ н•©лІ•м Ғмқё к¶ҢлҰ¬лҘј л°•нғҲлӢ№н–ҲлӢӨкі мЈјмһҘн–ҲлӢӨ. мҳҒкөӯмқҙ мқҙм „м—җ нҸҗм§Җн•ҳл Ө мӢңлҸ„н–ҲмқҢм—җлҸ„ л¶Ҳкө¬н•ҳкі мң нҡЁн–ҲлҚҳ л§ҲлёҢлЎңл§ҲнӢ°мҠӨ нҠ№н—ҲлҠ” м„ұл¬ҳкөҗнҡҢ мЈјліҖ л°ҳкІҪ 20 km (12 mi) лӮҙмқҳ мҳҲлЈЁмӮҙл ҳкіј лӢӨлҘё м§Җм—ӯ(мҳҲ: лІ л“Өл Ҳн—ҙ)мқ„ нҸ¬н•Ён–ҲлӢӨ.[75] 1922л…„, көӯм ң연맹мқҖ лЎңмһ” нҡҢмқҳм—җм„ң мҳҒкөӯм—җкІҢ нҢ”л ҲмҠӨнғҖмқё мң„мһ„нҶөм№ҳл №, мқём ‘н•ң нҠёлһҖмҠӨмҡ”лҘҙлӢЁ нҶ нӣ„көӯ, к·ёлҰ¬кі к·ё л„ҲлЁёмқҳ л©”мҶҢнҸ¬нғҖлҜём•„ мң„мһ„нҶөм№ҳл №мқ„ кҙҖлҰ¬н•ҳлҸ„лЎқ мң„мһ„н–ҲлӢӨ. 1922л…„л¶Җн„° 1948л…„к№Ңм§Җ лҸ„мӢңмқҳ мҙқ мқёкө¬лҠ” 52,000лӘ…м—җм„ң 165,000лӘ…мңјлЎң мҰқк°Җн–Ҳмңјл©°, мқҙ мӨ‘ 3분мқҳ 2лҠ” мң лҢҖмқё, 3분мқҳ 1мқҖ м•„лһҚмқё(л¬ҙмҠ¬лҰјкіј кё°лҸ…көҗмқё)мқҙм—ҲлӢӨ.[76] м•„лһҚ кё°лҸ…көҗмқё л°Ҹ л¬ҙмҠ¬лҰјкіј мҰқк°Җн•ҳлҠ” мҳҲлЈЁмӮҙл ҳ мң лҢҖмқё мқёкө¬ к°„мқҳ кҙҖкі„лҠ” м•…нҷ”лҗҳм–ҙ л°ҳліөм Ғмқё л¶Ҳм•Ҳмқ„ м•јкё°н–ҲлӢӨ. нҠ№нһҲ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1920л…„ л„Ө비 л¬ҙмӮ¬ нҸӯлҸҷкіј 1929л…„ нҢ”л ҲмҠӨнғҖмқё нҸӯлҸҷмқҳ мҳҒн–Ҙмқ„ л°ӣм•ҳлӢӨ. мҳҒкөӯ нҶөм№ҳ н•ҳм—җ лҸ„мӢңмқҳ м„ңл¶ҖмҷҖ л¶Ғл¶Җм—җ мғҲлЎңмҡҙ м •мӣҗ көҗмҷёк°Җ кұҙм„Өлҗҳм—Ҳкі ,[77][78] мҳҲлЈЁмӮҙл ҳ нһҲлёҢлҰ¬ лҢҖн•ҷкөҗмҷҖ к°ҷмқҖ кі л“ұ көҗмңЎ кё°кҙҖмқҙ м„ӨлҰҪлҗҳм—ҲлӢӨ.[79] н•ҳлӢ·мӮ¬ мқҳлЈҢ м„јн„°мҷҖ нһҲлёҢлҰ¬ лҢҖн•ҷкөҗлқјлҠ” л‘җ к°Җм§Җ мӨ‘мҡ”н•ң мғҲлЎңмҡҙ кё°кҙҖмқҙ 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мҠӨмҪ”н‘ёмҠӨмӮ°м—җ м„ӨлҰҪлҗҳм—ҲлӢӨ. нҸӯл Ҙ мҲҳмӨҖмқҖ 1930л…„лҢҖмҷҖ 1940л…„лҢҖ лӮҙлӮҙ кі„мҶҚн•ҙм„ң мҰқк°Җн–ҲлӢӨ. 1946л…„ 7мӣ”, м§Җн•ҳ мӢңмҳЁмЈјмқҳ лӢЁмІҙмқё мқҙлҘҙкө°мқҳ нҡҢмӣҗл“Өмқҙ мҳҒкөӯкө°мқҙ мһ„мӢңлЎң мЈјл‘”н•ҳкі мһҲлҚҳ лӢӨмң— мҷ• нҳён…”мқҳ мқјл¶ҖлҘј нҸӯнҢҢн•ҳм—¬ 91лӘ…мқҳ лҜјк°„мқё мӮ¬л§қмңјлЎң мқҙм–ҙмЎҢлӢӨ. 1947л…„ 11мӣ” 29мқј, мң м—” мҙқнҡҢлҠ” 1947л…„ мң м—” нҢ”л ҲмҠӨнғҖмқё л¶„н• м•Ҳмқ„ мҠ№мқён•ҳм—¬ нҢ”л ҲмҠӨнғҖмқё мң„мһ„нҶөм№ҳл №мқ„ мң лҢҖ көӯк°ҖмҷҖ м•„лһҚ көӯк°Җ л‘җ к°ңлЎң л¶„н• н•ҳлҸ„лЎқ н–ҲлӢӨ. к°Ғ көӯк°ҖлҠ” м№ҳмҷёлІ•к¶Ңм Ғ көҗм°ЁлЎңлЎң м—°кІ°лҗң м„ё к°ңмқҳ мЈјмҡ” кө¬м—ӯкіј м•јнҢҢмқҳ м•„лһҚ 비мҳҒнҶ м§Җм—ӯмңјлЎң кө¬м„ұлҗ мҳҲм •мқҙм—ҲлӢӨ. нҷ•мһҘлҗң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көӯм ң кҙҖлҰ¬ н•ҳм—җ лҶ“мқј мҳҲм •мқҙм—ҲлӢӨ.
мқҙмҠӨлқјм—ҳкіј мҡ”лҘҙлӢЁ к°„мқҳ м „мҹҒкіј л¶„н• (1948л…„вҖ“1967л…„)1948л…„ м „мҹҒ л¶„н• мқҙнӣ„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мң„н•ң мӢёмӣҖмқҖ кІ©нҷ”лҗҳм—Ҳкі , мҳҒкөӯ, мң лҢҖмқё, м•„лһҚмқё мёЎ лӘЁл‘җм—җм„ң м „нҲ¬мӣҗкіј лҜјк°„мқё лӘЁл‘җм—җкІҢ нҒ° мӮ¬мғҒмһҗк°Җ л°ңмғқн–ҲлӢӨ. 1948л…„ 3мӣ” л§җ, мҳҒкөӯкө° мІ мҲҳ м§Ғм „, к·ёлҰ¬кі мҳҒкөӯкө°мқҙ к°ңмһ…мқ„ м җм җ лҚ” кәјл Өн•ҳл©ҙм„ң, мҳҲлЈЁмӮҙл ҳмңјлЎң к°ҖлҠ” лҸ„лЎңлҠ” м•„лһҚ л¶Ҳк·ңм№ҷ лі‘л Ҙм—җ мқҳн•ҙ м°ЁлӢЁлҗҳм–ҙ лҸ„мӢңмқҳ мң лҢҖмқё мқёкө¬к°Җ нҸ¬мң„лҗҳм—ҲлӢӨ. нҸ¬мң„лҠ” кІ°көӯ н’Җл ём§Җл§Ң, 1948л…„ 5мӣ” мҳҒкөӯ мң„мһ„нҶөм№ҳл №мқҙ лҒқлӮҳкі 1948л…„ м•„лһҚ-мқҙмҠӨлқјм—ҳ м „мҹҒмқҙ мӢңмһ‘лҗҳкё° м „м—җ м–‘мёЎ лӘЁл‘җм—җм„ң лҜјк°„мқё н•ҷмӮҙмқҙ л°ңмғқн–ҲлӢӨ. 1948л…„ м•„лһҚ-мқҙмҠӨлқјм—ҳ м „мҹҒмқҖ м•„лһҚмқёкіј мң лҢҖмқё мқёкө¬мқҳ лҢҖк·ңлӘЁ мқҙмЈјлҘј мҙҲлһҳн–ҲлӢӨ. лІ лӢҲ лӘЁлҰ¬мҠӨм—җ л”°лҘҙл©ҙ, м–‘мёЎмқҳ нҸӯлҸ„мҷҖ лҜјлі‘лҢҖ нҸӯл ҘмңјлЎң мқён•ҙ кө¬мӢңк°Җм§Җм—җ кұ°мЈјн•ҳлҚҳ 3,500лӘ…мқҳ мң лҢҖмқё(лҢҖл¶Җ분 мҙҲм •нҶөнҢҢ мң лҢҖмқё) мӨ‘ 1,500лӘ…мқҙ м„ңмҳҲлЈЁмӮҙл ҳмңјлЎң лҢҖн”јн–ҲлӢӨ.[80] мң лҢҖмқё кө¬м—ӯлҸ„ м°ёмЎ°. 비көҗм Ғ мқёкө¬к°Җ л§Һм•ҳлҚҳ м•„лһҚ л§Ҳмқ„ лҰ¬н”„нғҖ (мҳӨлҠҳлӮ мҳҲлЈЁмӮҙл ҳ кІҪкі„ лӮҙ)лҠ” 1948л…„ мқҙмҠӨлқјм—ҳ кө°лҢҖм—җ мқҳн•ҙ м җл №лҗҳм—Ҳкі , мЈјлҜјл“ӨмқҖ нҠёлҹӯм—җ мӢӨл Ө лҸҷмҳҲлЈЁмӮҙл ҳмңјлЎң мқҙмҶЎлҗҳм—ҲлӢӨ.[80][81][82] лҚ°мқҙлҘҙ м•јмӢ , м•„мқё м№ҙл ҳ, л§җм°Ё л§Ҳмқ„кіј мҳҲлЈЁмӮҙл ҳ кө¬мӢңк°Җм§Җ м„ңмӘҪм—җ мң„м№ҳн•ң нғҲ비야, м№ҙнғҖлӘ¬, л°”м№ҙ, л§ҳл°Җлқј, м•„л¶Җ нҶ лҘҙмҷҖ к°ҷмқҖ лҸҷл„ӨлҸ„ мқҙмҠӨлқјм—ҳмқҳ нҶөм ң н•ҳм—җ лҶ“мҳҖкі , мЈјлҜјл“ӨмқҖ к°•м ңлЎң мқҙмЈјлӢ№н–ҲлӢӨ. мқҙмҠӨлқјм—ҳ м—ӯмӮ¬к°Җ лІ лӢҲ лӘЁлҰ¬мҠӨмҷҖ нҢ”л ҲмҠӨнғҖмқё м—ӯмӮ¬к°Җ мҷҲлҰ¬л“ң н• лҰ¬л”” л“ұм—җ мқҳн•ҙ кё°лЎқлҗң л°”мҷҖ к°ҷмқҙ, мқјл¶Җ кІҪмҡ° 추방과 н•ҷмӮҙмқҙ л°ңмғқн–ҲлӢӨ.[80][83] 1948л…„ 5мӣ”, лҜёкөӯ мҳҒмӮ¬ нҶ л§ҲмҠӨ C. мҷ“мҠЁмқҙ YMCA кұҙл¬ј л°–м—җм„ң м•”мӮҙлӢ№н–ҲлӢӨ. 4к°ңмӣ” нӣ„ мң м—” мӨ‘мһ¬мһҗ нҸҙмјҖ лІ лҘҙлӮҳлҸ„н…Ң л°ұмһ‘лҸ„ мҳҲлЈЁмӮҙл ҳ м№ҙнғҖлӘ¬ м§Җкө¬м—җм„ң мң лҢҖмқё мҠҲн„ҙ к·ёлЈ№м—җ мқҳн•ҙ мҙқкІ©мңјлЎң мӮ¬л§қн–ҲлӢӨ. мҡ”лҘҙлӢЁкіј мқҙмҠӨлқјм—ҳ к°„мқҳ л¶„н• (1948л…„вҖ“1967л…„) мң м—”мқҖ 1947л…„ нҢ”л ҲмҠӨнғҖмқё л¶„н• м•Ҳм—җм„ң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көӯм ң кҙҖлҰ¬ н•ҳмқҳ лҸ„мӢңлЎң м ңм•Ҳн–ҲлӢӨ. мқҙ лҸ„мӢңлҠ” м•„лһҚ көӯк°Җм—җ мҷ„м „нһҲ л‘ҳлҹ¬мӢём—¬ мһҲм—Ҳкі , көӯм ң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мң лҢҖ көӯк°ҖмҷҖ м—°кІ°н•ҳлҠ” кі мҶҚлҸ„лЎңл§Ңмқҙ мһҲм—ҲлӢӨ. 1948л…„ м•„лһҚ-мқҙмҠӨлқјм—ҳ м „мҹҒ мқҙнӣ„ 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л¶„н• лҗҳм—ҲлӢӨ. мӢ мӢңк°Җм§Җмқҳ м„ңмӘҪ м Ҳл°ҳмқҖ мғҲлЎң нҳ•м„ұлҗң мқҙмҠӨлқјм—ҳ көӯк°Җмқҳ мқјл¶Җк°Җ лҗҳм—Ҳкі , лҸҷмӘҪ м Ҳл°ҳмқҖ кө¬мӢңк°Җм§ҖмҷҖ н•Ёк»ҳ мҡ”лҘҙлӢЁм—җ м җл №лҗҳм—ҲлӢӨ. лҚ°мқҙ비л“ң кёҙм—җ л”°лҘҙл©ҙ,
м ңлҹҙл“ң M. мҠӨнғҖмқёлІ„к·ём—җ л”°лҘҙл©ҙ, мҡ”лҘҙлӢЁмқҖ мҳҲлЈЁмӮҙл ҳ кө¬мӢңк°Җм§Җм—җ мһҲлҠ” 57к°ңмқҳ кі лҢҖ нҡҢлӢ№, лҸ„м„ңкҙҖ, мў…көҗ м—°кө¬ м„јн„°лҘј м•ҪнғҲн–Ҳмңјл©°, к·ё мӨ‘ 12к°ңлҠ” мқҳлҸ„м ҒмңјлЎң мҷ„м „нһҲ нҢҢкҙҙлҗҳм—ҲлӢӨ. лӮЁм•„ мһҲлҠ” кұҙл¬јл“ӨмқҖ нӣјмҶҗлҗҳм–ҙ мӮ¬лһҢкіј лҸҷл¬јмқҳ кұ°мЈјм§ҖлЎң мӮ¬мҡ©лҗҳм—ҲлӢӨ. кө¬мӢңк°Җм§ҖлҘј 'к°ңл°© лҸ„мӢң'лЎң м„ м–ён•ҳкі мқҙлҹ¬н•ң нҢҢкҙҙлҘј л§үм•„лӢ¬лқјлҠ” нҳёмҶҢк°Җ мң м—”кіј көӯм ң мӮ¬нҡҢм—җ м ңкё°лҗҳм—Ҳм§Җл§Ң, м•„л¬ҙлҹ° мқ‘лӢөмқҙ м—Ҷм—ҲлӢӨ.[85] (нӣ„лҘҙл°” нҡҢлӢ№лҸ„ м°ёмЎ°) 1950л…„ 1мӣ” 23мқј, нҒ¬л„Өм„ёнҠёлҠ”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мқҙмҠӨлқјм—ҳмқҳ мҲҳлҸ„лЎң м„ нҸ¬н•ҳлҠ” кІ°мқҳм•Ҳмқ„ нҶөкіјмӢңмј°лӢӨ. мқҙмҠӨлқјм—ҳ кұҙкөӯ лҸҷмҳҲлЈЁмӮҙл ҳмқҖ 1967л…„ 6мӣ” 7мқј м ң3м°Ё мӨ‘лҸҷ м „мҹҒ мӨ‘м—җ мқҙмҠӨлқјм—ҳ л°©мң„кө°м—җкІҢ м җл №лҗҳм—ҲлӢӨ. 6мӣ” 11мқј мқҙмҠӨлқјм—ҳмқҖ 7м„ёкё° лҗң лӘЁлЎңмҪ”мқё кө¬м—ӯмқ„ мІ кұ°н–Ҳмңјл©°, к·ёмҷҖ н•Ёк»ҳ 2к°ңмқҳ лӘЁмҠӨнҒ¬лҘј нҸ¬н•Ён•ң 14к°ңмқҳ мў…көҗ кұҙл¬јкіј 650лӘ…мқҙ кұ°мЈјн•ҳлҚҳ 135мұ„мқҳ мЈјнғқмқ„ нҢҢкҙҙн–ҲлӢӨ.[86] мқҙнӣ„ нҶөкіЎмқҳ лІҪм—җ мқём ‘н•ң кіөкіө кҙ‘мһҘмқҙ к·ё мһҗлҰ¬м—җ кұҙм„Өлҗҳм—ҲлӢӨ. к·ёлҹ¬лӮҳ мҷҖнҒ¬н”„ (мқҙмҠ¬лһҢ мӢ нғҒ мһ¬мӮ°)лҠ” м„ұм „мӮ°мқҳ кҙҖлҰ¬лҘј л¶Җм—¬л°ӣм•ҳкі , мқҙнӣ„ м„ұм „мӮ°м—җм„ңмқҳ мң лҢҖмқё кё°лҸ„лҠ” мқҙмҠӨлқјм—ҳ лӢ№көӯкіј мҷҖнҒ¬н”„ лӢ№көӯ лӘЁл‘җм—җ мқҳн•ҙ кёҲм§Җлҗҳм—ҲлӢӨ. лҢҖл¶Җ분мқҳ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Җ мқҙ мӮ¬кұҙмқ„ лҸ„мӢңмқҳ н•ҙл°©мңјлЎң кё°л…җн–ҲлӢӨ. мғҲлЎңмҡҙ мқҙмҠӨлқјм—ҳ кіөнңҙмқјмқё 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лӮ мқҙ м ңм •лҗҳм—Ҳкі , к°ҖмһҘ мқёкё° мһҲлҠ” м„ёмҶҚ нһҲлёҢлҰ¬м–ҙ л…ёлһҳмқё "мҳҲлЈЁмӮҙл ҳ мҳӨлёҢ кіЁл“ң"лҠ” 축н•ҳ л…ёлһҳлЎң мқёкё°лҘј м–»м—ҲлӢӨ. мҳӨлҠҳлӮ мқҙмҠӨлқјм—ҳ көӯк°Җмқҳ л§ҺмқҖ лҢҖк·ңлӘЁ көӯк°Җ н–үмӮ¬л“Өмқҙ нҶөкіЎмқҳ лІҪм—җм„ң м—ҙлҰ¬лҠ”лҚ°, м—¬кё°м—җлҠ” лӢӨм–‘н•ң мқҙмҠӨлқјм—ҳкө° мһҘкөҗ л¶ҖлҢҖмқҳ м·Ёмһ„мӢқ, нҳ„충мқјм—җ м „мӮ¬н•ң мқҙмҠӨлқјм—ҳ кө°мқёл“Өмқ„ мң„н•ң 추лӘЁмӢқкіј к°ҷмқҖ көӯк°Җ н–үмӮ¬, мқҙмҠӨлқјм—ҳ лҸ…лҰҪкё°л…җмқјмқҳ лҢҖк·ңлӘЁ 축н•ҳ н–үмӮ¬, мң лҢҖкөҗ кіөнңҙмқјмқҳ мҲҳл§Ң лӘ…мқҳ лҢҖк·ңлӘЁ лӘЁмһ„, к·ёлҰ¬кі м •кё°м Ғмқё м°ём„қмһҗл“Өмқҳ л§Өмқј кё°лҸ„ л“ұмқҙ нҸ¬н•ЁлҗңлӢӨ. нҶөкіЎмқҳ лІҪмқҖ мЈјмҡ” кҙҖкҙ‘ лӘ…мҶҢк°Җ лҗҳм—ҲлӢӨ. мқҙмҠӨлқјм—ҳмқҳ нҶөм ң н•ҳм—җ, лӘЁл“ мў…көҗмқҳ кө¬м„ұмӣҗл“ӨмқҖ лҢҖмІҙлЎң к·ёл“Өмқҳ м„ұм§Җм—җ м ‘к·јн• мҲҳ мһҲлӢӨ. мЈјмҡ” мҳҲмҷёлҠ” мҡ”лҘҙлӢЁк°• м„ңм•Ҳ м§Җкө¬мҷҖ к°Җмһҗ м§Җкө¬мқҳ мқјл¶Җ м•„лһҚмқёл“Өмқҙ мҳҲлЈЁмӮҙл ҳм—җ м ‘к·јн• мҲҳ м—Ҷкё° л•Ңл¬ём—җ м„ұм§Җм—җ м ‘к·јн•ҳлҠ” лҚ° л¶ҖкіјлҗҳлҠ” ліҙм•Ҳ м ңн•ңлҝҗл§Ң м•„лӢҲлқј, м •м№ҳм Ғмқё лҸҷкё°(мһ‘мқҖ к·ёлЈ№мңјлЎң м„ұм „мӮ°мқ„ кұёмқ„ мҲҳлҠ” мһҲм§Җл§Ң, к·ёкіім—җм„ң кё°лҸ„н•ҳкұ°лӮҳ кіөл¶Җн•ҳлҠ” кІғмқҖ кёҲм§ҖлҗЁ)мҷҖ мў…көҗм Ғмқё лӘ…л №(м§Җм„ұмҶҢк°Җ мһҲлҚҳ кіімңјлЎң м¶”м •лҗҳлҠ” кіімқ„ мң лҢҖмқёмқҙ м№ЁлІ”н•ҳлҠ” кІғмқ„ кёҲм§Җн•Ё) л•Ңл¬ём—җ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ҙ м„ұм „мӮ°мқ„ л°©л¬ён•ҳлҠ” лҚ° м ңн•ңмқҙ мһҲлӢӨлҠ” м җмқҙлӢӨ. 1969л…„ м•Ңм•„нҒ¬мӮ¬ лӘЁмҠӨнҒ¬м—җ лҢҖн•ң мӢ¬к°Ғн•ң л°©нҷ” кіөкІ© (м •мӢ мқҙмғҒмһҗлЎң лІ•мӣҗм—җм„ң нҢҗлӘ…лҗң нҳёмЈј к·јліёмЈјмқҳ кё°лҸ…көҗмқё лҚ°лӢҲмҠӨ л§ҲмқҙнҒҙ лЎңн•ңм—җ мқҳн•ҙ мӢңмһ‘лҗЁ) мқҙнӣ„ лӘЁмҠӨнҒ¬м—җ лҢҖн•ң кіөкІ© к°ҖлҠҘм„ұм—җ лҢҖн•ң мҡ°л Өк°Җ м ңкё°лҗҳм—ҲлӢӨ. мқҙмҠӨлқјм—ҳ мҙқлҰ¬ лІ лғҗлҜј л„ӨнғҖлғҗнӣ„мқҳ м§ҖмӢңлЎң м•„лһҚ кө¬м—ӯм—җ мһҲлҠ” нҶөкіЎмқҳ лІҪ н„°л„җмқҳ м¶ңмһ…кө¬к°Җ к°ңл°©лҗң нӣ„ нҸӯлҸҷмқҙ л°ңмғқн–ҲлҠ”лҚ°, мқҙм „ мҙқлҰ¬ мӢңлӘ¬ нҺҳл ҲмҠӨлҠ” нҸүнҷ”лҘј мң„н•ҙ мқҙлҘј ліҙлҘҳн•ҳлҸ„лЎқ м§ҖмӢңн•ң л°” мһҲлӢӨ (к·ёлҠ” "мІң л…„ мқҙмғҒ кё°лӢӨл ёмңјлӢҲ, мўҖ лҚ” кё°лӢӨл ӨлҸ„ лҗңлӢӨ"кі л§җн–ҲлӢӨ). л°ҳлҢҖлЎң мқҙмҠӨлқјм—ҳкіј лӢӨлҘё мң лҢҖмқёл“ӨмқҖ мҷҖнҒ¬н”„к°Җ м„ұм „мӮ°м—җм„ң 진н–үн•ҳлҠ” л°ңкөҙ мһ‘м—…мқҙ м„ұм „ мң м Ғмқ„ нӣјмҶҗн• мҲҳ мһҲлӢӨлҠ” мҡ°л ӨлҘј н‘ңлӘ…н–Ҳмңјл©°, нҠ№нһҲ мҶ”лЎңлӘ¬мқҳ л§Ҳкөҝк°„ л¶ҒмӘҪм—җм„ң 진н–үлҗң л°ңкөҙ мһ‘м—…мқҖ мқҙмҠӨлқјм—ҳ лӢ№көӯмқҳ м••л ҘмңјлЎң 비мғҒ м¶ңкө¬лҘј л§Ңл“Өкё° мң„н•ң кІғмқҙм—ҲлӢӨ.[87] мқјл¶Җ мң лҢҖмқё мҶҢмӢқнҶөмқҖ мҷҖнҒ¬н”„мқҳ мҶ”лЎңлӘ¬ л§Ҳкөҝк°„ л°ңкөҙ мһ‘м—…мқҙ лӮЁмӘҪ лІҪлҸ„ мӢ¬к°Ғн•ҳкІҢ нӣјмҶҗн–ҲлӢӨкі мЈјмһҘн•ҳм§Җл§Ң, 2004л…„ лҸҷмӘҪ лІҪмқ„ мҶҗмғҒмӢңнӮЁ м§Җ진лҸ„ мӣҗмқёмқј мҲҳ мһҲлӢӨ. лҸҷ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м§Җмң„лҠ” л§Өмҡ° л…јмҹҒм Ғмқё л¬ём ңлЎң лӮЁм•„ мһҲлӢӨ. көӯм ңмӮ¬нҡҢлҠ” лҸ„мӢң лҸҷл¶Җмқҳ н•©лі‘мқ„ мқём •н•ҳм§Җ м•Ҡкі мһҲмңјл©°, лҢҖл¶Җ분мқҳ көӯк°Җл“ӨмқҖ 텔아비лёҢм—җ лҢҖмӮ¬кҙҖмқ„ мң м§Җн•ҳкі мһҲлӢӨ. 2018л…„ 5мӣ” лҜёкөӯкіј кіјн…Ңл§җлқјлҠ” лҢҖмӮ¬кҙҖмқ„ мҳҲлЈЁмӮҙл ҳмңјлЎң мҳ®кІјлӢӨ.[88] мң м—” м•Ҳм „ ліҙмһҘ мқҙмӮ¬нҡҢ кІ°мқҳ м ң478нҳёлҠ” нҒ¬л„Өм„ёнҠёмқҳ 1980л…„ "мҳҲлЈЁмӮҙл ҳлІ•"мқҙ 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мқҙмҠӨлқјм—ҳмқҳ "мҳҒмӣҗн•ҳкі л¶Ҳк°Җ분мқҳ" мҲҳлҸ„лЎң м„ м–ён•ң кІғмқҖ "л¬ҙнҡЁмқҙл©° мҰүмӢң мІ нҡҢлҗҳм–ҙм•ј н•ңлӢӨ"кі м„ м–ён–ҲлӢӨ. мқҙ кІ°мқҳм•ҲмқҖ нҡҢмӣҗкөӯл“Өм—җкІҢ 징лІҢм Ғ мЎ°м№ҳлЎң лҸ„мӢңм—җм„ң мҷёкөҗ лҢҖн‘ңл¶ҖлҘј мІ мҲҳн• кІғмқ„ к¶Ңкі н–ҲлӢӨ. мң м—” м•ҲліҙлҰ¬лҠ” лҳҗн•ң лҸҷ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нҸ¬н•Ён•ң 1967л…„м—җ м җл №лҗң мҳҒнҶ м—җм„ңмқҳ мқҙмҠӨлқјм—ҳ м •м°©мҙҢ кұҙм„Өмқ„ 비лӮңн–ҲлӢӨ (UNSCR 452нҳё, 465нҳё, 741нҳё м°ёмЎ°). мқҙмҠӨлқјм—ҳмқҙ 1967л…„ лҸҷмҳҲлЈЁмӮҙл ҳмқ„ мһҘм•…н•ң мқҙлһҳлЎң, мң лҢҖмқё м •м°©лҜј лӢЁмІҙл“ӨмқҖ мӢӨлЎңм•”кіј к°ҷмқҖ м§Җм—ӯм—җ мң лҢҖмқё мЈјкұ°м§ҖлҘј кұҙм„Өн•ҳл Өкі л…ёл Ҙн•ҙ мҷ”лӢӨ.[89][90] 1980л…„лҢҖм—җ н•ҳл Ҳмё лҠ” мЈјнғқл¶Җк°Җ "лӢ№мӢң м•„лҰ¬м—ҳ мғӨлЎ мқҳ м§Җнңҳ н•ҳм—җ кө¬мӢңк°Җм§ҖмҷҖ мқём ‘н•ң мӢӨлЎңм•” м§Җм—ӯмқҳ л¶ҖлҸҷмӮ°мқ„ л¶Җмһ¬мһҗ мһ¬мӮ°мңјлЎң м„ м–ён•ҳм—¬ нҶөм ңк¶Ңмқ„ нҷ•ліҙн•ҳкё° мң„н•ҙ л…ёл Ҙн–ҲлӢӨ. мқјл¶Җ кұ°лһҳк°Җ л¶ҲлІ•м ҒмқҙлқјлҠ” мқҳнҳ№мқҙ м ңкё°лҗҳм—Ҳкі , мЎ°мӮ¬ мң„мӣҗнҡҢлҠ” мҲҳл§ҺмқҖ кІ°н•Ёмқ„ л°ңкІ¬н–ҲлӢӨ." нҠ№нһҲ, мң лҢҖмқё лӢЁмІҙл“Өмқҙ м ңкё°н•ң, н•ҙлӢ№ м§Җм—ӯмқҳ м•„лһҚ мЈјнғқмқҙ л¶Җмһ¬мһҗ мһ¬мӮ°мқҙлқјлҠ” 진мҲ м„ңлҠ” кҙҖмһ¬мқём—җ мқҳн•ҙ нҳ„мһҘ л°©л¬ёмқҙлӮҳ лӢӨлҘё нӣ„мҶҚ мЎ°м№ҳ м—Ҷмқҙ л°ӣм•„л“Өм—¬мЎҢлӢӨ.[91] н•ҳл Ҳмё к°Җ лҸҷмҳҲлЈЁмӮҙл ҳмқҳ "мң лҢҖнҷ”"лҘј мҙү진н•ңлӢӨкі л§җн•ҳлҠ” м •м°©мҙҢ мЎ°м§Ғмқё м—ҳм•„л“ңмҷҖ м•„н…Ңл ҲнҠё мҪ”н•ҳлӢҳ мЎ°м§ҒмқҖ мӢӨлЎңм•„мқҳ мҳҲл©ҳ л§Ҳмқ„ мһ¬кұҙ мң„мӣҗнҡҢмҷҖ нҳ‘л Ҙн•ҳм—¬ мӢӨлЎңм•”м—җ мң лҢҖмқё м •м°©мҙҢмқ„ лҠҳлҰ¬кё° мң„н•ҙ л…ёл Ҙн•ҳкі мһҲлӢӨ.[92][93][94][95][96][97] мң лҢҖмқё кө¬м—ӯ (мҳҲлЈЁмӮҙл ҳ) м°ёмЎ°. м—ӯмӮ¬ м„ңмҲлҸ„мӢңк°Җ мқҙмҠӨлқјм—ҳ лӮҙм…”л„җлҰ¬мҰҳкіј нҢ”л ҲмҠӨнғҖмқё лӮҙм…”л„җлҰ¬мҰҳм—җм„ң м°Ём§Җн•ҳлҠ” мӨ‘мӢ¬м Ғмқё мң„м№ҳлҘј кі л Өн• л•Ң, 5,000л…„мқҳ кұ°мЈј м—ӯмӮ¬лҘј мҡ”м•Ҫн•ҳлҠ” лҚ° н•„мҡ”н•ң м„ нғқм„ұмқҖ мў…мў… мқҙл…җм Ғ нҺён–ҘмқҙлӮҳ л°°кІҪмқҳ мҳҒн–Ҙмқ„ л°ӣлҠ”лӢӨ.[98] мҳҲлҘј л“Өм–ҙ, лҸ„мӢң м—ӯмӮ¬мқҳ мң лҢҖмқё мӢңлҢҖлҠ” нҳ„лҢҖ мң лҢҖмқёмқҙ мқҙмҠӨлқјм—ҳ лҜјмЎұм—җм„ң мң лһҳн•ҳкі кі„мҠ№лҗҳм—ҲлӢӨлҠ” мЈјмһҘмқ„ н•ҳлҠ” мқҙмҠӨлқјм—ҳ лҜјмЎұмЈјмқҳмһҗл“Өм—җкІҢ мӨ‘мҡ”н•ҳл©°,[Note 3][Note 4] л°ҳл©ҙ лҸ„мӢң м—ӯмӮ¬мқҳ мқҙмҠ¬лһҢ мӢңлҢҖлҠ” нҳ„лҢҖ нҢ”л ҲмҠӨнғҖмқёмқёмқҙ мқҙ м§Җм—ӯм—җ мӮҙм•ҳлҚҳ лӘЁл“ лӢӨлҘё лҜјмЎұл“Өмқҳ нӣ„мҶҗмқҙлқјкі мЈјмһҘн•ҳлҠ” нҢ”л ҲмҠӨнғҖмқё лҜјмЎұмЈјмқҳмһҗл“Өм—җкІҢ мӨ‘мҡ”н•ҳлӢӨ.[Note 5][Note 6] кІ°кіјм ҒмңјлЎң м–‘мёЎ лӘЁл‘җ мғҒлҢҖл°©мқҙ лҸ„мӢңм—җ лҢҖн•ң мһҗмӢ л“Өмқҳ мғҒлҢҖм Ғ мЈјмһҘмқ„ к°•нҷ”н•ҳкё° мң„н•ҙ лҸ„мӢңмқҳ м—ӯмӮ¬лҘј м •м№ҳнҷ”н–ҲлӢӨкі мЈјмһҘн•ҳл©°,[98][103][104] мқҙлҠ” лҸ„мӢң м—ӯмӮ¬мқҳ лӢӨм–‘н•ң мӮ¬кұҙкіј мӢңлҢҖм—җ лҢҖн•ҙ лӢӨлҘё м Җмһҗл“Өмқҙ лӢӨлҘё мҙҲм җмқ„ л‘җлҠ” кІғмңјлЎң мһ…мҰқлҗңлӢӨ. к°ҒмЈј
|
Portal di Ensiklopedia Dunia